
언스플래쉬
“술 좋아하십니까”라는 질문을 받으면 언제나 약간의 막막함을 느낀다. 성인이 되어 술을 경험한 이래 나는 술 앞에서 단 한 번도 호오를 따져보지 않았다. ‘불성실’로 점철된 내 인생에서 평생에 걸쳐 가장 꾸준하게 해오고 있는 드문 일 중 하나가 음주다. 몇 년 전 후배가 물었다. “선배는 술, 담배, 커피, 고기 중에 하나만 끊어야 한다면 뭘 끊을 거야?” 질문이 채 끝나기도 전에 단호하게 답했다. “목숨.” 나는 나의 순발력에 감탄했다. 진심은 언제나 이처럼 생각지 않았던 방식으로 불쑥 고개를 내미는 법이다.

왜 그렇게까지 술을 마시느냐고 묻는다면 역시 최선의 이유는 ‘세상 탓’일 테다. “설명하기 어렵군요. 하지만 굳이 이유를 대자면, 제가 이렇게까지 술을 마시는 것은, 이 빌어먹을 세계 때문이죠.”( 『그들에게 린디합을』 , 2013)(66쪽) 지난 10년 간 매년 주간지 50권을 만들었고, 적어도 마감 후 마흔 번 가까이 술을 마셨다. 일과 세상에 대한 푸념을 안주 삼아 마시는 동안 긴장이 풀리고 안도가 몰려왔다. 물론 더 많은 날을 자괴감과 더불어 폭음을 일삼았다. 어쨌든 무사히 한 주가 지나갔고, 나는 아무튼 마감을 했으며, 그러니까 마실 ‘자격’이 있었다.
사실 명분은 만들기 나름이었다. 취재나 마감이 뜻대로 안 될 때는 그 핑계로 마시는 법이다. 『드링킹』 (2008)의 저자 캐롤라인 냅 역시 술병 뒤에 숨곤 하는 기자였다. “우리 앞에 둘러쳐진 지성과 전문성의 휘장 뒤에는 두려움의 대양이 넘실거리고, 열등감의 강물이 흐른다. 마음속에는 항상 보기 싫은 것들의 목록이 길게 펼쳐져 있었다. 나는 그렇게 유약했고, 사람들의 반응에 과민했으며(남들에게 오해를 받으면 내 영혼의 일부가 허물어지기라도 하는 것처럼), 근원적인 열등감, 외로움과 두려움에 빠져있었다. 우리는 온종일 전문성의 가면 뒤에 숨어 지낸다. 그리고 일터를 떠나서는 다시 술병 뒤로 숨는다.”(32쪽)
그는 일상과 책 속에서 내가 만나고 있거나 만났던 ‘멋진’ ‘훌륭한’ 기자와는 거리가 있었다. 나처럼 모르는 사람과 통화하는 걸 어려워했다. 기자인데도! 그래서 취재원과 술을 마셨다. 아무렴, 역시 어색할 땐 술이 최고지! 저자가 자신의 알코올의존증 경험을 써내려간 이 책에 나는 수없이 밑줄을 그었다. 끝내 알코올의존증이 ‘질병’이라는 책의 주제에는 동의하지 않았지만 말이다. 저자처럼 ‘아직’ 누군가를 술 때문에 위험에 빠뜨려본 적 없는 나는 이 책의 첫 문장을 곱씹으며 매일 퇴근을 기다린다. “I DRINK.”
술 중에서도 맥주는 내게 365일 ‘제철 음식’이다. 식사 메뉴를 놓고 고뇌의 시간이 찾아오면 일단 맥주를 한 잔 마셨다. 알코올이 빈속을 통과하는 동안 ‘오늘의 메뉴’가 자연스레 떠올랐다. 내가 거절하지 못하는 말은 “맥주 한잔하자”이며, 당연히 한 잔은 한 잔으로 끝나지 않는다. “충분하다니? 알코올의존증 환자에게 그것은 생경한 미지의 언어다. 충분히 마시는 일이란 없다.”(76쪽)
누군가 건강을 이유로 술을 끊겠다고 하면 그렇게 서운했다. 나이 먹을수록 그런 사람은 하나 둘 늘어만 갔다. 외로운 나는 캐롤라인 냅처럼 혼잣말을 하곤 했다. “별 웃기는 유행 다 보겠네. 이게 도대체 무슨 재미야?”(34쪽) 그럴 때면 이상한 다짐을 하곤 했다. 어차피 한 번은 죽으니까 좋아하는 술?담배라도 마음껏 하자고. 내 인생에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건 고작 이 정도라는 생각이 들었다. 건강? 물론 중요하다. 하지만 누군가에게는 우선순위가 아닐 수도 있는 거다.
이렇게 살다보면 자연스럽게 ‘나만의 술집’이 생긴다. 술꾼은 알아본다, 나와 어울리는 공간을. 그래서 어떤 지역은 동네 이름보다 ‘○○이 있는 곳’으로 기억한다. 눈치 챘겠지만 ○○은 술집 이름이다. 드물지만 그런 술집 중에는 열쇠 놓는 자리까지 아는 경우도 있다. 주인이 아직 출근하지 않은 가게에 문 따고 들어가 맥주를 꺼내 마시다가 자연스럽게 손님을 대신 받아주기도 한다.
하루 종일 굶었던 몇 해 전 생일에도 나는 술집으로 퇴근했다. 취재가 끝난 지역에 마침 단골 술집이 있었다. 밤 10시가 가까워 씩씩대며 혼자 들어서자 사장이 기다렸다는 듯 김밥 한 줄을 건넸다. 언제 누가 어떻게 올지 몰라 김밥을 구비해두는 단골집이란 귀하다. 김밥을 허겁지겁 먹는 나를 보다 못한 주인이 이내 주방으로 들어갔다. 메뉴판에도 없던 아보카도 샐러드를 ‘선물’이랍시고 들고 나왔다. 혼자 마시려고 시켰던 와인 한 병을 그와 사이좋게 나눠 마셨음은 물론이다.
서울 계동의 ‘카페 공드리’도 그런 술집 중 한 곳이다. 사무실에서 멀지 않았고 무엇보다 낮술을 팔았다. 공드리를 알게 된 이래, 나는 낮이고 밤이고 그곳에 드나들었다. 공드리로 취재원이며 친구를 불러들였다. 내 친구라면 공드리를 모를 수 없었다. 오전 시간에 조용하게 인터뷰 할 장소가 필요해도 공드리에 갔다. 영업시간 전에 문을 열어달라는 부탁을 사장 부부는 단 한 번도 거절하지 않았다.
책과 마주앉아 맥주를 홀짝거리고 있을 때면 사장님이 자연스럽게 자기 몫의 맥주를 들고 내 앞에 앉곤 했다. 밥 때가 되면 슬쩍 스텝밀을 건네주거나, 메뉴판에 올리기 전 신 메뉴를 맛보여주는 날도 있었다. 영화계에 몸담았던 사장 부부와 ‘요즘 영화’ 이야기를 나누는 재미도 쏠쏠했다. 셋이 친했던 우리는 내게 애인이 생기면서 넷이 친한 사이가 되었다. “감정을 그렇게 다루는 사람들, 속마음을 줄줄 흘리면서 통찰이니 분석적 사고니 하는 것들을 비웃어주는 사람들 틈에 앉아 있는 게 좋았다. 나는 술을 마시고 그런 사람이 되는 게 좋았다. 세상이 아주 단순한 것들로 환원되는 순간이 좋았다.”(95쪽)
애인과 함께 살기로 결정했을 때, 우리는 ‘결혼’을 둘러싼 거의 모든 절차를 생략하기로 했다. 우리에게 결혼은 집안의 일이 아닌 ‘두 사람의 일’이었고, 가족의 허락은 필요치 않았다. 예식이 없으니 청첩장도 찍지 않았고, 드레스도 입지 않았다. 결혼 절차 중 우리가 유일하게 합의한 건 ‘좋아하는 사람들과 맛있는 걸 함께 먹는다’였다. 물론 맛있는 건 술이었다. 자주 얼굴을 마주하고 삶을 나누는 이들과 충분한 시간을 보내고 싶었다. 공드리 사장님들은 주말 하루 가게를 대관해달라는 우리의 제안을 당연하다는 듯 흔쾌히 받아줬다. 자연스럽게 결혼 날짜도 공드리가 대관 가능한 날로 정해졌다. 양가에 이 사실을 통보했고, 가족은 일절 초대하지 않았다. 그날 새벽 4시가 넘도록 가장 친한 친구들과 함께 공드리 사장님이 남았다.
얼마 전 사장님으로부터 메시지가 한 통 왔다. “일호, 안 자면 전화해줘.” 무슨 일인가 싶어 퍼뜩 연결했다. 가게 SNS 계정에 올리기 전에 ‘단독’을 주겠다는 우스갯소리로 이야기가 시작됐다. 가게가 좋은 사람에게 팔렸다는 이야기, 제주에 새 공드리를 열거라는 계획, 올해 결혼기념일에는 제주로 오라는 초대까지 단숨에 이어졌다.
카페 공드리의 9년은 내가 지나온 9년이기도 했다. 공드리의 맥주가 모나고 상처 난 마음을 동글동글 뭉툭하게 만들어줬다. “그러니까 누군가에게 술은 제2의 따옴표다. 술로만 열리는 마음과 말들이 따로 있다. 바닥에 떨어뜨렸을 때 뾰족한 연필심은 뚝 부러져 나가거나 깨어지지만, 뭉툭한 연필심은 끄떡없듯이, 같이 뭉툭해졌을 때에서야 허심탄회하게 나눌 수 있는 말들이 있다.”( 『아무튼, 술』 , 2019)(168쪽) 이제 그 말들을 나누려면 460km를 날아가야 한다. 오늘은 그 이유로, 술을 마셨다.
-
아무튼, 술김혼비 저 | 제철소
아직 경험해보지 않은 주종과 방법을 시도해보고 싶은 애주가나 여태 술 마시는 재미도 모르고 살았다는 기분이 드는 비애주가 할 것 없이 모두가 술상 앞에 앉고 마는, 술이술이 마술에 빠지게 된다.

장일호(시사IN 기자)
부끄럽지 않은 글을 쓰고 싶지만, 뜻대로 되지 않아 자주 ‘이상한 수치심’을 느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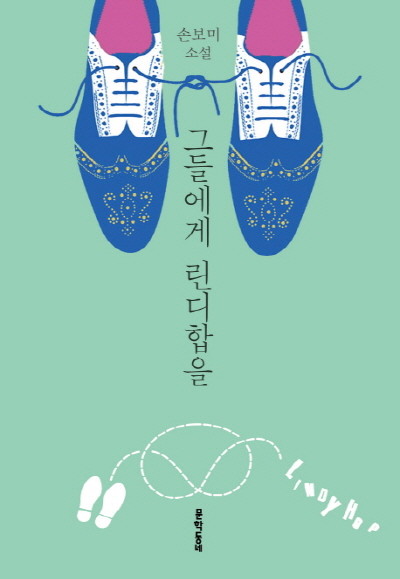





![[더뮤지컬] 잠들 수 없는 호텔, 유령이 되어 볼 기회...<슬립노모어 서울>](https://image.yes24.com/images/chyes24/article/cover/2025/09/20250901-2dd33b8b.jpg)


![[큐레이션] 책과 함께 하는 가을 미식 여행](https://image.yes24.com/images/chyes24/8/f/7/3/8f73b819a5767b0b1c02376e0df88f26.jpg)








전작
2020.04.30
mayqueensh
2019.11.19
krko78
2019.09.05
더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