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널예스] 삼천포.jpg](http://image.yes24.com/images/chyes24/7/1/c/1/71c18db02532e8dacfd95eb3d95fbf72.jpg)
우리가 몰랐던 달에 대한 이야기 『우주로 가는 문 달』 , 숫자가 담을 수 없는 사람의 서사 『화재감시원』 , 새의 삶을 보며 철학적인 질문을 던지는 『새들에 관한 짧은 철학』 을 준비했습니다.
단호박의 선택 - 『우주로 가는 문 달』
고호관 저 | 마인드빌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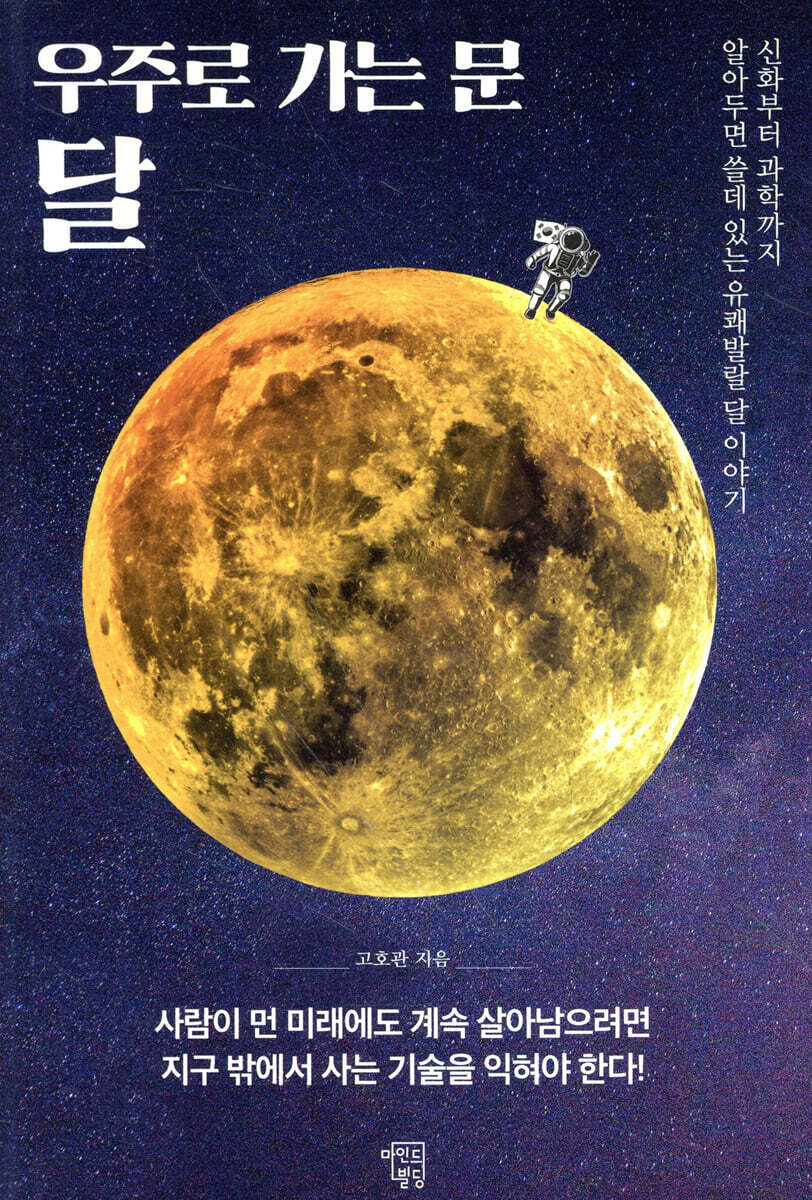 |
 |
요즘이 과학이나 우주에 대해서 이야기하기 되게 좋은 시기 같아요. 올해가 아폴로 달 탐사 50주년이래요. 그걸 기념하기 위해서 이 책을 올해 출간한 부분도 있는데요. 이 책을 읽으면 ‘달에 대해서 우리가 몰랐던 상식’들을 알게 되는 게 굉장히 많아요. 예를 들면, 달이 매년 3.8cm씩 지구에서 멀어지고 있다고 하고요. 다른 위성과 비교할 때 달이 되게 특이한 편이라고 해요. 수성, 금성, 지구, 화성, 목성, 토성, 천왕성, 해왕성까지 위성들이 있는데 본 행성의 크기와 비교하면 달이 제일 큰 편이래요. 달이 어떻게 생겨났는지에 대해서도 과학자들이 갑론을박했다고 하는데, 현재는 지구와 소행성이 충돌해서 일부분이 떨어져 나간 것이 달이 되었다는 설이 제일 유력하다고 합니다.
달이라는 크고 가까운 위성이 있어서 인간에게 유리한 점이 굉장히 많대요. 만약에 달이 없었다면 우리가 우주여행을 하려면 화성까지 가야했을 텐데, 달에 한 번 간 경험을 토대로 화성에도 갈 수 있는 거니까, 상대적으로 우주여행을 할 수 있는 기반이 된 거죠. 그리고 달이 없었다면 달력을 잘 못 만들었을 거라고 해요. 해가 뜨는 건 하루 기준이니까, 누군가와 37일 후에 만나자고 약속을 했다면 하루씩 세어야 하는데, 달이 있기 때문에 ‘두 번째 보름달이 뜰 때 만나자’라고 이야기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달력을 만드는 데에는 달이 해보다 훨씬 더 큰 역할을 했다고 합니다. 덕분에 ‘달이 열두 번 바뀌면 대충 1년 정도가 된다’는 걸 인식할 수 있었겠죠. ‘만약이 달이 없었다면 어땠을까’라는 가정이 책에 나오는데요. 생각하지 못했던 것들이 많았어요. 달이 없으면 밀물 썰물이 없어지니까 해양 생태계가 큰 타격을 입을 것이고, 달빛이 없으면 야행성 동물들이 지금의 생활을 영유하지 못하는 거예요.
마지막에는 달에 가는 이유에 대한 설명이 있는데요. ‘달은 끝이 아니라 시작이다’, ‘지구가 어떻게 될지 모르는데 우리는 반드시 우주로 나가야 할 필요성이 있고, 달은 좋은 기지와 시작이 될 것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런데 달에도 미세먼지가 엄청나게 많다고 합니다. 대기가 없어서 그렇대요. 그리고 달에 기지를 짓는 데에 천문학적인 비용이 들어서, 우리가 달에서 산다면 땅값이 굉장히 비쌀 것이고 아주 비좁게 지내야 될 거라고 합니다.
달에 대한 ‘쓸모없어 보이지만 쓸 데 있는’ 과학 지식들이 많이 있어서, 한 번쯤 읽어보면 좋을 책입니다.
톨콩의 선택 - 『화재감시원』
코니 윌리스 저/최용준 역 | 아작(디자인콤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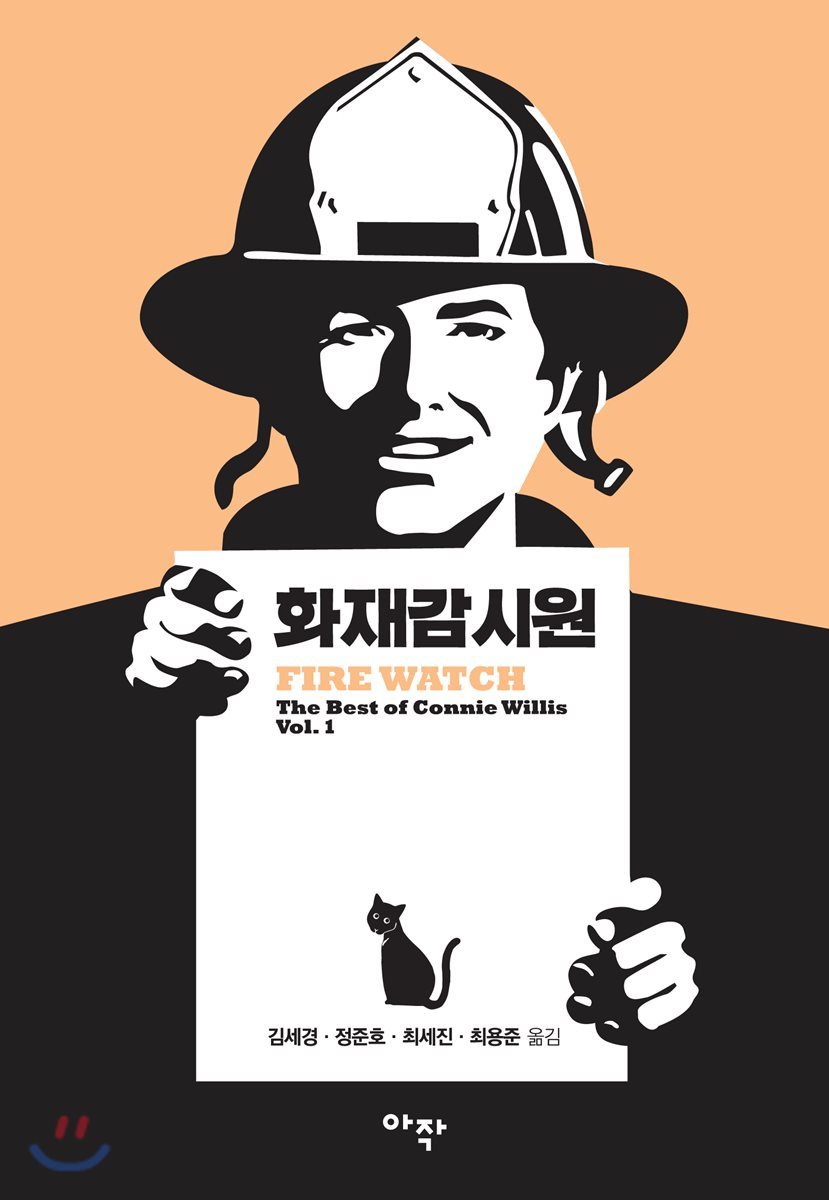 |
 |
제가 이 소설을 읽은 건 아주 예전의 일이었는데요. 노트르담 대성당이 불타는 걸 보고 이 작품이 다시 생각났어요. 『화재감시원』 에서 중요한 것은 영국에 있는 세인트폴 대성당인데요. 미래의 어떤 시점에 역사를 공부하는 학부가 있고, 이 곳에서는 타임머신을 이용해서 이전 시기로 갈 수 있기 때문에 과거로 체험학습을 보낸다는 설정이에요. 주인공은 존 바솔로뮤라는 학부생인데 지금까지 사도 바울을 연구하려고 굉장히 많은 준비를 해왔어요. 그래서 그 시대로 가려고 했는데 2차 세계대전 당시의 공습이 이루어지고 있는 세인트폴 대성당으로 가게 된 거예요.
그런데 이 책의 설정에 따르면 미래에는 세인트폴 대성당은 이미 자취를 감추고 없어요. 『화재감시원』 이 처음 나온 건 1980년대인데, 소설에서는 세인트폴 대성당이 2015년에 테러로 인해 무너졌다고 나오거든요. 그보다 훨씬 더 미래의 학부생인 바솔로뮤는 한 번도 세인트폴 대성당을 본 적이 없는데 공습을 받는 세인트폴 대성당에 가게 된 거예요. 가보니까 ‘소이탄’이라고 하는 것이 성당의 천장으로 날아들고, 화재감시원들이 대기하고 있다가 폭탄이 떨어지면 그 위에 진흙과 모래를 덮어서 끄는 작업을 하는 거죠. 정말 목숨을 건 작업이고, 언제 소이탄이 또 떨어질지 모르니까 잠도 제대로 못 자면서 현장을 지키고 있는 사람들이 있었던 거예요.
바솔로뮤가 처음에는 ‘여기는 내가 올 곳이 아닌데...’ 하고 투덜거리지만, 세인트폴 대성당의 아름다움도 보게 되고 그 시대 사람들과의 교감도 생겨요. 나중에는 체험학습 기간이 만료되어서 현대로 돌아오게 되는데요. 그리고 시험을 보게 되는데 ‘소이탄을 끄기 위한 보편적인 방법은 무엇인가’, ‘공습으로 인해 발생한 사망자 수는?’ 이런 질문들이 나와요. 그런데 바솔로뮤는 괄호에 숫자를 쓸 수가 없는 거예요. 그에게는 숫자가 아닌 거죠. 사람들이 아름다운 성당을 지키려고 목숨을 던지는 걸 보고 왔는데, 숫자로 쓰라는 걸 받아들일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시험을 거부해요. 이후의 이야기들이 정말 너무 감동적인데, 그건 밝히지 않을게요.
코니 윌리스의 ‘역사학부 시리즈’가 있는데, 이 시리즈의 제일 첫 중편이 「화재감시원」이에요. 제가 오늘 가지고 온 책은 『화재감시원』 이라는 제목으로 묶여 있는 걸작선이고요. 그 중에 한 편을 소개해드렸습니다. 이 단편선을 읽어 보시면 코니 윌리스의 성격이 정말 다양하다는 걸 아실 수 있을 거예요.
그냥의 선택 - 『새들에 관한 짧은 철학』
필리프 J. 뒤부아, 엘리즈 루소 공저/맹슬기 역 | 다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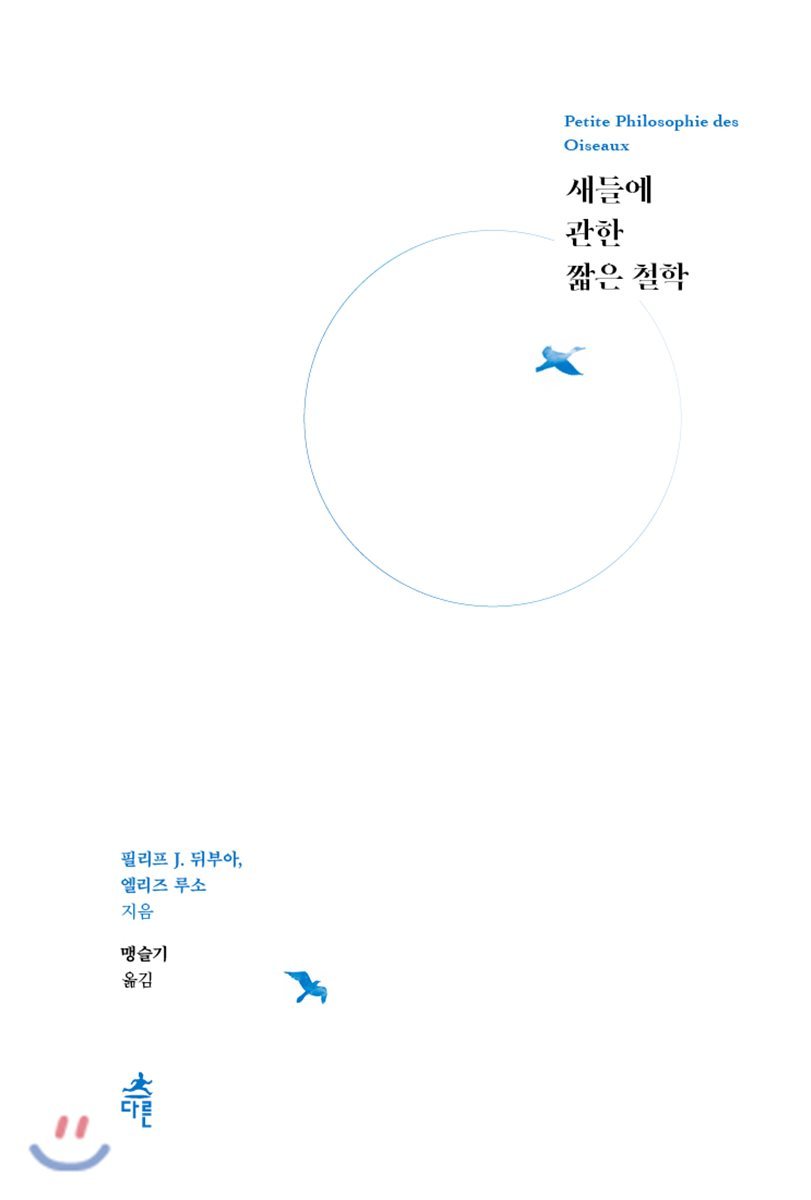 |
 |
조류학자(필리프 J. 뒤부아)와 기자(엘리즈 루소)가 같이 쓴 책입니다. 오랫동안 새를 지켜보면서, 그들의 삶을 통해 우리가 전해 받는 메시지가 있는 것 같고 그 삶 속에 녹아있는 철학이 있는 것 같다는 생각에서 함께 썼다고 합니다. ‘사랑이란, 예술이란, 선과 악이란 무엇인가? 특정한 능력은 인간에게만 있는 것인가? 그것은 인간의 오만한 생각이 아닌가?’와 같은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가장 강조하는 것 중에 하나가 ‘새들은 늘 현재를 산다’는 것인데요. 이와 관련해서 굉장히 인상적인 묘사가 있었어요. 암탉이 모래 목욕하는 순간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머리통을 비비 꼰 채, 한 발은 이쪽에 다른 발은 저쪽에, 날개 두 짝은 방향을 잃고 사방으로 솟아 있다. 온몸이 소란스럽게 움직이는 동안 모래도 자욱이 붕 떠올랐다가 다시 몸 위로 수북이 쌓인다. 그러다 먼지구름이 얌전해진다. 암탉은 눈을 반쯤 감았다가, 살며시 떴다가, 다시 감는다. 그리고 기쁨의 소리를 낸다. 이 시간은 오래도록 이어진다. 아니, 이때 암탉에게 시간이란 개념은 이미 존재하지 않는다. 가만히 그렇게, 몸을 데워주는 따스한 햇볕을 충분히 만끽한다.”
저자는 이 때의 닭을 보는 순간 ‘카르페디엠’이 무엇인지 확 느껴졌다고 합니다. 그리고 닭은 나비를 쫓다가 놓쳤을 때도, 뒤도 안 돌아보고 다른 할 일을 한대요. 그건 이미 지나간 일이기 때문이죠.
그 외에도, 도구를 이용하고 획득한 지식을 전수하는 까마귀의 이야기도 있고 짝짓기의 수단으로 아름다움을 활용하는 새틴바우어의 이야기도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지식과 창작, 예술이 인간만이 할 수 있는 일이라고 생각하는데 ‘과연 그러한지’ 묻고 있습니다.
*오디오클립 바로듣기 https://audioclip.naver.com/channels/391/clips/154

임나리
그저 우리 사는 이야기면 족합니다.

이지원 PD
채널예스는 예스24에서 운영하는 콘텐츠 플랫폼입니다. 책을 둘러싼 다양한 이야기를 만나 보세요.









![[취미 발견 프로젝트] 함께라서 더 행복한 봄의 한복판에서](https://image.yes24.com/images/chyes24/article/cover/2025/04/20250428-2a252fb9.jpg)
![[Read with me] 트와이스 다현 “책을 덮으면 오늘을 잘 살아보자는 목표가 생겨요”](https://image.yes24.com/images/chyes24/article/cover/2024/12/20241205-c776e132.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