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파주의 음악 감상실에 갔다. 천장이 높은 공간에 대문만 한 스피커가 몇 대 있었다. 테이블에는 연필과 메모지, 연필깎이가 있었고 클래식에 한해 신청곡을 틀어주었다. 종이에 조지 거슈인George Gershwin의 <랩소디 인 블루Rhapsody in Blue>를 적어 신청함에 넣었다. 다른 사람들이 신청한 곡이 먼저 흘러나온 뒤, 내가 신청한 곡이 나왔다. 음악을 틀어주던 주인이 이 곡은 누가 신청했느냐고 물었다. 한쪽 손바닥을 올려 보였더니 “좋은 곡을 신청하셨네.” 하며 웃었다. 자랑스러우면서도 이런 일에 우쭐해지는 것이 쑥스럽기도 해서 어정쩡하게 웃어 보였다. 음악이 흘러나왔고 소리에 압도되어 넋을 놓았다. 이 곡이 이렇게까지 웅장한 곡이었나. 스피커는 덩치에 어울리는 소리를 냈고, 무엇으로도 채우기 어려울 것 같던 공간이 음악으로 가득 찼다. 눈을 감았다.
“이건 베토벤이야.” “이건 바흐.” “이 곡은 이름이 뭐더라.” 엄마 목소리가 들렸다. 한글을 모르던 때였으니 꽤 어린 시절이었고, 엄마는 클래식 앨범을 박스 채로 사 왔었다. 거실의 전축과 오디오 근처에는 늘 CD가 잔뜩 놓여있었다. 매일 클래식이 흘러나왔고, 난 관심이 없었다. 엄마가 옆에서 작곡가나 역사를 설명해주면 공부하는 기분이 들어 귀담아듣지 않았다. 듣지 않았을 거다. 분명 들은 적이 없다고 생각해왔는데 어쩌다 클래식을 듣게 되면 자꾸 어릴 때로 돌아가 그 거실에 눕곤 한다. 지루한 음악이 흐르던 거실은 남쪽을 향해 있었고 오래 볕을 쬘 수 있었다. 나는 그저 그 바닥에 누워 잠이 들었을 뿐이다. 그런데도 나도 모르게 어느 음악들을 듣다가 ‘이건 바흐인가.’ ‘드뷔시 같은데.’ 하며 이름을 떠올리게 된다. 그렇게 기억해낸 단어는 대게 맞다.
엄마는 오래 배운 사람이 아니다. 외갓집은 부유하지 않았기에 배우는 일에 돈을 쓸 수 없었다고 했다. “집에 돈만 있었으면 엄마는 선생님이 되었을 텐데.” 아쉬워하던 엄마는 내게 다양한 걸 가르쳤다. 피아노, 플루트, 바이올린, 가야금 같은 악기를 가르치고, 뮤지컬, 한문, 서예, 미술, 글짓기 같은 것도 배웠다. 좋은 것을 보여주겠다며 산이나 들, 바다, 유적지, 명소 등에 다닐 때는 매번 집에 있고 싶었다. 어디에 가면 엄마는 아는 것을 열심히 설명해주었다. 그때는 아는 것을 일러주는 줄 알았지만, 지금에 와서 다시 생각해보면 매번 뭔가를 흘끔거렸다. 앨범 재킷에 적힌 설명이나 표지판, 안내 책자에 적힌 것들. 거기에 있는 것을 읽고 추려 내게 일러주었다. “여기는 이런 걸 하던 곳이야.” 라던가 “그랬다고 하더라.” 하며 엄마는 고개를 끄덕였다. 가르침과 동시에 배워 나갔을 거다. 내가 어떤 삶을 살길 바란다는 말을 해주었던가. 했을까. 기억나지 않지만, 무슨 말을 했든 매번 그 반대편으로 걸으려고 애를 썼다.

학창 시절, 손쓸 수 없이 제멋대로 지내 엄마 마음을 어지럽히곤 했다. 그렇게 잘 가르쳐주고 일러주었는데 “왜 내 딸은 저렇게 엉망진창으로 자라나는지.” 엄마는 이해할 수 없었을 거다. 나도 이런 내게 자꾸 말을 거는 엄마를 이해할 수 없었으니까. 그때는 잘 몰랐던 엄마를 이런 오후에 마주치곤 한다. 어느 유명한 그림을 보거나 음악을 듣거나, 좋은 풍경 앞에 서서 낯설지 않은 기분이 들면 그 자리에서 익숙한 엄마 목소리가 들린다. 듣는다. 가만히, 들어본다.
그런데 어머니가 타계한 지 얼마 되지 않은 11월의 어느 날 저녁, 나는 사진들을 정리했다. 나는 어머니를 '되찾을 수 있으리라' 희망하지 않았고, 나는 '한 존재의 이 사진들'에서 아무것도 기대하지 않았다. "우리는 그에 대해서 생각하는 것만으로도 이런 사진들 앞에서보다 그를 더 잘 회상할 수 있다."(프루스트) 나는 초상(初喪)의 가장 끔찍한 특징들 가운데 하나인 그 숙명성을 통해 사진의 이미지들을 들여다보았자 소용없을 것이고, 어머니의 모습을 결코 더 이상 회상할 수(모습 전체를 나에게 불러올 수) 없으리라는 점을 잘 알고 있었다. 아니다, 나는 발레리가 자기 어머니를 여의었을 때 소망한 것처럼, "나 자신만을 위해서 어머니에 대한 작은 단장집을 집필하고" 싶었다(어머니에 대한 활자화된 기억이 최소한 내가 명성이 있을 동안만은 지속될 수 있도록, 아마 나는 언젠가 이 단장집을 쓸 것이다). 게다가 내가 지녔던 어머니의 사진들 가운데 한 장을 제외하면 그것들을 내가 좋아한다고 말할 수조차 없었다. 내가 공개한 이 예외적인 사진은 젊은날의 어머니가 랑드 지방의 해변에서 걷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나는 그 속에서-너무 멀리 보이는 어머니 얼굴은 볼 수가 없었지만- 어머니의 거동, 건강, 밝은 표정과 "다시 만났다." (83-84쪽)
-롤랑 바르트, 『밝은 방(사진에 관한 노트)』
-
밝은 방롤랑 바르트 저 | 동문선
이미지가 소비의 대상이 되어 범람하는 이 시대에 기호학자 바르트의 사진론은 사진계에 이미 중요한 고전처럼 현실적 위상을 확보하고 있다.

박선아(비주얼 에디터)
산문집 『20킬로그램의 삶』과 서간집 『어떤 이름에게』를 만들었다. 회사에서 비주얼 에디터로 일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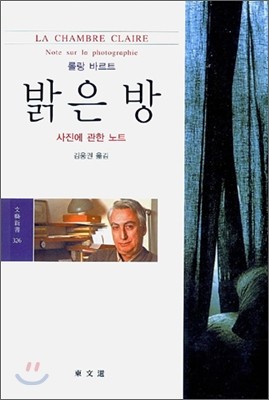





![[비움을 시작합니다] 네가 변해야 모든 게 변한다 ②](https://image.yes24.com/images/chyes24/article/cover/2025/08/20250829-3e264992.jpg)
![[에디터의 장바구니] 『계속 읽기』, 『김혜순 죽음 트릴로지』 외](https://image.yes24.com/images/chyes24/article/cover/2025/07/20250707-e6d95ade.jpg)
![[취미 발견 프로젝트] 함께라서 더 행복한 봄의 한복판에서](https://image.yes24.com/images/chyes24/article/cover/2025/04/20250428-2a252fb9.jpg)
![[리뷰] 멈추고 바라보는 연습](https://image.yes24.com/images/chyes24/article/cover/2025/01/20250123-0c8ad84b.png)
![[큐레이션] 부모와 자녀가 함께 읽으면 좋은 그림책](https://image.yes24.com/images/chyes24/5/5/4/a/554afd39e1efaf886be64b3d06b98b21.pn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