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언스플래쉬
앞에 놓인 일들을 한 번씩 가늠할 때마다 막막해서 차라리 사라지고 싶었다. 다짐이 아니라 결과로 증명되는 쓸모란 얼마나 무서운가. 일을 잘하고 싶다는 바람과 잘할 수 없을 거라는 낙담은 단짝이라, 내가 나인 게 정말 싫어지는 시간만 성실했다. 일과 일상이 구분되지 않은 채 한 몸처럼 지낸 지 오래였지만, 그 어느 때보다 생활이 불규칙해졌다. 닥친 마감과 기획안으로 엉킨 생각이 밤새 몸을 들쑤셨다. 아침에 눈 떠 보면 죄 시답잖았다. 모든 게 나처럼 시시했다.
지난 4월 사회팀으로 발령 나면서 자기혐오가 극에 달했다. 기자로 9년을 일했지만 사회팀에 있었던 건 수습 시절 6개월 남짓이 전부였다. 그런 내게 국장이 대뜸 팀장을 맡으라고 했다. 나는 남 얘기하듯 딴청을 피웠다. “안 해봤는데 괜찮을까요? 후회하실 텐데….” 인사를 통보하기 위해 산책을 청한 국장은 대답이 없었다. 나는 생각했다. ‘저이는 나랑 9년을 일해보고도 나를 모른다.’
나는 내가 어떤 사람인지 잘 안다. 한 반의 정원이 30명이라면 15~16등쯤 하는 학생 같은, 뭐 하나 빼어나게 잘하는 건 없지만 그렇다고 딱히 못하는 것도 없는. 나는 내 인생에서 주로 ‘그런 애’를 맡아왔다. 나 하나만 잘 수습하면 그럭저럭 괜찮았던 시절이 그렇게 끝났다. 선배의 선택과 판단을 무의미하게 만들면 안 된다는 생각에 짓눌렸다. 실망시킬까 봐 무서웠다. 실은, 누구보다 나를 실망시키기 싫었다. 해봤다면 해봤고 안 해봤다면 안 해본 일들을 맞닥뜨리게 될 거라는 곤란한 예감은 적중했다. 지금까지와는 다른 차원의 업무 압력이 나를 기다리고 있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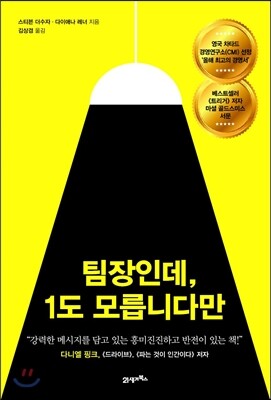 |
 |
모르는 일이 생기면 언제나 관련 책을 먼저 찾아 읽는다. 한동안 조직과 리더십에 관련된 책을 주로 읽었다. 『최고의 팀은 무엇이 다른가』 (웅진지식하우스)나 『팀장인데, 1도 모릅니다만』 (21세기북스) 같은 책들. 『최고의 팀은 무엇이 다른가』 를 읽는 동안 나는 부디 써먹을 일 없기를 바라면서 ‘단순한 피드백’의 예시를 메모했다. 마치 자기 암시 같았다. “이런 조언을 남기는 이유는 기대치가 아주 높기 때문입니다. 당신이라면 이 기대치를 충분히 달성할 수 있다고 믿습니다.”(e-book, 101쪽) 그리고 이런 말이야 말로 내가 가장 잘 해왔고, 잘할 수 있는 말이었다! “실제로 리더의 입에서 나오는 말 중에 이 세 단어가 제일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거 내가 망쳤어.’”(e-book, 233쪽) 그래, 내가 다 망치고 말 거야! 다짐하고 나니 마음이 한결 후련했다.
정답을 찾고 싶어서 책을 읽지만 책에는 정답이 없다. 자기계발서만 아니라 모든 책이 마찬가지다. 대신 책에는 ‘질문’이 있다. ‘실마리’를 잡는다면 그나마 나쁘지 않다. 정답은 여러 개이며 결국은 내가 써야 한다. 하지만 이 문장만큼은 내가 눈을 질끈 감고 앞으로 한 발 떼는 데 큰 위로가 됐다. “‘왜 내가 이걸 하고 있는 거지?’ 내 대답은 늘 같습니다. ‘안 될 게 뭐 있어? 우리에게 필요한 일이고 지금 나 말고 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잖아.’”(『팀장인데, 1도 모릅니다만』 , e-book, 460쪽)
그리하여 함께 일하는 친구들에게 당부하게 되는 건 언제나 결과보다는 태도다. 내가 잊지 않으려 하는 건 이런 것들이다. 기자는 기본적으로 2차 생산자라는 점. 우리 일은 기본적으로 사건과 사람에서 출발한다. 누군가에게 빚지지 않고 쓸 수 있는 기사는 없다. 기사란 대부분 누군가의 불행과 불편에서 출발한다. 그렇게 때로는 누구도 원하지 않는 현실에 개입하게 된다. 나는 한 번씩 소설 『골든 슬럼버』 (웅진지식하우스) 속 아오야기 아버지의 호통을 찾아 읽는다. 야오야기의 아버지는 테러 용의자인 아들을 찾기 위해 집 앞에 구름떼같이 모인 기자들을 향해 이렇게 외친다. “이게 네놈들의 일이라는 건 인정하지. 일이란 그런 거니까. 하지만 자신의 일이 남의 인생을 망칠 수도 있다면 그만한 각오는 있어야지. 다들 최선의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고. 왜냐하면 남의 인생이 걸려 있으니까. 각오를 하란 말이다.”(e-book, 690쪽)
“기자가 되고 싶다”는 친구들을 만나면 습관처럼 말하곤 했다. “에이, 이거 말고 딴 거 해.” 반쯤은 진심이었다. 일과 일상이 구분 없이 한데 뭉쳐 굴러다니기 시작하면 생활은 불규칙해지고, 몸은 망가진다. ‘기레기’로 뭉뚱그려 호명될 때마다 가까스로 쥐고 있던 자긍은 사그라든다. 지난 10월 출장 차 머물렀던 타이완에서 한 기자는 내게 이렇게 말했다. “여기도 한국의 ‘기레기’와 비슷한 말이 있어요. ‘어릴 때 공부 안 하면 커서 기자된다(小時不讀書, 長大當記者)’라고 해요.” 우리의 대화는 자연스레 ‘기자질’의 기쁨과 슬픔에 대한 이야기로 번졌다. 하지만 우리가 이 일을 포기하지 않는 건, 이 일이 세상을 좀 더 나은 방향으로 움직이도록 기여하는 일이라는, 분명한 보람과 자부 때문이었다. 나는 지금 그걸 좀 더 깊이 실현하고 고민해야 하는 자리에 와 있다.

언스플래쉬
자신은 원하는 직업을 가졌으면서 내가 하는 일을 원하는 후배의 ‘앞길’ 막는 얘기는 왜 자꾸 하게 되는 걸까. 모든 일이 그렇지만 이상은 현실보다 늘 앞서 간다. 내가 그러했듯, 뒤에 오는 사람들이 그 낙차에 실망할까 지레 겁을 주는 지도 모르겠다. 하지만 따지고 보면 기대도 실망도 당사자의 몫이다. 선배는 그 모든 걸 온전히, 하지만 나보다는 좀 더 좋은 환경에서 겪게 해주는 사람이어야 하는 건 아닐까.
몇 년 전 만화가 이종범 씨가 쓴 ‘청소의 요정’이라는 제목의 글을 인상 깊게 읽었다(2014년 10월2일자,
어떤 직업을 좋은 일, 필요한 일로 만드는 힘과 책임은 그 직업군에 속한 사람에게도 있다. 내가 하는 일을 뒤에 오는 사람에게 권할 수 있으려면 내가 선 땅이 좋아지도록 부지런히 일궈야 한다. 저 짧은 두 마디를 자신 있게 건네려면 그만큼 스스로를 담금질해야 한다. 일의 조건과 환경을 바꾸는 일을 게을리 해서도 안 된다. 어디 기자만이 그럴까. 세상의 많은 일이 그런 노력에 힘입어 나아진다고 믿는다. 그 과정에서 때로 망친다고 하더라도, 결과적으로 아주 망친 일은 아니게 될지도 모른다.

장일호(시사IN 기자)
부끄럽지 않은 글을 쓰고 싶지만, 뜻대로 되지 않아 자주 ‘이상한 수치심’을 느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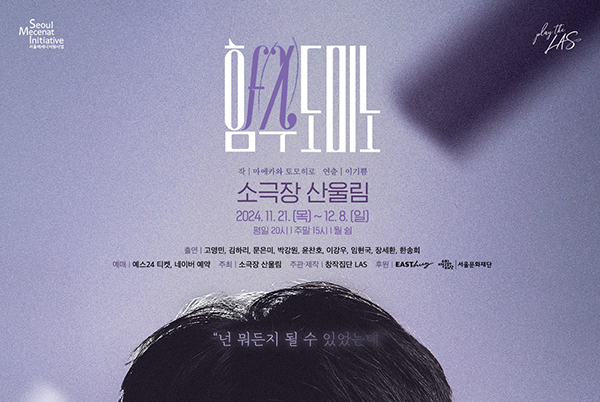
![[리뷰] 안전한 세계를 만들고자 하는 환상](https://image.yes24.com/images/chyes24/0/6/1/4/0614d74fc2e7c06b87571a22c47aa75d.png)
![[큐레이션] MZ 리더를 위한 리더십 고민 해결](https://image.yes24.com/images/chyes24/6/2/5/f/625f3e4e29c46bbc490e1bc2c22c62ef.jpg)









연연
2018.11.30
scycos
2018.11.29
책산책
2018.11.29
더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