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글을 쓰는 직업 때문인지, 도서관에 대한 로망이 있다. 어떤 주제로 원고 작업을 하게 되면 공공 도서관을 방문, 관련 도서를 찾아 대형 책상에 쌓아두고 적합한 자료를 참조해 노트북 자판을 두드리는 그런 상상 말이다. 요한 제바스티안 바흐의 ‘G 선상의 아리아’가 흐르는 가운데 영화 <세븐>(1995)에서 소머셋(모건 프리먼) 형사가 성서에 나온 7대 죄악과 관련한 자료를 찾기 위해 도서관을 활용할 때의 그런 기분과 분위기랄까.
<뉴욕 라이브러리에서>는 123년의 역사와 92개의 분점을 가진 ‘뉴욕 공립 도서관 New York Public Library’을 12주간 카메라로 기록한 다큐멘터리이다. 상영시간이 206분, 그러니까 3시간 26분인 이 작품은 그만큼 뉴욕 공립 도서관의 역사와 가치가 방대하다는 사실을 반영한다. 도서관은 단순히 많은 장서를 갖춘 곳이라고 생각하는 나 같은 사람의 편견을 무참히 깨는 작품이 바로 <뉴욕 라이브러리에서>이다.
이 영화의 원제는 ‘장서표’를 의미하는 ‘Ex Libris’다. 세계 5대 도서관으로 평가받는 뉴욕 공립 도서관은 무려 5만여 권의 장서를 보유하고 있고 스태프 수만 3,150명이라고 한다. 장서표라는 원제는 일차적으로 이런 숫자의 가치를 반영한다. 하지만 그런 정도로 3시간이 넘는 상영시간을 채우기에는 빈약한 수치(?)다. <뉴욕 라이브러리에서>를 연출한 프레드릭 와이즈먼 감독의 얘기를 들어보자. “뉴욕 공립 도서관은 ‘모든 사람에게 열려있다’는 민주적인 아이디어를 구현한다. 모든 계급, 인종, 민족은 도서관에 연결되어 있다.”
감독의 말은 곧 도서관은 누구나 참여하는 공간이란 사실을 의미한다. 참여의 의미는 사람에 따라 다를 수 있을 텐데 작가이자 화학자인 프리모 레비나 뮤지션 엘비스 코스텔로 같은 명사는 뉴욕 공립 도서관이 주최한 강연에 ‘참여’하고 이들의 강연이 궁금한 이들은 청중으로 ‘참여’한다. 이 청중 중 누군가는 강연을 듣고 지적 대화를 위한 더 넓고 깊은 정보를 얻으려고 뉴욕 공립 도서관의 분점을 찾아 도서를 검색하거나 영상물을 대여함으로써 또 다른 형태로 ‘참여’를 경험할 것이다. 이를 위해 뉴욕 공립 도서관의 3,150명의 스태프 중 일부는 여러 종류의 자료를 찾아 이를 분류하고 배치하는 작업으로 ‘참여’의 역사를 쌓을 것이다. 또 없나?

영화 <뉴욕라이브러리에서>의 한 장면
영화는 이 과정을 평행하게 나열, 민주주의의 편집으로 프레드릭 와이즈먼 감독이 언급한 뉴욕 공립 도서관의 민주주의에 ‘참여‘하는가 하면 중간마다 도서관 운영자들의 회의 내용을 투명하게 공개한다. 운영자들의 의견은 다양해도 하나로 모이는 결론은 뉴욕 공립 도서관의 모든 정보에서 소외된 이가 없도록 더 세심하게 정책을 짜는 것이다. 앞을 보지 못하고, 소리를 듣지 못하는 이들을 위한 점자ㆍ음성 도서관의 예산을 늘리기 위한 계획을 짜는 한편으로 뉴욕 인구 다섯 명 중 한 명꼴로 컴퓨터를 갖지 못해 디지털 정보에서 소외된 이들을 ‘참여’시킬 방안에 관해서도 고민한다. 그 시간, 뉴욕 공립 도서관 마당의 볕 좋은 벤치에는 노숙자가 남의 시선을 의식하지 않고 편하게 잠을 청하기도 한다.
우리가 흔히 말하는 ‘소통’은 단순히 말하고 듣는 것에만 한정하지 않는다. 미국 독립 선언문처럼 역사적인 순간을 함께할 수도 있고 흑인 노예제도의 부당함을 알리는 시위에 어깨를 나란히 할 수도 있을 것이며 도서관을 이용하는 이들을 위해 뉴욕 공립 도서관의 공공 근로를 통해 봉사할 수도 있을 것이다. 이 일련의 과정들은 역사를 만들고 역사에 참여하고 역사를 누리고 등등 역사의 모든 것이라고 할 수 있을 텐데 프레드릭 와이즈먼은 이를 도서관에서 목격하며 민주주의라고 정의했다. 프리모 레비의 말을 빌리자면, “과정을 경시하지 마라. 만드는 과정이 우리를 정의한다.” 즉, 민주주의는 ‘참여’라는 과정이 쌓은 역사다. 그리고 그 역사는 바로 도서관이다.
<뉴욕 라이브러리에서>로 생각지도 못한 민주주의로서의 도서관의 역할에 개안하다 보니 갑자기 생각나는 영화가 있다. <투모로우>(2004)다. <투모로우>는 갑작스러운 지구의 기온 하강으로 지구 전체가 빙하로 뒤덮이는 디스토피아의 풍경을 예측한다. 그중 하나로 묘사되는 장소가 바로 뉴욕의 Fifth Avenue & 42nd Street에 위치한 ‘뉴욕 공립 도서관’이다. 뉴욕 공립 도서관에서 주요 인물들은 추위를 버틸 수단으로 책을 벽난로의 연료 삼아 불을 지핀다. 지구 멸망의 순간에 도서관은 일종의 최후의 대피처로 기능한다! 농담이다. 너무 진지하게 받아들이지는 마시길. 다만, 재난과 재해 앞에 인간은 부자와 빈자, 남자와 여자, 강자와 약자 등등 할 것 없이 모두가 평등한 것처럼 프레드릭 와이즈먼이 바라본 도서관은 모두가 지식을 누리고 정보를 찾고 마음대로 들락거릴 수 있는 민주주의의 실제 현장이다. <투모로우>처럼 생명을 위협하는 위험과도 거리가 머니 걱정은 붙들어 매시기를. <뉴욕 라이브러리>와 <투모로우>를 함께 언급할 수 있는 도서관은 정말 민주적인 장소이지 아니한가.
‘대한민국 No.1 문화웹진’ 예스24 채널예스

허남웅(영화평론가)
영화에 대해 글을 쓰고 말을 한다. 요즘에는 동생 허남준이 거기에 대해 그림도 그려준다. 영화를 영화에만 머물게 하지 않으려고 다양한 시선으로 접근하기 위해 노력 중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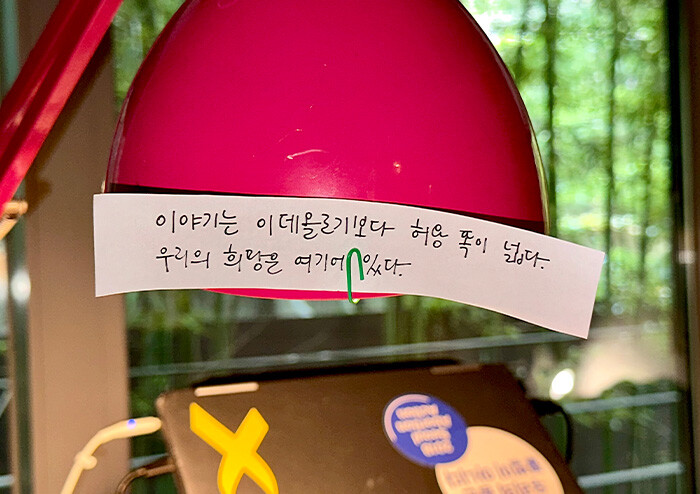
![[구구X리타] 책에 다가가기](https://image.yes24.com/images/chyes24/article/cover/2025/08/20250805-c6ca0efe.pn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