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널예스] 어떤책임.jpg](http://image.yes24.com/images/chyes24/f/4/9/3/f4939a4c6d6aff6925caa1df29c7ff10.jpg)
불현듯 : 가방 무거운 것을 절대 참지 못하는 분, 바로 프랑소와 엄이고요. 가방에 꼭 책이 있어야 하는 분, 바로 캘리입니다. 그래서 주제를 정했어요. 오늘 주제는 ‘가방 속에 넣어두고 사탕처럼 꺼내먹는 책’이에요.
프랑소와엄 : 그러면 불현듯의 가방은 어때야 하나요?
불현듯 : 둘을 섞어야 됩니다. 가방이 무거운 것을 절대 견디지 못하지만 늘 가방에 책이 있어서 가방이 무거워지고 마는 것이죠.
프랑소와엄 : 그렇군요. 그리고, 여러분. 오늘은 ‘오은 시인 특집’입니다.(웃음) 편파방송 아니고요. 정말 저희가 주제와 맞게 고른 책이에요.
캘리가 추천하는 책
오은 저 | 현대문학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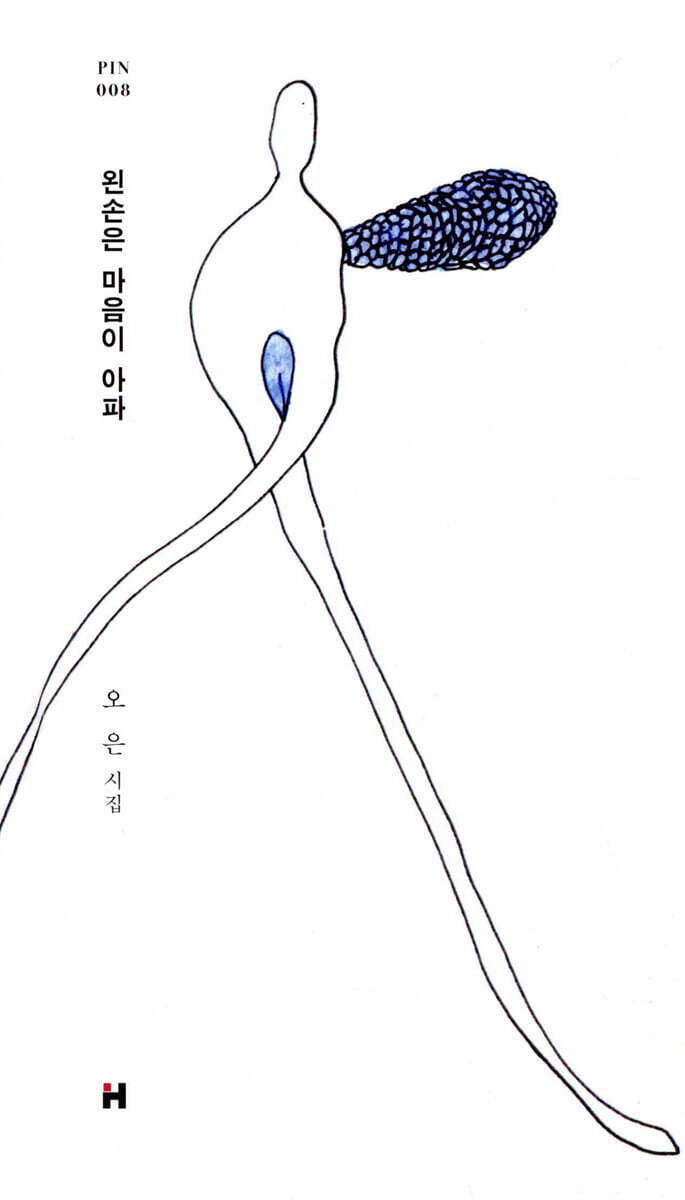 |
 |
어떤 시를 함께 이야기하면 좋을까 생각했는데요. 먼저 저는 「움큼」이라는 시가 좋았어요. 짧은 시고요. 제목을 빼고 읽은 후에 제목을 보면 아, 하고 무릎을 치게 되거든요. 오은 시인께 낭독을 직접 청해 들어본 후에 이야기를 더 나눠보고 싶습니다.
겨울에는 눈을 뭉치고
봄에는 흙을 움켜쥐고
여름에는 사탕을 집고
가을에는 갈대꽃을 안고
이듬해 겨울에는
머리카락이 빠지고 있었다
무엇을 해도 되는 나이
그러나
아무것이나 하면 안 되는 나이
덮기에는 늦어서
겁을 집어삼켰다
(오은, 「움큼」 전문)
이 시를 읽으면서 ‘움큼’이라는 한 단어에 대해 곰곰이 궁리했을 시인의 마음을 생각하게 됐어요. 『유에서 유』 에도 「미시감」이라는 시가 있잖아요. 알고 있는 것을 자세히 들여다볼 때 새롭게 나타나는 것이 있죠. ‘움큼’이라는 단어는 우리 모두 알잖아요. 그런데 새로워요. 시 자체에는 생략되어 있는 제목을 넣어서 읽어보게도 됐고요. 시와 시의 제목이 이렇게 찰떡처럼 조직되어 있는 것을 보면서 시 읽기의 즐거움을 느낄 수 있었어요. 게다가 저희가 서로 알고 지낸 시간이 오래되진 않았지만 곁에서 본 시인의 모습이 있는데요. 그런 시인의 모습이 느껴지는 시도 있어서 재미있었어요. 「O와 o」라는 시가 특히 그랬어요. 이 시를 읽어보시면 시인을 느낄 수 있을 거예요.
프랑소와엄이 추천하는 책
『나는 이름이 있었다』
오은 저 | 아침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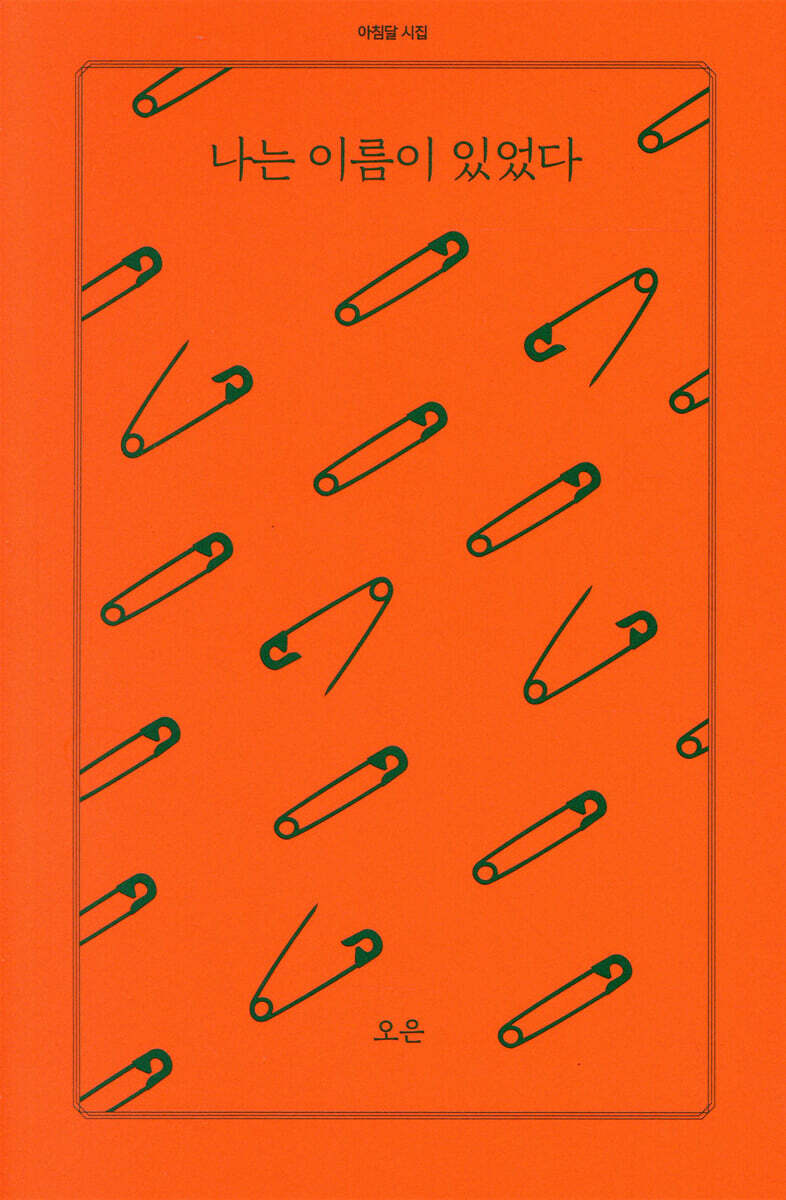 |
 |
제목을 보고 나의 존재에 대해 이야기하는 책일까, 어떤 사람에 대해 이야기하는 책일까, 내 이름도 불러줘야 할 책일까, 이런 여러 가지 생각을 하면서 읽은 시집이에요. 이 시집을 열면 맨 처음 나오는 게 ‘시인의 말’이거든요. 이 글을 제가 퇴근길에 펼쳐서 읽었는데요. 어려운 문장 전혀 없고, 어떻게 보면 상투적일 수도 있는 말인데 읽는 순간 잠깐 회사원 감성이 완전히 사라져버렸어요. ‘사람이라 이해하고 사람이라 오해했습니다.’라는 문장에서 슬픈 느낌도 받았고요. ‘엄마 아빠, 건강하세요. 저는 이제야 겨우 아들이 되었습니다.’라는 문장도 놀랐어요. 시집에 이런 문장을 쓰는 것도 잘 보지 못했는데 이 얘기가 처음에 있어서 그 마음이 느껴졌어요. 저는 이것도 한 편의 시처럼 느꼈어요.
제가 ‘오은탐구생활’ 예비 저자잖아요.(웃음) 『나는 이름이 있었다』 와 『왼손은 마음이 아파』 모두 오은 시인이 많이 담긴 시집이라고 생각했는데요. 오은 시인이 자신의 SNS 소개글로 이렇게 써놨잖아요. ‘이따금 쓰지만 항상 쓴다고 생각합니다. 항상 살지만 이따금 살아 있다고 느낍니다.’ 제가 예비 저자로서 이 문장을 재창작 해봤어요. 읽어드릴게요. 제가 본 오은 시인입니다. ‘이따금 울지만 항상 운다고 생각합니다. 항상 웃지만 이따금 웃고 싶다고 느낍니다.’ 두 시집을 읽으면서 시인이 어떤 사람을 봤을 때 느낀 것들, 그것을 통해 발견하는 자신의 면들을 읽을 수 있어서 좋았어요.
불현듯이 추천하는 책
『이게 다예요』
마르그리트 뒤라스 저 / 고종석 역 | 문학동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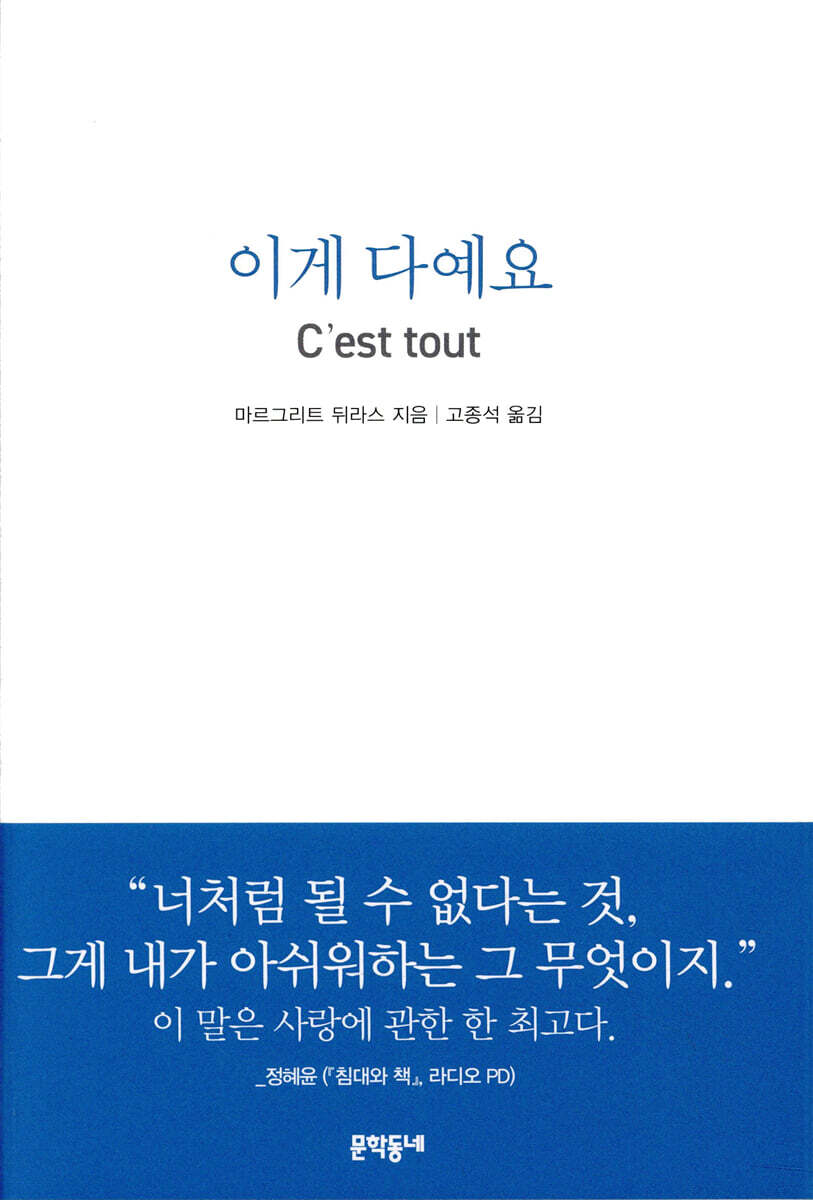 |
 |
소설이라 하기도 뭐하고, 에세이도 아니고 일기도 아니고 시도 아닌 제3의 어떤 텍스트라고 명명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제가 가장 좋아하는 시인은 비스와바 쉼보르스카라는 폴란드 시인이고요. 가장 좋아하는 소설가가 마르그리트 뒤라스입니다. 뒤라스의 작품 중 가장 좋아하는 작품은 『태평양을 막는 방파제』이고요. 『연인』 , 『모데라토 칸타빌레』 , 『히로시마 내 사랑』 같은 소설이 있는데요. 『이게 다예요』 는 뒤라스의 마지막 책입니다. 말년에 뒤라스가 많이 아팠다고 해요. 그때 35살 연하의 연인 얀 앙드레아를 생각하면서 일기 같은 것을 쓴 거죠. 동시에 건강이 악화되는 것을 알고 있으니까 죽음을 직면해야 했고요. 사랑을 기다리면서 어쩔 수 없이 죽음도 같이 기다리는 순간에 쓰인 글이기 때문에 뒤라스의 절박한 느낌이 가장 많이 담겨 있는 책인 것 같아요.
짧은 글인데요. 저는 어떤 부분을 읽다가 버스 정거장 10곳을 지나쳤어요. 한 대목에서는 뒤라스가 이렇게 말해요. 자기는 점점 사물이 되어가는 것 같다고요. 죽음에 가까워지기 때문이겠죠. 저는 그걸 읽으면서 그래서 결국 글을 쓰는 사람들은 사물, 즉 책이 되어가는 것이 아닐까 생각했어요.
행복하다는 감정, 말하자면 얼마쯤 죽어 있는 느낌.
내가 말하고 있는 곳에 얼마쯤 내가 없는 듯한 느낌.
우리가 사탕을 먹다가도 어느 순간 멈출 때가 있잖아요. 그와 같은 순간들이 참 많이 찾아 들어서 이 사탕은 오래 먹고 싶다, 오래 물고 있고 싶다, 라고 느끼게 만들었어요. 사탕이 닳아갈수록 마음이 안 좋아지고 말이죠. 그렇게 한 편, 한 편 읽었던 기억이 납니다. 저는 이 얇은 책을 한 달 정도 읽었어요. 한 편만 읽고도 그것에 대한 다른 상념이 일어나더라고요. 뒤라스는 글을 썼지만 그것이 나에게 질문을 던지는 것 같았어요.

신연선
읽고 씁니다. 장편소설 『구름이 겹치면』, 에세이 『하필 책이 좋아서』(공저)를 출간했습니다.

이지원 PD
채널예스는 예스24에서 운영하는 콘텐츠 플랫폼입니다. 책을 둘러싼 다양한 이야기를 만나 보세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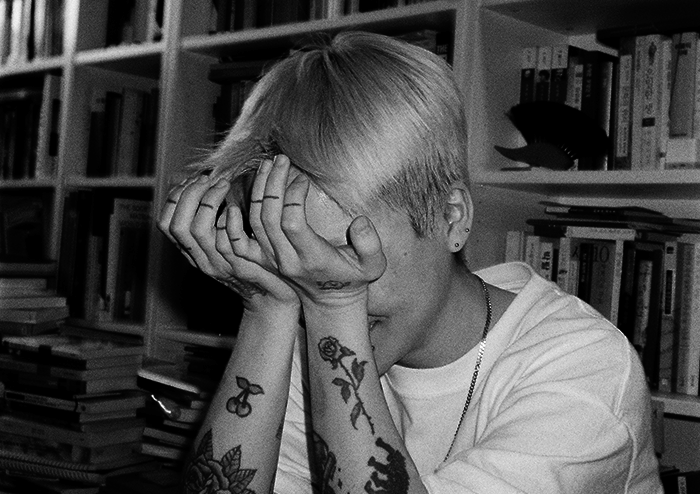
![[리뷰] 멈추고 바라보는 연습](https://image.yes24.com/images/chyes24/article/cover/2025/01/20250123-0c8ad84b.pn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