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모든 요일의 기록』 과 『모든 요일의 여행』 이후, 김민철 작가는 일상으로 돌아왔다. 일상 속에서 ‘취향’은 늘 자격지심을 불러일으킨다. 다들 훌륭하고 특이하고 멋진 와중에 자기 자신은 초라해 보이는 ‘취향’이라는 마법의 단어. 하지만 김민철 작가가 사전에서 찾은 단어의 의미는 달랐다.
취향[취ː향]
[명사] 하고 싶은 마음이 생기는 방향. 또는 그런 경향.
‘좀 촌스럽더라도, 좀 볼품없더라도, 좀 웃기더라도’ 마음이 가는 방향은 다 취향이다. 크리에이티브 디렉터(Creative Director)라는 직함으로 광고의 카피라이터를 쓰는 김민철 작가의 신작 에세이, 『하루의 취향』 은 개인적인 삶의 공간, 물건, 관계, 여행, 일을 살뜰하게 한 단어 안에 모아 펼쳐 보인다. ‘대단하지 않아도, 완벽하지 않아도’ 가장 나다운 하루를 살게 하는, 그 취향.

모든 곳의 취향
‘취향’이라는 주제 안에 글이 엮었어요.
 |
 |
<한겨레>에서 연재한 칼럼 ‘김민철의 가로늦게’가 시작이었어요. ‘가로늦게’라는 말이 후회를 동반한 단어라, 계속 후회 쪽으로 주제가 갔었는데요. 그렇게 하지 않으려 해도 제목 따라서 가더라고요.
‘모든 요일의 후회’가 될 뻔했네요. (웃음)
그렇죠. ‘내가 그때 술만 덜 마셨더라면…’ (웃음) 다시 보니 그때그때 마음에 들어오는, 마음이 향하는 것들을 글로 쓰다 보니 그런 것들이 다 취향이라고 부를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보통 옷이나, 책, 물성을 가진 것들을 선호하는 걸 취향이라고 부르는데, 취향을 넓게 해석해보면 살아가는 방식이나 직업이 다 넓게 보면 취향의 영역이잖아요. 그렇게 생각하니 쓸 것들이 떠올랐어요.
취향을 주제로 삼은 게 좋다고 생각했어요. 최근 트렌드가 거의 ‘너 자신을 알라’에 가깝게 자기 자신을 돌아보라고 말해요. 자기 자신을 아는 데는 취향이 무엇보다 효과적인 방법이고요.
작년 이맘때 제목을 정해놓고 올해 들어야 쓰기 시작했는데, 그때부터 취향이라는 단어가 이곳저곳에서 들려오더라고요. 들을 때마다 움찔움찔 놀랐어요. 회사 광고주 중에 옥션이 있는데 이번 슬로건이 ‘취향존중’이거든요. 팀장 회의에서 그걸 보는데 속으로 ‘어떡하지’ 했어요.
글은 주로 언제 쓰셨어요?
이번 책을 쓰면서 알았는데, 제가 짬짬이 쓰는 스타일이에요. 30분 시간 나면 쓰다가 회의하러 들어가고요. 저도 제가 꾸준히 쓴다고 생각하지 못했는데, 달력에 무슨 날 어떤 글을 썼는지 기록했더니 거의 이삼일에 하나씩 써나가더라고요. 주말에는 더 많이 쓰고요. 제가 성실한 사람이라는 걸 뒤늦게 깨달았어요.
흔히 취향을 자신이 선호하는 물건 정도로만 생각해요. 회사에서 일을 하는 방향도 일의 취향이라고 말한 점이 색달랐어요.
보통 사람들이 생각하기에는 카피라이터 출신은 창의적이어야 하고, 갑자기 아이디어가 번뜩하고 떠오르고 카피도 잘 써야 한다고 생각할 거예요. 하지만 저는 짧은 한 문장으로 뭔가를 표현하는 데는 큰 재주가 없어요. 그런 일들이 그다지 즐겁지도 않았고요. 모범생 DNA가 강한 사람이라 카피와 아이디어를 잘 내기 위해 계속 애를 썼는데, 자세히 들여다보니 제가 제일 신나 할 때는 정리하고 책임지고 프레젠테이션하는 일, 여러 명이 모여서 하나를 만들어가는 과정 자체더라고요. 팀장 역할을 좋아했던 것 같아요. 그럼 저는 프리랜서 카피라이터가 되어서는 안 되는 거죠. 잘하지도 못하는 일을 평생 하면서 돈을 벌어야 하잖아요. 제 일 취향을 존중한다면 저는 회사에 귀속되어야 하는 존재죠.
지금은 만족하시나요?
좋아요. 결국 가장 맞는 일을 찾았다고 느끼고 있어요.
회사의 카피로 못 채운 마음은 책을 쓰면서 채워나갔을 것 같아요.
전환하는 속도가 빠른 편이에요. 카피는 기본적으로 길게 쓰는 글이 아닌데, 제게 어울리는 글은 책에 실린 글이라고 생각하거든요. 둘 다 할 수 있어서 운이 좋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일의 취향을 말하면서 ‘야근 안 시키는 팀장’이 되어야겠다고 결심하기도 해요.
솔직히 말하면 100%라기보다 거의 안 하려고 노력하고 있고요. 일이 잘 끝나지 않는 이유는, 대부분 관리자가 빨리 결정하지 않고 책임을 지지 않았기 때문이거든요. 여러 가지 아이디어 중 하나를 채택하는 건 자기가 확신을 가지고 책임지겠다는 거잖아요. 그걸 가지고 일이 되는 건데 자기 확신을 가지지 못하니까 “이것도 괜찮은데… 저것도… 다시 해 봐…” 이렇게 되는 거죠. 그렇게 하지 않으려고 뭐라도 정리하고 결정을 내리려고 하면 괜찮아져요. 다만 꼰대 마인드가 튀어나오지 않으려고 노력해요. 어떤 사람이 어떤 사생활을 가지고 있든 오늘 회의에 들어와서 일을 제대로 한다면 그 과정을 보지 않으려고 많이 노력하고요.

사람 사귀기에도 취향이 있다
사람을 만나면서 자기 자신이 달라지기도 하잖아요. 사람에 대한 취향도 바뀔 것 같아요.
회사에 다니면서 제일 많이 바뀌었어요. 그전에 우리가 만나게 되는 사람들은 대개 상황에 의해 강제로 주어진 사람이잖아요. 하지만 어른이 되고 취향으로 사람을 만난다는 걸 많이 느꼈어요. 그러면서 사람을 점점 더 적게 만나니까 자기 취향에 맞는 사람들만 만나게 되는 것 같기도 하고요.
남편 분 이야기가 특히 많이 나와요. ‘사랑만큼 자신의 취향이 고스란히 드러나는 게 또 있을까’ 싶게요.
남편에 관한 내용으로 거의 한 장을 썼어요. 같이 모든 걸 경험하기 때문에 근육이 생기는 것처럼 같은 취향이 점점 더 많이 생겨서요.
‘우리는 이렇게 살겠다는 선언’(28쪽)으로 집의 취향을 만드는 데 남편 분이 훌륭한 조력을 하기도 했어요.
남편이 저를 잘 알고 있었던 거죠. 저는 돈을 쓸 때 인간이 이 정도까지 소비를 할 필요가 있나 늘 물어보거든요. 남편은 제가 원하는 게 많다는 걸 알고 있으니까 늘 등을 떠미는 역할을 하죠. 객관적으로 남편은 학생이었고 제가 돈을 버니까, 어떤 사람은 ‘어떻게 저런 남편을 만나지?’ 라고 하고, 또 어떤 사람은 어떻게 ‘제가’ 그런 남편을 만났냐고 묻고는 했어요.
모두 ‘어떻게 저런 남편을 만나?’ 라고 질문하는 건 똑같네요.
그렇죠? ‘너 괜찮아?’ 랑 ‘남편은 괜찮아?’라는 상반된 의미겠지만요. (웃음)
사람을 이야기하자면 김하나 작가님과 황선우 기자님 이야기도 빼놓을 수 없어요. “어떤 책임감도 없지만 유대감만은 가득한 새로운 형태의 가족”(187쪽)이 되었다고요.
가족의 정의가 다시 이루어지고 있잖아요. 너무나 다양한 방식으로 사는 사람들이 많아지는데 사회가 폐쇄적이라 아직 받아들이지 못하고 있어요. 그렇다고 해서 제가 진지한 글을 쓰는 건 어울리지 않고, 할 수 있는 한에서 쓰려고 했던 것 같아요. 페미니즘 이야기도 마찬가지였고요.
“멋진 언니, 멋진 동생, 더 많이 원합니다.”(51쪽)이 어찌 보면 작가님의 페미니즘인 거죠.
원래 처음 썼던 글은 탈춤으로 시작해서 시시하게 끝났는데 이번에 하고 싶은 이야기가 많아져서 뒤가 완전히 투사가 됐었어요. 무거워지고요. 편집자님이 조심스럽게 “앞과 뒤의 글이 너무 다르다, 뒤에 주먹을 너무 세게 쥐었다.” (웃음)고 말씀하셔서 지금 실린 글은 괜찮아진 버전이에요. 직업병인 것 같아요. 광고는 이걸 통해 뭘 하겠다는 목적이 있는 글인데, 그렇지 않은 글을 쓰면서도 계속 이걸 왜 읽는지 스스로 질문을 많이 하거든요. 남의 책에서는 그런 걸 원하지 않는데 스스로 어디로 향하고 싶은지가 없으면 되게 불안해하더라고요.
칼럼에도 꼭 교훈을 넣어야 될 것 같죠.
그걸 어떻게 떨치지 하면서도 계속 불안해져서 주변 사람들한테 물어봐요. 어쩔 수 없죠. 직업을 15년을 했는데 영향이 있겠죠. 『모든 요일의 여행』도 그랬거든요. 결국 말하고 싶은 건 “너희 왜 블로그처럼 여행하냐, 하고 싶은 대로 해!” 였는데 교조적으로 말하면 안 되니까 살살 몰아넣었어요. (웃음)
'취향 존중'은 오로지 나의 몫
보통 회사에 다니는 사람들이 자기 취향을 더 날카롭게 벼리는 것 같아요. 일에서 자기 자신이 드러날 수 없으니 취향을 개발해서 자기 자신을 채운달까요?
저도 회사에 다녀서 그랬나 봐요. 밀란 쿤데라의 『불멸』 을 보면 자매가 나와요. 한 명은 덧셈으로 자기 인생을 판단하고, 한 명은 뺄셈으로 자기 인생을 판단해요. “나는 누구지?”라는 질문에 언니는 자기가 아닌 것들을 계속 소거해 나가고, 동생은 자신이 가진 것들을 꼽으면서 자기 자신을 더해나가요. 책을 쓰면서 그 두 명을 많이 생각했어요. 저는 언니 같은 캐릭터라고 생각해 왔는데 책을 쓰다 보니 어쩔 수 없이 제가 가지고 있는 것들, 겪은 경험을 주섬주섬 챙겨서 덧셈하게 되더라고요.
반면 스스로 취향을 말하면 이상하게 기가 죽는 때가 많아요. 왜 그러는 걸까요?
너무 많은 사람들의 많은 것을 알 수 있는 환경에 둘러싸여 있다 보니 끊임없이 생각하는 것 같아요. SNS를 보면서 ‘이 사람은 이렇게 사는데 나는 왜 이러지?’ ‘저 사람이 입은 옷은 완전 비싼 걸 거야’라고 생각하고요. 그 옷이 싼 거였으면 그 사람의 안목을 또 부러워했을 거예요. 끝없이 남들은 긍정하면서 자기 자신은 부정하는 환경에 우리를 밀어 넣고 있더라고요. 작게는 옷부터 집, 모든 걸 비교하면서 자기 취향을 움츠러들게 만드는 게 아닌가 싶어요.
돌이켜보면 작가님은 어땠나요?
제가 어떤 취향이 있다고 생각하지 않았는데, 대신 호불호가 강했어요. 물건을 사야 하거나 결정해야 할 때는 명확하거든요. 저 혼자 감당하면 되는 거니까요. 쉽게 결정하는 걸 제 취향이라고 말할 수 있을까 생각하다 보니, 결국 제 생각을 제 취향이라고 긍정해주지 않으면 끊임없이 남들과의 비교 지옥에서 살아남을 수 없더라고요. 여행지, 사진, 비교할 게 너무 많으니까요.
반대로 생각하면 작가님을 선망하는 독자들도 있을 거예요. ‘망원동 사는 힙스터’의 전형으로요. (웃음)
그럴 수 있죠. 제 취향을 존중하면서 살고 싶은 대로 산 결과물을 남들이 보면 ‘광고 회사 팀장으로 책도 내고 여행도 다니고 서울 안에서 집 구해서 사는 좋은 삶’이 될 수도 있을 거예요. 하지만 사람들이 저한테 보게 되는 건 결과예요. 제가 관심 있는 건 결과보다 그 중간에 고민하고 꾸준하게 견뎠던 순간들이에요. 자기 취향을 존중해줄 수 있는 사람은 자신밖에 없어요. 그럼 자기 자신이 그걸 존중해줘야 해요. 그 취향대로, 마음의 소리를 무시하지 않고, 남들의 시선을 판단 기준으로 놓지 않고 살아가다 보면 이정표가 생기고 보석이 생기지 않을까요? 그걸 또 소중히 여길 사람은 자기밖에 없고요.
자아존중과도 연결되네요.
『모든 요일의 기록』이나 『모든 요일의 여행』 모두 뒤돌아 생각하면 취향의 다른 표현이 아닐까 싶었어요. 특히 『모든 요일의 여행』도 남의 여행이 아니라 자기 여행을 하라는 말이었잖아요. 이번에는 여행이 아닌 일상으로 무대를 옮긴 거겠죠.
-
하루의 취향김민철 저 | 북라이프
남의 시선을 배제하고, 불확실한 미래에 대한 걱정을 접어두고, 나의 마음을 꼼꼼히 파악하여, 나에게 가장 어울리는 선택을 내리면 된다. 사전에서 단호하게 설명하는 것처럼, 내 마음에 응답하면 될 일이다.

이관형
채널예스는 예스24에서 운영하는 콘텐츠 플랫폼입니다.

정의정
uijungchung@yes24.co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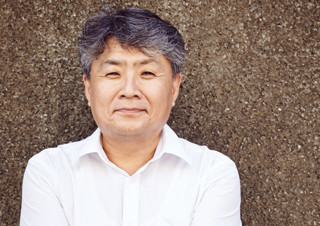





앙ㅋ
2018.07.23
작가님 옆모습보다 정면이 훨씬 이뻐여
쿤데라의 '불멸'에 자매의 저럼 특성이 있는지 작가님 인터뷰를 읽고 알았네요.
이번책 가족이야기 가족의 재정의에 관한 이야기 깊이 공감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