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언스플래쉬
풍경을 펼쳐놓았다. 계절에 고립된 창문처럼. 나는 오래오래 들여다봤다. 그래야 새삼스러워지니까. 달력의 이미지를. 5월의 전형을. 새삼스러울 때까지 바라보는 것이다. 울창한 나무 사이에 가족이 있다. 여자와 남자. 여자는 한 손에 아이의 손을 잡았다. 남자는 그보다 작은 아이를 목말 태웠다. 가족이 석탑처럼 견고해 보였다. 5월의 전형은 아직까지도 화목한 가족이 차지하고 있는 모양이다. 집 안의 사물들을 차례차례 들여다봤다. 목재 가구의 나뭇결이 절규하는 얼굴처럼 보일 때까지. 식탁보의 꽃무늬 속에서 빨간 풍뎅이가 날아오를 때까지. 사물의 차례가 끝나면 사람의 차례다. 어머니를 그리고 아버지를, 형제를 들여다봤다. ‘혈연이라는 거 진짜 너무하네. 피는 지울 수도 없는데!’ 이런 미칠 것 같은 새삼스러움이 찾아들 때까지 말이다. 나의 아버지도 나를 목말 태운 적이 있었지. 어머니가 오빠의 손을 잡았었고, 우리도 딱 저런 포즈로 소풍을 갔었다. 지금은 당연히 그러지 않는다. 지금이 어떻다고 말하는 건 좀 잔인한 것 같으니 생략하겠다. 한 지붕 밑의 살림살이와 사람들을 곰곰이 들여다보고 있으면, 여기는 무슨 소굴일까 싶다. 가족의 소굴. 그걸 가정이라고 부르는 것일까.
연못이 바다보다 더 어려운 둘레라는 것을
설명하지 못하고 굳어 갈 때
-「나의 연못」 부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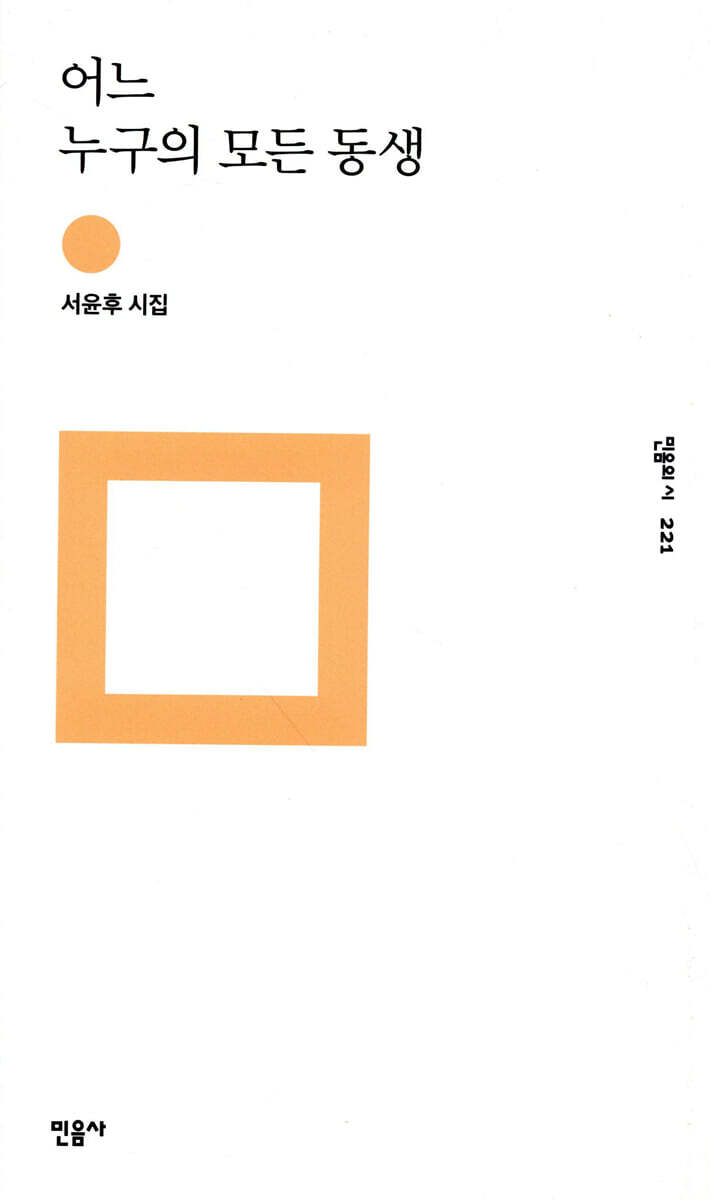 |
 |
가족을 거부한 적 있다. 미워한 적 있다. 어디 한두 번인가. 거부와 미움을 잠시라도 멈춘 적이 없다. 그런데 정신을 차려보면 나는 어느새 가족을 끌어안고 있다. 말뚝에 매인 염소처럼 같은 둘레를 맴돌았다. 뜯어 먹을 풀도 없는 나의 둘레는, 나를 살게 하는 것인가 죽게 하는 것인가. 그러나 포기하지 않고 벗어나고자 했다. 그러다 알게 된 것 한 가지. 거부와 거부할 수 없음의 반복, 미움과 미워할 수 없음의 반복, 이 반복된 운동으로 마음의 둘레가 점점 무너지더라는 것이다. 헐렁해진 고무줄처럼 끊어지기보다는 느슨해지더라는 것. 가족에게서 달아났다가 어쩔 수 없이 돌아오는 길에는 자꾸만 용서하게 됐다. 바라지 않게 됐다. 자잘한 미움이 덕지덕지 들러붙은 가정은 커다란 미움의 소굴이 아니라, 너덜너덜하고 볼품없는 연민의 작은 이불이 됐다. 사랑이라고 말하기에는 부끄러운 이상한 감정이 따라다녔다. 권위적이고 예민한 아버지와 아버지에게 일찌감치 지쳐버린 어머니의 (나로서는) 영문을 모르겠는 분노. 이해하진 못했지만 알아보게 됐다. 더 나은 상태를 바라지 않게 됐다. 포기라고 부르기에는 슬프고 어려운 마음이다.
여자와 남자. 그들에게 사랑이 있었다. 사랑은 사랑이 전부인 줄로만 알았다. 어리고 서툴렀다. 아이들이 태어났다. 밥을 먹지 않겠다고 영양실조에 걸릴 때까지 고집을 피우던 아이였다. 여자는 아이 앞에 쪼그리고 앉아 엉엉 우는 날이 많았다. 한 손에 숟가락을 꼭 쥐고서. 피가 나는 것을 봐야만 제 허벅지 안쪽을 쥐어뜯는 것을 멈추던 아이다. 남자는 아이가 자신을 쥐어뜯지 않게 하려고 아이가 잠들 때까지 아이의 팔을 감싸 안고 꾸벅꾸벅 졸았다. 하품을 하면 눈물이 찔끔 고였다. 나는 부모의 이런 장면을 생생하게 기억한다. 남자와 여자는 아이들을 먹이고 재우고 입히는 동안 사랑이 희미해지는 줄도 몰랐겠지. 매 순간이 싸움과 화해였겠지. 가족을 석탑처럼 쌓아 올리기 위해. 내 상처를 내밀면서 이건 당신 때문이라고 탓할 수가 없다. 어리고 서툰 남자와 여자가 아른거린다. 다 큰 내 눈앞에.
눈곱 낀
일요일의 사람들
누군가 선물로 해 준 작명
얼어붙은 이름을 자꾸 불러 주자
녹기 시작한 피
동생이 형처럼 엄마가 언니처럼
누나가 아이처럼 아빠가 유령처럼
커튼을 열고 환기를 시키는 동안의 혼숙
-「가정」 전문
이제 이웃을 엿보는 기분으로 서윤후 시인의 가정을 들여다볼까. 새삼스러워 보일 때까지. 평일의 각개 전투를 마친 남자와 여자 그리고 그 자식들이 한 지붕 아래서 늦잠을 잔다. 각자의 방문을 닫고. 흰 눈곱을 주렁주렁 매달고서 긴 하품을 한다. 각자의 체취는 각자의 방 안에만 고인다. 아이들이 태어나 받은 첫 선물은 남자와 여자가 지은 이름이었을 것이다. 이름 따라 간다는 말, 이름을 자꾸 불러줘야 건강하게 자란다는 말을 믿었기에 남자와 여자는 자꾸만 아이들을 불렀겠다. 이름에 담긴 좋은 뜻을 기억하면서. 그러나 각자의 방 안에선 이름이 필요 없다. 동생은 형이 되고, 엄마는 언니가 될 수 있다. 누나는 아이가, 아빠는 유령이 될 수 있다. 각자의 방이기에. 그러나 일요일이지 않은가. 그들은 각자의 방문을 열고 게으르게 걸어 나온다. 각자의 체취가 훅훅 끼쳐 거실로 모인다. 환기를 위해 커튼을 젖히면 가정의 냄새는 창밖으로 흐른다. 야외의 냄새와 자리를 바꾼다. 따로 또 같이 헐렁해진 둘레, 가정이다.
5월의 마지막 날이 지나가고 달력이 넘어가면, 유월의 첫날이 앞장선다.
-
어느 누구의 모든 동생서윤후 저 | 민음사
‘공룡 인형’처럼 상처는 아득한 과거에서 왔고, 우리는 과거의 상처를 바라보고 쓰다듬으며 다음의 이야기를 찾는 길에 올랐다.
어느 누구의 모든 동생
출판사 | 민음사
어느 누구의 모든 동생 - 민음의 시 221
출판사 | 민음사

유계영(시인)
1985년 인천 출생. 동국대학교 문예창작학과를 졸업했다. 2010년 《현대문학》 신인추천으로 등단하였으며, 시집 『온갖 것들의 낮』이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