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오픈데이 폐지를 결정하고 공지를 올리기까지 긴 시간이 걸렸다. 토요일마다 사적인서점을 찾는 단골 손님들이 마음에 걸렸다. 결정을 내리고도 하루에 몇 번씩 자책하던 나를 멈추게 한 건 공지에 달린 댓글이었다. “지혜 씨가 그렇다면 그것으로 충분한 것.” 염리동에서 여행책방 일단멈춤을 운영하다 지지난 여름 문을 닫았던 은정 님이 남긴 댓글이었다. 내가 그렇다면 그것으로 충분한 것. 무언가를 내려놓는 데 다른 이유는 필요 없었다.
“너의 가능성은 무한한 동시에 유한하다.”
자신의 가능성을 최대화하기 위해서는 자신의 가능성에 한계가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자신의 가능성을 키우기 위해서는 자신의 가능성을 소중히 아껴야 합니다. - 우치다 타츠루, 『힘만 조금 뺐을 뿐인데』 , 19쪽
몸과 마음이 모두 소진된 이후, 일 다이어트가 시급했다. 지금까지 이것저것 가리지 않고 시도해보며 경험을 쌓았다면 이제부터는 경험에서 배운 것들을 토대로 우선순위를 정하고 일을 줄여야 했다. 열심히 일할 줄만 알았지 들어오는 일을 거절하고 정리하는 일은 생각보다 쉽지 않았다.
사적인서점이 알려지기 시작하면서 여러 매체에서 취재를 요청하는 연락이 왔다. 서점 홍보는 기쁜 일이었고, 기자 혹은 에디터의 시선으로 바라본 글을 통해 미처 살피지 못했던 부분을 발견하고 보완할 점을 찾기도 했다. 무엇보다 인터뷰를 진행하며 내 생각을 뾰족하게 가다듬을 수 있어 좋았다. 하지만 모든 취재가 그런 건 아니었다. 사적인서점에 대한 최소한의 정보조차 알아보지 않고 오거나 그저 서점의 이미지만 소비하고 싶어 하는 곳도 많았다. 그렇다고는 해도 취재 요청을 거절하긴 힘들었다.
하루는 땡스북스 이기섭 대표님을 만나 고민을 털어놓았다. 대표님의 처방은 간단했다. “지혜 씨, 까칠할 필요는 없지만 엄격할 필요는 있어. 이건 지혜 씨 이름을 걸고 하는 일이잖아.” 그랬다. 나는 까칠함과 엄격함을 혼동하고 있었다. 내 기준에 맞지 않는 취재 요청을 거절하는 일은 무례가 아니라 서점을 엄격하게 관리하는 일이었다. 그날 이후로 취재뿐 아니라 이벤트, 협업, 기고, 강연 등 여러 요청에 대한 사적인서점만의 기준을 세우고, 그에 맞지 않는 요청은 정중히 거절했다. 요청을 거절하면 더 이상 제안이 들어오지 않거나 좋지 않은 소문이 나는 등 큰일이 날 줄 알았는데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다. 오히려 사적인서점의 운영 방침을 존중하고 지지해주어서 큰 힘이 됐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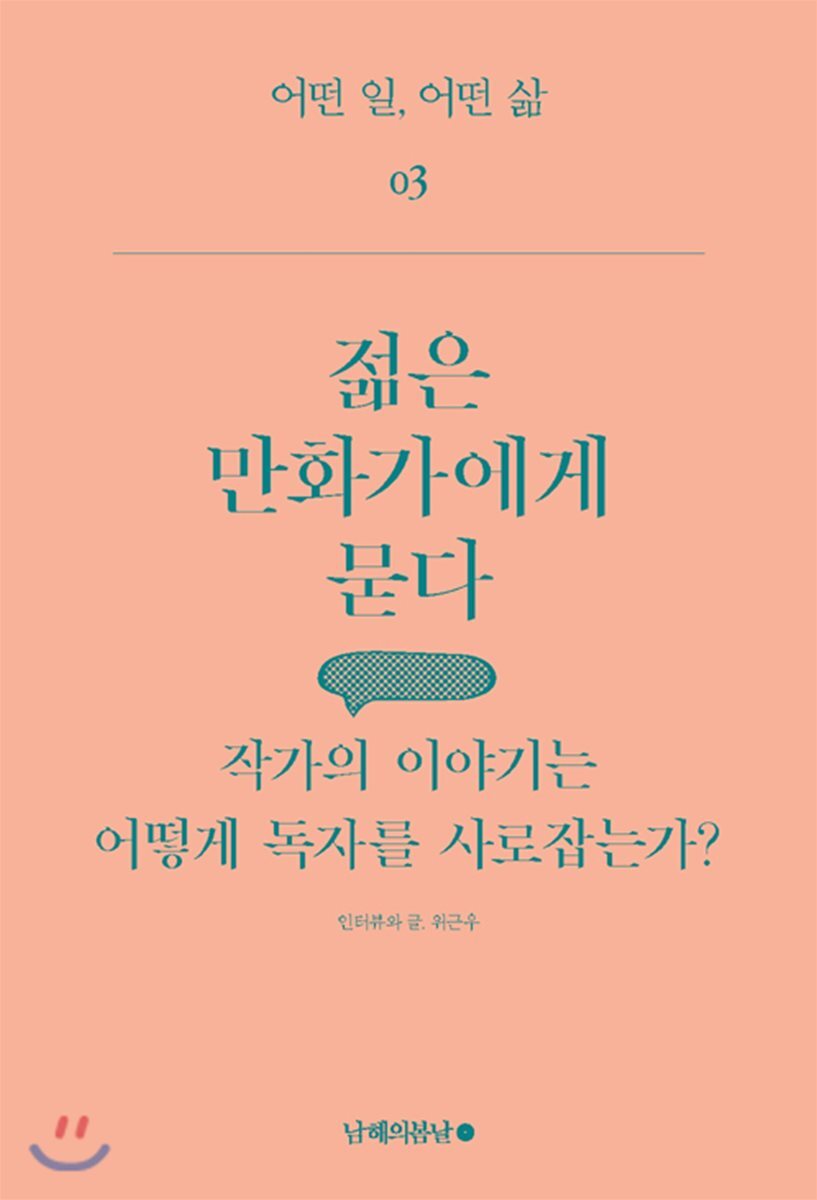 |
 |
안 할 이유가 아닌 할 이유를 찾는다. 얼핏 들으면 능동적으로 일을 하자는 이야기처럼 들리지만 반대다. 어떤 제안에 대해 안 해야 할 이유를 찾다 보면 결국 손해만 아니면 하게 된다. 당장 내 돈을 까먹는 게 아니면, 어차피 남는 시간 좀 쓴다고 내 스케줄이 꼬일 게 아니라면, 안 할 이유가 없다고 생각하게 된다. 하지만 할 이유를 찾는 건 다르다. 나의 노력에 대한 확실한 보상이 있는가? 그 보상은 무엇인가? 그것은 분명 나에게 도움이 되는 보상인가? 이런 질문을 통해서만 해야 할 일인지 아닌지가 드러난다. 조금 더 간단히 설명하자면, 안 해도 될 이유를 찾으면 안 해도 될 일을 제외한 모든 일을 하게 되고, 해야 할 이유를 찾으면 해야 할 일만 하게 된다. - 위근우, 『젊은 만화가에게 묻다』 , 156쪽
우선순위를 정리해가던 중에 위근우 작가의 젊은 만화가 인터뷰집에서 만화가 김정연이 이야기한 일을 선택하는 기준을 보고 무릎을 쳤다. 지금까지 나는 하지 않아도 될 일을 제외한 모든 일을 하고 있었다. 하지 않을 이유가 아닌 할 이유를 기준으로 살피다 보니 생각지도 ‘토요일 오픈데이’가 마음에 걸렸다. 사적인서점은 예약제 서점이지만 책처방 프로그램을 이용하지 않고도 서점에 방문하고 싶은 분을 위해 매주 토요일을 누구나 방문 가능한 오픈데이로 운영했다. 사적인서점은 '책이 없는 서점'을 생각하며 만든 곳이고, 책처방 프로그램은 상담 후 책을 배송하는 방식이기 때문에 재고를 보유하지 않고도 운영할 수 있었지만, 생각을 바꿔 오픈데이를 만든 데에는 크게 세 가지 이유가 있다. 첫째, 생소한 운영 방식 때문에 손님이 오지 않을 것을 대비한 안전장치였다. 예약제와 유료 프로그램이라는 허들 없이 사적인서점을 이용할 수 있도록 접근성을 높인 것이다. 둘째, 서점의 정체성에 대한 부담 때문이었다. 사람들이 책이 없는 서점은 서점이 아니라고 여길까봐 두려웠다. 삼백 여권의 책을 들여 서점다운 최소한의 장치를 만들었다. 마지막으로 내가 책을 파는 일을 좋아했다. 지속 가능성을 생각하며 예약제 방식을 선택했지만, 나는 열린 공간에서 사람을 만나고 책을 소개하는 일 자체를 즐기는 사람이었다.
나는 서점을 통해 하고 싶은 것이 너무 많았다. 책처방도 다양한 손님을 만나는 일도 놓치고 싶지 않았다. 오픈 후 얼마 동안은 매주 도서 진열을 바꾸고 매달 전시를 기획했지만 점점 그 횟수가 줄어들었다. 무엇보다 들쑬날쑥한 토요일 영업 성적에 마음이 요동쳤다. 애초에 사적인서점은 4층에 자리잡고도 간판조차 만들지 않은 곳이었다. 그런데 오픈데이만 되면 마음이 오락가락했다. ‘서점이 1층에 있었다면 더 많은 손님이 왔을 텐데…’ 지금 공간에서는 폐쇄성이 필요한 책처방 프로그램과 개방성이 필요한 책 판매라는 상반된 두 가지 일을 병행하는 것 자체가 무리였다. 우연히 다른 서점에 들렀다가 구석구석 주인의 손길이 닿지 않은 곳이 없는 모습을 보고 자괴감에 며칠 잠을 설쳤다. 책처방과 오픈데이 모두 완벽하게 해내고 싶다는 나의 바람은 두 마리 토끼를 잡으려는 사냥꾼의 욕심 같았다.
토요일 오픈데이를 운영해야 할 이유는 뭘까? 곰곰 생각해 보았다. 책처방 프로그램은 이제 완전히 자리를 잡았고 더 이상 안전장치의 목적으로 오픈데이를 유지할 필요는 없었다. 서점을 운영하는 동안 내가 생각하는 서점의 정의는 '책을 파는 장소'가 아니라 '책과 사람의 만남을 만드는 장소’로 바뀌었기에, 오픈데이가 있든 없든 사적인서점은 서점다운 서점이라고 자신있게 말할 수 있게 되었다. 서점의 정체성을 고집하기 위해 오픈데이를 운영할 이유도 사라졌다. 남은 건 하나, 내가 이 일을 좋아한다는 것이다. “나의 노력에 대한 확실한 보상이 있어?” “그 보상은 뭐야?” “나에게 도움이 되는 보상이야?” 만화가 김정연의 질문을 대입해 보았다. 결론은 선명한 “NO”였다. 나의 가능성을 최대화하기 위해 나의 가능성을 아껴놓을 필요가 있었다. 오랜 고민 끝에 2018년 1월을 끝으로 오픈데이 영업을 종료하기로 했다. 꼭 필요한 포기였다.
젊은 만화가에게 묻다
출판사 | 남해의봄날

정지혜(사적인서점 대표)
한 사람을 위한 큐레이션 책방 '사적인서점'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책과 사람의 만남을 만드는 일을 합니다









![[김해인의 만화 절경] 이거 읽고 그려](https://image.yes24.com/images/chyes24/article/cover/2025/08/20250811-1ad97d18.jpg)

![[젊은 작가 특집] 이유리 “최초로 쓴 글은 저를 위한 이야기였어요”](https://image.yes24.com/images/chyes24/article/cover/2025/06/20250617-23adec02.jpg)
![[젊은 작가 특집] 예소연 “소설이 저를 자꾸 만들어낸다는 생각을 해요”](https://image.yes24.com/images/chyes24/article/cover/2025/06/20250617-e92deffa.jpg)
![[Read with me] 김나영 “책을 통해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어요”](https://image.yes24.com/images/chyes24/article/cover/2025/01/20250109-f468d247.jpg)




찻잎미경
2018.02.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