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나는 문송(문과생이라서 죄송합니다)인이다. 태어나서 ‘이과에 가야겠다.’ ‘수학이 너무 재밌다.’란 생각을 단 한번도 안 해봤다. 그렇지만 과학은 예외였다. 가장 친한 친구가 공돌이었던 까닭에 서당개 삼 년이면 풍월을 읊는다고 여러모로 기회가 많았다. 『E=MC2222222』 이라는 책을 본투비 문과생인 나에게 생일선물해준 그는 그 뒤에도 알 수 없는 여러 과학자들 이야기를 했다. 아쉽게도 나는 아는 이가 거의 없어서 맞장구를 쳐주지도 못했다. 다행히 친구는 나에게 그저 말만 하는 타입은 아니어서 내가 좋아하는 소설가, 시인의 작품 이야기도 차분히 들어주었다. 그렇게 서로의 관심사가 2년, 3년 이상 쌓이다 보니 친구 없이도 내가 저절로 과학자들에게 눈길이 가기 시작했다. 결정적인 계기가 된 건 바로 1년 전 작고한 의학계의 시인, 이름만 봐도 아름다운 구절과 문구가 떠오르는 올리버 색스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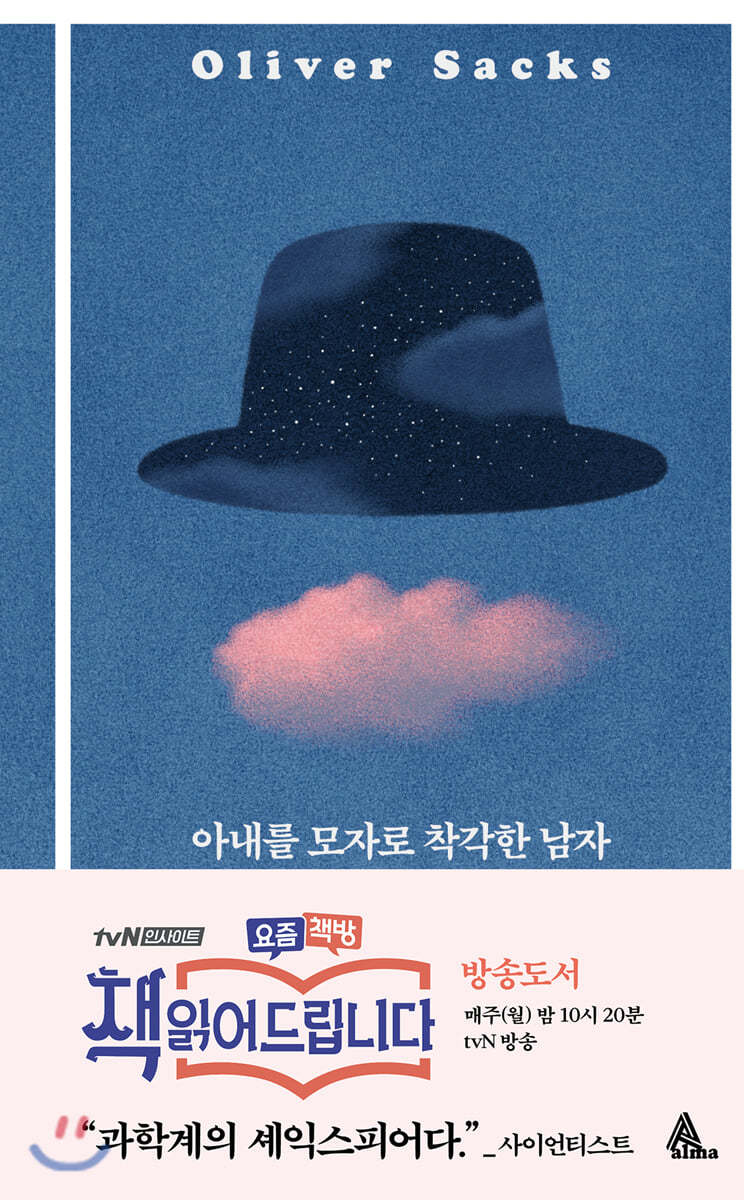 |
 |
그를 처음 알게 된 건 『아내를 모자로 착각한 남자』라는 책이었다. 고등학교 졸업을 앞둔 2007년쯤, 집에 처박혀 도서관에서 빌려온 책들을 귤과 함께 먹어 치우던 시절이었다. 새로운 인문 신간이라며 추천 리스트에 있어 가져오긴 했는데, 이름도 영 낯설고 표지도 얇아 잘 손에 잡히지 않았다. 그러다 반납시기를 하루 남기고 겨우 들춰봤다. 거기에 신경학 전문의사라니! 신경학의 ‘신’도 모르는 내게 전혀 끌리지가 않는 저자였다. 그냥 책을 반납해야겠다고 생각하며, 습관처럼 책의 왼쪽 날개를 보았다. 올리버 색스의 얼굴과 한 구절이 써 있었다. “나는 인간이 어떤 부분을 상실하거나 손상 당한 상태에서 그것을 이겨내고 새롭게 적응해나가는 과정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싶다.”
‘어라, 신경학 이야기가 아니었나?’ 고개를 갸우뚱하며 책장을 넘겼다. 거기엔 인간의 상실에 관한 임상사례가 흥미롭게 진행되고 있었다. 진료가 끝났다고 여기며 모자를 쓰려다 아내의 머리를 잡고서 자기 머리에 쓰려고 하는 ‘아내를 모자로 착각한 P선생님’, 1945년까지만 기억하고 단기기억상실증에 걸려 아내를 잃은 사실을 인정하지 못하는 뱃사람 지미, 스스로를 ‘익살꾼 틱 레이’라고 부르는 투렛 증후군 환자까지 총 24편의 사례는 올리버 색스가 앉은 병실 속에서 하나의 파노라마처럼 흘러간다.
그 중에서도 가장 기억에 남았던 것은 바로 마지막에 실린 자폐증 환자, 호세였다. 발병 후, 15년간 아무도 만나지 못하고 고립된 채 세상을 등지고 살았던 21세의 환자가 올리버 색스 박사를 만나고 자기표현도 어느 정도 하게 되다가 어느 새 자신의 마음과 상태를 그림으로 표현할 수 있는 예술가가 되는 과정을 보며 나는 밀려오는 감정을 좀처럼 주체할 수 없었다. 내 생애 이렇게 인간에 관해서 깊이 통찰했던 글을 본 적이 있었던가. 단순히 환자가 아니라 한 인간으로서 그들을 이해하고, 끌어올리는 의사 올리버 색스를 넘어, 그들을 아름다운 언어로 기록화하는 그를 저자로도 진심으로 사랑하게 되는 순간이었다.
강렬한 첫 만남을 시작으로 나는 올리버 색스의 작품들을 읽기 시작했다. 우리 모두가 ‘음악 폭격에 포위된 상태’이며, 그것을 어떻게 인간이 즐기고 있는지에 관해 쓴 임상보고서 『뮤지코필리아』, 그가 얼마나 훌륭한 신경의학자인지 단박에 알 수 있었던 『편두통』, 『깨어남』도 탐독해 나갔다. 특히 『깨어남』의 경우에는 1920년대에 유행했던 수면병에서 살아남은 환자들을 만나면서 그들을 관찰하고 연구한 것을 올리버 색스의 특유의 문체와 아름다운 언어로 약 600여쪽 내내 이어지는 신비로운 기록문학이다.(비록 자연과학에 분류되어 있지만, 이게 문학이 아니라면 어떤 게 문학이란 말인가!)
“약이 가져온 1969년 여름의 깨어남은 섬광처럼 왔다가 갔다. 그 광경을 다시는 보지 못할 것이다. 그러나 그 섬광 끝에 무언가 다른 것이 나타났다. 그것은 더 느리고 심오한 상상의 깨어남, 서서히 발전하면서 어떤 감정, 반짝임, 감각, 힘의 형태로 그들을 감싸준 무언가, 약물에 의한 것도, 화학작용에 의한 것도, 가짜도, 공상도 아닌 무언가였다. 그들은 (브라운 경의 말을 풀어 쓰자면) 자기 존재의 품속에 다시금 안착했다. 그들은 존재의 근거를 다시금 느낄 수 있었고 현실이라는 토대에 다시금 뿌리를 내릴 수 있었다.”(『깨어남』 418쪽)
2015년 2월 19일. 뉴욕 타임스에 올리버 색스의 특별 기고문이 실렸다는 소식을 트위터에서 보았다. 전세계의 팬을 울리는 기고문이었고, 나는 그것을 보고 마음을 가라앉히지 못했다. 그리고 그 해 8월. 그가 작고했다는 소식이 들려왔다. 2015년 마지막 날, 『온 더 무브』가 한국에 번역되었다. 올리버 색스가 타계 직전에 쓴 자서전을 읽으며 나는 펑펑 울었다. 영국 런던에서 태어나 의사로 활동하면서 한 곳에 머무르지 않고 계속 ‘여행’해나갔던 그의 흔적을 다 읽기가 아쉬워 하루하루 아껴 읽었다. 환자에 관해, 인간에 관해, 그리고 자기 자신에 관해 이렇게 뜨겁게 성찰하고 바라본 사람이 또 있을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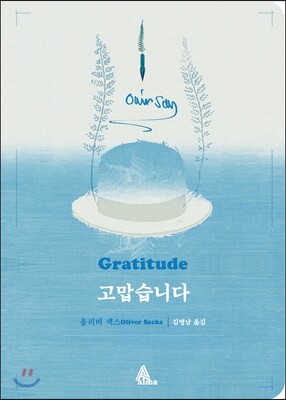 |
 |
내가 흠모했던 올리버 색스가 떠난 지 벌써 1년이 지났다. 『고맙습니다』가 스폐셜 에디션으로 계속해서 나오고, 독자들이 이에 반응하는 것을 보면 나와 같이 많은 이들이 그를 잊지 못하고 있는 것을 체감한다. 우리가 사랑했고, 동시에 사랑 받았던 올리버 색스. 그의 1주기에 그가 사랑했던 이 행성 ‘지구’에서 살고 있는 우리, 그리고 우리를 구체화 하고 있는 삶을 돌아본다. 그 어떤 삶도 어리석지 않으며, 결코 부족하지 않음을 그의 마지막 인사 속 한 구절에서 재확인하면서.
아래는 내 눈물을 쏙 빼어놓은 구절이다. 이쯤에서 올리버 색스에 관한 나의 구질구질한 사랑을 마무리 지어야겠다. 많은 사람들이 그의 따스한 시선과 아름다운 언어를 읽어주었으면 좋겠다는 기대와 함께.
비스무트는 83번 원소다. 나는 살아서 83번째 생일을 맞을 것 같지 않다. 그러나 주변에 온통 ‘83’이 널려 있는 것이 어쩐지 희망차게 느껴진다. 어쩐지 격려가 된다. 게다가 나는 금속을 사랑하는 사람들조차 눈길 주지 않고 무시하기 일쑤인 수수한 회색 금속 비스무트를 각별히 좋아한다. 의사로서 잘못된 취급을 받거나 하찮게 여겨지는 환자들에게 마음이 가는 내 성격은 무기물의 세계에까지 진출하여, 마찬가지로 여기에서도 비스무트에게 마음이 가고 마는 것이다.( 『고맙습니다』 39쪽)

-
고맙습니다올리버 색스 저/김명남 역 | 알마
이 책에 실린 에세이 4편은 저마다 독특한 존재인 우리 인간을, 그리고 삶이라는 선물에 대한 감사를 노래하는 따뜻한 송가이다. 《온 더 무브》가 올리버 색스가 추구했던 나아가는 삶에 대한 회고록이었다면, 《고맙습니다》는 생의 마지막 순간 사랑하는 이들에게 전하는 마지막 인사다.

김유리(문학 MD)
드물고 어려운 고귀한 것 때문에 이렇게 살아요.










![[리뷰] 여성들의 로맨틱한 성장기](https://image.yes24.com/images/chyes24/article/cover/2025/07/20250729-26ddf5f5.jpg)












민재씨
2016.09.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