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종종 무심한 어른들의 말과 시선은 아이들의 맘에 가닿지 못하고 허공으로 증발한다. 자신들도 치열하게 겪었던 일들을 되짚지 못하고 그저 현실을 버거워하는 어른들은, 아이들의 세상이 그저 안온한 세계라 믿기 때문이다. 그래서 주인공 선의 아빠는 이렇게 말한다.
“아이들이 일 있을 게 뭐 있어? 그냥 학교 가고 공부하고 친구하고 잘 놀면 되지.”
하지만 관계가 어려운 주인공 선이에게 학교, 공부, 친구는 모두 지독하게 어려워 풀기 힘든 숙제다. 학교에 가고, 공부를 하고, 친구들과 만나는 것 자체가 어린 소녀에게는 치열하고도 지독한 짐이라는 것을 이해할 리가 없는 부모 앞에서 관계에 서툴고 표현에 능숙하지 못한 소녀 선이는 입을 꾹 다물 수밖에 없다.
입소문으로 관객 2만 명을 넘긴 윤가은 감독의 <우리들>은 진정 2016년의 발견이라 할 만한 영화다. 딱히 새로울 게 없는 이야기 같지만 새롭다. 전혀 자극적이지 않은데 전하는 메시지는 강하다. 소녀들의 어린 시절을 낭만적으로 회고하는 이야기가 아니라, 칼날처럼 날카롭고 지독해서 끝내 생채기를 입는 서툴고 힘들었던 소녀의 생존의 이야기를 담아내기 때문이다.

누구나 한번쯤 경험해 보았을 인간관계의 어려움과 그 성장의 과정 속으로 쑥 들어간 카메라의 시선 속에 유년시절의 낭만이나 교과서 같은 올바른 해석이 끼어들 틈이 없다. 당연히 관조적인 결말에 이르지도 않고 대안을 내어놓지도 않는다. 딱히 잘못한 것도 없이 왕따를 겪는 선의 감정 속으로 깊이 들어가 편을 먹지도, 누군가를 괴롭혀 끝내 자신을 돋보이게 하려는 보라에게 딱히 적대감을 드러내지도 않는다. 그렇게 윤가은 감독은 끝내 누구 편도 들지 않고 누군가를 비난하는 법도 없이 11살 소녀들의 이야기를 훑어낸다. 그저 모든 것이 어렵고 서툰 아이들의 모습이 여전히 관계 속에서 휘청대는 우리와 다르지 않다는 것을 에두르지 않고 생생하게 보여주면서 말이다.
이야기는 단순하지만, 그 이야기 속을 메우는 아이들의 감정은 널을 뛰듯 들쭉날쭉하고 복잡하다. 아이들과 쉽게 어울리지 못하는 소녀 선(최수인)에게 학교는 고독하고 힘든 공간이다. 따돌림을 당하고 있는데 이유를 도통 알 수가 없다.

여름방학이 막 시작되는 날, 교실 앞을 서성이던 전학생 지아(설혜인)는 그래서 선이에게 특별하다. 금세 친구가 된 두 소녀는 방학 동안 즐거운 시간을 보낸다. 또래 소녀들처럼 누구에게도 쉽게 말한 적 없는 내밀한 이야기를 공유한다. 하지만 새 학기가 시작되고 다시 만난 지아는 달라져 있다. 선을 계속 괴롭히던 보라(이서연)의 곁에서 친하게 지내면서 지아는 계속 선을 밀어낸다. 선은 지아와의 관계를 회복하려고 노력하지만 관계는 점점 더 꼬이고 만다.
서로에게 상처를 주고, 다른 아이들과의 관계에서 오해가 쌓이면서 선과 지아는 끝내 서로만 알고 있어야 할 비밀을 아이들 앞에서 토해내고 만다. 상대방의 말이, 미처 꺼내지 못한 마음이 무엇인지 알지 못한 채, 말이 되는 순간 무너져 버리는 위태로운 관계를 지탱하는 것이 결국 외면과 부정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는 순간, 오롯이 나를 방어하려는 말은 타인에게 폭력이 된다. 이미 알고 있지만, 듣고 싶지 않은 말은 다시 생채기가 되어 돌아온다.
<우리들>은 11세 소녀들의 풋내 나는 관계 속에서 우리들이 끝내 풀어내지 못했던 어긋난 관계의 어려움과 그 지난하고 답답한 속내를 들여다보는 영화다. 무언가를 감추거나 타인을 배려하는 법을 배우지 못한 소녀들은 진심에 가닿지 못하고 자꾸 서로의 맘을 튕겨 내거나 뜻하지 않은 순간 뒤통수를 가격한다. 세 번의 피구 장면이 나오는 것도 그런 서툴러서 공격적인 아이들의 상징이다. 편 가르기에서 마지막까지 선택받지 못하고, 날아오는 공 한번 맞아보지 못한 채 금을 밟았다며 바깥으로 몰려나 버린 소녀는 여전히 중심으로 들어가지 못하고 밀려나지만, 관계 속에서 아주 조금씩 달라진다.
윤가은 감독은 진심과 적의를 능숙하게 감춰내지 못하고 너무나 투명해 곧 깨져버릴 것처럼 아슬아슬한 소녀들의 질투와 두려움을 포착해 낸다. 여기에 여전히 자라서도 관계가 서툰 어른들의 모습을 더한다. 손 한번 제대로 잡지 못하고 용서하는 법도 없이 미워하던 아비를 잃고 통곡하는 선이의 아버지는 여전히 자식들과의 관계에서도 서툰 모습을 보이는데, 뒷모습이 쓸쓸한 우리들의 모습 같기도 하다.
달뜨고 어설프고 미숙했던 어린 시절, 우리는 영원한 우정을 이야기 했지만, 새 학기가 되면 새로운 친구와 또 영원한 우정을 약속했다. 지조 없이, 쉽게 화내고, 쉽게 질투하고, 쉽게 밀어내버리는 친구와의 관계를 겪으면서 우리는 조금씩 성숙해지는 법을, 내 감정을 다스리는 법을 배웠을 것이다.
어른이 되면 아주 많은 것들이 삶의 중심으로 들어오지만, 어린아이들에게 친구는 가족 이외에 처음으로 관계 맺고 사랑하는 첫 번째 타인이다. 그래서 친구가 내게 돌린 등짝이 그 어떤 것보다 가장 무서울 수도 있다. 그런 소녀들의 두려움은 누군가를 괴롭히고 고립시켜, 더 강한 결속력으로 자신을 친구들과 단단히 묶어두려 한다.

선이는 관계에서 상처받았지만, 마지막 피구 장면에서 끝내 용기 내어 친구를 옹호하는 발언을 한다. 그 한 마디가 큰 울림이 되어 관계를 변화시킬 수 있을까? 결론은 나지 않았지만 어른들의 시선으로 아이들을 함부로 재단하지 않고, 그들이 겪는 소동을 성심껏 들여다보는 윤가은 감독의 시선은 못내 따뜻하다. 그래서 각자 다른 곳을 보고 허공을 향해 내던지는 피구공 같은 소녀들의 마음, 제대로 피하지도 오롯이 던져지지도 못한 채 너덜너덜해진 아이들의 마음이 우리들의 마음 위로 살포시 겹친다.

최재훈
늘 여행이 끝난 후 길이 시작되는 것 같다. 새롭게 시작된 길에서 또 다른 가능성을 보느라, 아주 멀리 돌아왔고 그 여행의 끝에선 또 다른 길을 발견한다. 그래서 영화, 음악, 공연, 문화예술계를 얼쩡거리는 자칭 culture bohemian.
한국예술종합학교 연극원 졸업 후 씨네서울 기자, 국립오페라단 공연기획팀장을 거쳐 현재는 서울문화재단에서 활동 중이다.









![[더뮤지컬] <쇼맨> 수아, 미래에서 오늘로](https://image.yes24.com/images/chyes24/article/cover/2025/08/20250814-d81fb2c1.jpg)
![[더뮤지컬] <외쳐, 조선!> 박정혁, 30퍼센트의 성장](https://image.yes24.com/images/chyes24/article/cover/2025/08/20250805-af51576f.jpg)
![[만리포X이희주] 완전한 여자](https://image.yes24.com/images/chyes24/article/cover/2025/05/20250526-24380e14.png)
![[더뮤지컬] 강병훈, 투명한 마음으로](https://image.yes24.com/images/chyes24/article/cover/2025/05/20250514-a3ad62e2.jpg)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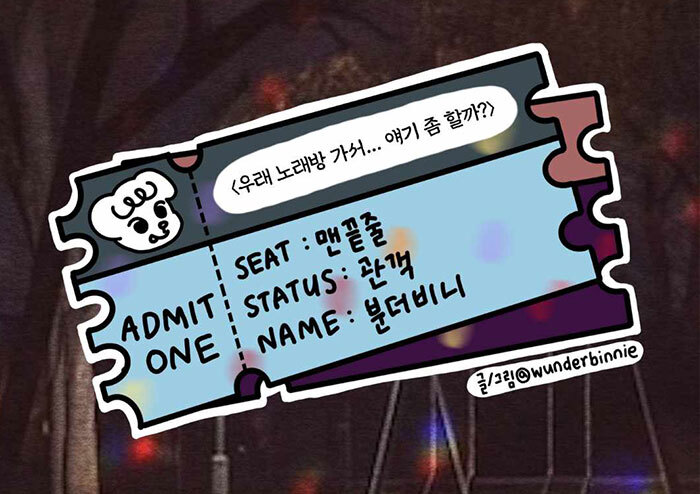


secret0805
2016.07.18
openminds
2016.07.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