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소연의 내향적 삶을 옹호함’이 연재됩니다.
시를 쓰는 이유
잘 쓴 시를 알아보는 사람들의 방식은 저마다 다르다. 누군가는 완성도가 높은 시를 잘 쓴 시라고 말한다. 하지만 완성도가 높다는 의미에서 누군가는 ‘잘 쓴 시’를 쳐주지 않는다. 완성도라는 게 어떤 의미에서는 ‘틀’과 다르지 않기 때문이다. 틀을 갖고 있는 시는 시의 본분에 맞지 않기 때문이다. 또, 누군가는 밑줄 칠 문장이 눈에 쏙 들어오는 시를 잘 쓴 시라고 말한다. 그런 문장만 있으면 페이지 귀퉁이를 접고 기뻐한다.
반면, 누군가는 밑줄 칠 문장 하나 없이 한 편의 시가 멋진 흐름을 만드는 것을 더 좋아한다. 혹은, 딱 내 마음이다 싶은 근친적 감수성을 잘 쓴 시로 여긴다. 내 경우에 잘 쓴 시는, 자신의 한계 바깥으로 그 힘을 뻗어나가는 기운을 보여주는 경우이다. 딱 자기만큼 쓴 시가 아니라, 홀연히 자기 아닌 영역까지 가버리는 시. 사람이 쓴 것 같지 않고 뮤즈가 대신 써준 게 틀림없다고 읽혀지는 시. 시인 친구 S는 이따금 자기가 쓴 시를 보고 “이거 정말 내가 썼나?” 싶어진다고 했다. 시인 후배 K는 이따금 시를 써놓고서 깜짝 놀란다고 했다. 나도 아주아주 가끔 시를 써놓고서 속으로 외칠 때가 있다. “신이시여, 진정 이 시를 제가 썼습니까!”하고. (실은, 세 시간 정도가 경과되고 그 시를 다시 읽어보면 폐기해버리고 싶어진다. 그리고 다시 마음을 가다듬고 새 시를 쓴다.)
시는 어쨌거나 홀연한 것이다. (시가 원래 홀연한 것이어서, 시 속에 “홀연히”, 혹은 “문득”, “갑자기” 같은 부사가 등장하면 나는 김이 샌다. ‘역전앞’ 같은 틀린 말처럼 중언부언 같다.) 시인은 시를 쓰면서 홀연히 자기자신의 한계 바깥으로 슬금슬금 이동한다. 그러기 위해 무언가 (아주아주 쓸모가 없는 어떤 것을) 빤히 노려본다. 오래 응시한다. 너무 오래 쳐다봐서 처음 발견한 것과 다른 것이 될 때까지 그렇게 한다. 시에게 행과 연이 있는 이유는 이 오랜 응시의 시간을 문장이 아닌 것으로 표시하기 위해서다. (사람들은 그래서 시를 읽으며 행과 행 사이에 여백을 만끽한다고 표현한다.) 단숨에 쓰여진 시일지라도, 사전에 이 오랜 응시와 사색이 있었고 그 끝에서 이루어진 단숨이다. 시인은 그렇게 잠시 자신의 처지 바깥에 놓임으로써 갱생을 도모하는지도 모른다. 그 갱생의 맛이 곧 시의 쓸모이다.
산을 보면 나는 산
안개와 연무를 보면 구름
이슬비가 내린 뒤의 풀
종달새가 노래하기 시작하자마자 나는 아침
나는 사람만이 아니다
별이 반짝일 때 어둠
여인들의 옷이 가벼워지자마자 봄
세상 사람들 모두 한 가지 소원으로 향기를 발한다
진정 평화로운 마음으로 나는 물고기
-일. 을지터그스, '나는' 『나뭇잎이 나를 잎사귀라 생각할 때까지』, 이룸
몽골 시인 을지터그스는 몽골 사람이라서 이런 시를 쓴다. 한 명의 몽골 사람인 시인이 쓴 한 편의 시에 몽골의 모든 것이 들어있다. 몽골의 대자연, 몽골의 사계절, 몽골인의 종교관, 몽골인의 표정, 몽골인의 미래까지……. 이런 것들을 담기 위해 시쓰기 이전에 무슨 노력 같은 걸 했을 리는 없다. 노력을 했다면 노력한 흔적이 어떻게든 묻어나올 텐데 이 시 어디에도 애쓴 흔적이 보이질 않는다. 그저 표표하달까. 아니, 홀연하다고 말해야 옳을 듯하다. 이 시를 쓰기 위해 어떤 장소에 서서 어떤 사연들을 응시하며 어떤 표정으로 오래오래 서 있었는지 훤히 보인다. 훤하게 보인다는 것 때문에 이 시에 적힌 문장들 이상의 큰 장면이 우리에게 다가온다. 자그마한 한 권 시집의 한 페이지에 적힌 몇 줄의 시라고 하기엔 너무도 드넓은 장면이다.
바다에서부터 시작된 고개를 넘자마자
햇빛이 알알이 굳어
잘 읽은 옥수수알처럼 발밑을 구른다
나는 자꾸 이곳보다 더 넓거나 깊은 곳을 상상한다
우뚝 솟은 산은 아무래도 바다의 거짓말 같다
나는 오래전 물 밖으로 튀어나온 산 구릉의 생각들을 되뇐다
공기가 뜨겁다
바람이 열기구처럼 튀어나와 부푼다
해가 통통하게 굳어 그 아래 긴 그늘로 속삭인다
보이는 건 모두 해의 뒷면
해의 기나긴 잊힌 말들
사람은 제 얼굴보다 큰 모자의 차양을 꽃잎으로 흔들며
입을 닫는다
노란 말풍선이 빛의 초점을 모아 허방에 실소를 터뜨린다
한 편의 시가 구겨져 다른 빛이 되는 여름낮
한국 시인 강정은 한국 사람이라서 이런 시를 쓴다. 여름이라서, 미시령이라서, 무엇보다 시인 강정이라서 이렇게 쓴다. 헛것을 말해왔고 헛것과 싸우고 헛것에 짓눌리고 헛것을 때려눕히고 헛것을 숭배하다 헛것을 헛것과 교배하다 기어이 스스로 헛것이 되어가고 있는, 귀신과 가장 닮아버린 시인이라서. 그럼으로써 또다르게 시인의 시들은 홀연하다. 이 홀연함들을 명명하면 가두는 것이 될까봐 명명도 하기가 싫다. 더 큰 홀연함과 더 놀라운 홀연함과 홀연함보다 더 이상한 출몰이 이 시인 앞에는 있을 테니까.
사람으로 시인은 시를 쓰지 않는다. 사람보다 좀더 다른 무엇이 되어서 시인을 시를 쓴다. 좀더 다른 그 무엇은 우리가 끔찍해하는 얼굴일 수도 있고 우리를 얕잡아보는 얼굴일 수도 있고 우리가 얕잡아보는 얼굴일 수도 있다. 어쩌면 우리가 선망하는 얼굴일 수도 있다. 어쨌거나 그 얼굴을 시인은 시를 쓰며 계속계속 좇는다. 그 얼굴을 지나칠 때까지. 지나쳐서 또다른 얼굴을 만날 때까지. 이게 시인이 시를 쓰는 이유이다.

-
나뭇잎이 나를 잎사귀라 생각할 때까지 일. 을지터그스 저/이안나 역 | 이룸
현대 몽골시단을 대표하는 시인인 일. 을지터그스(롭상로르짜 을지터그스)의 번역 시집. 현대적인 시풍 속에 몽골의 전통적인 서정성과 자연에 대한 관조적 색채를 깊이 담았고, 형식면으로 자유시이면서 압운을 맞추는 전통적인 시 형식을 취하고 있어 절제와 자유로움이 잘 조화된 시 세계를 보여준다. 오감을 열어 인간과 생명체, 자연물을 연민하고 아파하며 사랑하는 섬세한 감수성이 살랑이는 바람처럼 싱그럽게 독자들의 곁으로 다가갈 것이다.

-
귀신강정 저 | 문학동네
이 네 번째 시집을 추천하는 글에서 이준규 시인은 말했다. “그에게 귀신이 붙어 있다면, 그들은 모두 시인이다”라고. 다시 3년 만에 펴낸 강정의 다섯 번째 시집 『귀신』은 이렇게 찾아왔다. 마치 이제껏 밟아온 시인의 시적 행보가 예고했던 것처럼. 다시 한번, 이준규 시인의 말을 빌려, “그리하여 저주받은 자이고 슬픈 자이고 피를 토하는 자이고 우는 자이고 또 어쩔 수 없이 사랑하는 자”인 강정 시인의 시세계는 『귀신』에 이르러 더욱 강렬하게 독자들을 끌어당길 것이다.
[추천 기사]
- 인간을 인간으로 여기고 바라봐주는 일
- 지금 내 머리맡의 시집 한 권
- 나만 알고 싶은 시집
- 개가 되고 싶어요
나뭇잎이 나를 잎사귀라 생각할 때까지
출판사 | 이룸
귀신
출판사 | 문학동네

김소연
시인. 시집 『극에 달하다』, 『빛들의 피곤이 밤을 끌어당긴다』, 『눈물이라는 뼈』, 『수학자의 아침』, 『i에게』, 『촉진하는 밤』과 산문집 『마음사전』, 『시옷의 세계』, 『한 글자 사전』, 『나를 뺀 세상의 전부』, 『사랑에는 사랑이 없다』, 『그 좋았던 시간에』, 『어금니 깨물기』 『생활체육과 시』를 출간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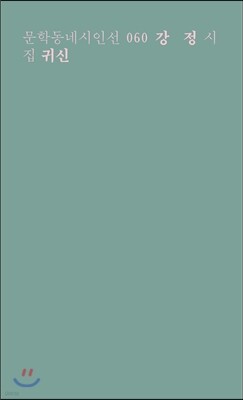

![[큐레이션] 눅눅한 계절을 산뜻하게, Chill한 시집들](https://image.yes24.com/images/chyes24/article/cover/2025/07/20250701-51c853bf.jpg)

![[큐레이션] 겨울에도 시집은 제철입니다](https://image.yes24.com/images/chyes24/article/cover/2025/01/20250107-8cedd5c0.jpg)
![[둘이서] 김사월X이훤 - 두 번째 편지](https://image.yes24.com/images/chyes24/article/cover/2025/01/20250103-4cab7b4b.jpg)




ehkys
2014.10.07
제가 매일 찾아 읽는 이곳에서 소연님을 만나게 되어 무지 기뻐요!
소연님 글 읽을 설레는 기대가 더해 이 가을 더 없이 좋습니다~^^
응원하겠습니당!
서유당
2014.10.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