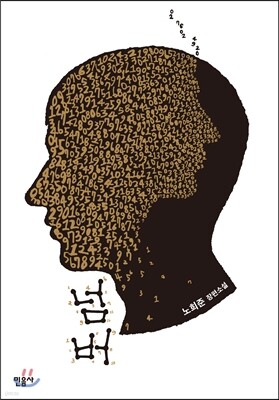 |
 |
2012년 11월 30일 홍대 씨클라우드에서는 노희준 작가의 『넘버』 발간 기념 북콘서트가 열렸다. 그곳으로 향하는 길에 비를 만났다. 우산 위로 떨어지는 비는 노크하듯 똑, 똑, 똑 소리를 냈다. 2012년을 마무리 하는 나의 마음은 안녕하냐고 묻는 것 같았다. 선뜻 대답할 수 없었다. 지나간 날을 아쉬워 해봐야 소용없을 테고, 남은 한 달은 어떻게든 잘 갈무리하고 싶었다.
씨클라우드에는 이미 많은 사람이 있었다. 어립잡아 보여도 90명은 넘었다. 앉을 자리를 찾기 어려웠으나 겨우 한 자리를 차지했다. 카페를 겸하는 공간은 ‘추리소설과 재즈를 사랑하는 사람들’이라는 공통분모를 가진 사람들의 숨으로 훈훈했다. 그 때문이었을까? 노희준 작가는 콘서트 중간 중간 “덥지 않으세요?” 라고 물었다. 보사노바 뮤지션 나희경 씨는 사회를 보는 것이 처음이라 했는데, 풋풋한 자태와 조곤조곤한 말씨가 매력적이었다.
노희준 작가와 개인적인 인연이 있어 더 귀를 기울여 들었다. 2006년 노희준 작가의 소설 창작 강의를 수강했다. 당시 나는 잘 알지도 못 하는 ‘불륜’을 소재로 소설을 썼다. 그가 물었다. “네가 불륜을 해봤어?” 당연히 할 말이 없었다. 이어지는 한마디. “이 소설 비린내 나.” 소설을 써 본 적이 없는 스물한 살의 나에게 그 말은 왜 그렇게 강렬하게 남았을까? 그날 수업으로 분명하게 깨달은 점이 있다. ‘잘 모르면 건드리지도 말 것.’
추리 소설 『넘버』 발간 될 때까지 가장 애쓴 사람을 꼽으라면 편집자가 아닐까 싶다. 작가의 들릴 듯 말 듯한 작은 숨까지도 담아내려고 불철주야 텍스트와 살았을 것이다. 사회자 나희경 씨는 이를 잘 알고 있는 것 같았다. 편집자가 소설 『넘버』에 관한 4가지 질문을 던졌다.

-

언제부터, 어떻게, 왜 연쇄 살인 소설에 꽂혔나.
-

사람을 왜 죽일까, ‘묻지마 범죄’가 왜 일어나는지 궁금했다. 의문을 품었을 무렵 서울 광장에서는 광우병 촛불시위가 일어났다. 그걸 보며 많은 생각을 했다. 어쩌면 경쟁 사회에서 우리는 도태되어 죽는 것이 아니라, 병이라든지 뭔가에 걸려 죽는 것이 아닐까, 하는 생각도 했다. 궁금증을 풀기 위해 책을 수십 권 읽었고, 읽은 책 중에 “최신 범죄는 최신 국가시스템을 모방한다.”는 문장이 기억에 남는다. 소설은 궁금증으로부터 시작했고, 살인 장면을 쓸 때 약간의 쾌감을 느꼈다.(농담)
-

살벌하게 죽이기 위해 참고한 책이 있다면?
-

살벌하게 죽이는 방법을 생각하고 검증했다.
-

그 책이 뭔가?
-

그건 알려줄 수 없다. 군대 시절을 특수부대에서 보냈다. 종종 시체를 부검했다. 신고식 때 시체를 부검하는 장면을 처음부터 끝까지 봤다. 이걸 끝까지 보지 못하면 군대 생활이 어려울 거라고 했지만 끝까지 본 사람은 나밖에 없다. 덕분에 군대 생활이 쉬웠다.(웃음) 이 때 친해진 교관으로부터 들은 이야기가 소설을 쓰는 데 많은 도움이 되었다. 책도 나왔고 한번 찾아뵙고 싶은데, 연락할 방도가 없다. 소설을 쓰면서 악몽도 많이 꿨다. 특히 『킬러리스트』를 쓸 때 심했다. 소설을 읽는 사람은 그냥 읽으면 되지만 쓰는 사람은 쓰려는 장면이 머릿속에 디테일하게 있어야 한다.
-

다시 읽어봐도 잘 썼다고 생각되는 장면을 꼽으면?
-

결말이 좋다. 이렇게 말해야 끝까지 읽는다.
-

노희준에게 기억이란?
-

선택적으로 기억한다. 어떤 분은 내 기억력이 좋은 걸로 아는데, 그렇지 않다. 어떤 상황과 이미지가 머릿속에 남아있을 뿐이다. 이것 때문에 여자 친구와도 싸웠다. 코엑스 주차장에서 차를 잃어버려 한 시간 반 동안 찾은 적도 있고.
씨클라우드 공연장, 은은한 불빛 아래 어깨와 어깨가 닿을 듯이 앉아 있는 사람들. 건반에 노희준 작가님의 손가락이 닿자, 비에 젖고 이야기에 젖은 피아노가 맑은 음색을 들려준다. 비와 관련된 노래가 흘러나왔다. 한 곡은 이적의 Rain, 두 번째 곡 역시 비와 관련된 팝송이었는데, 녹음된 파일을 들으면서 가사를 검색해 봤는데 제목을 알아내지 못했다. 노희준 작가의 노래 실력은 수준급이었다. 중학교 때 합창단으로 활동했다는 이야기를 증명하는 순간.
노희준 작가는 다재다능하다. 그가 직접 그렸다는 삽화 열 점을 감상하는 재미도 쏠쏠하다. 고등학교 때는 미술을 했는데, 이것 역시 증명하는 순간. 사실적이면서도 상징적인 그림을 보고 있으면 공포가 목을 조르는 것 같다.
재즈 가수 말로의 목소리는 ‘2012년 11월 30일 비오는 홍대에서의 밤’과 잘 어울린다. 팝송을 부르기 전에 가사의 내용을 연기했다. 마지막으로 관객과의 대화 시간이 이어졌다.

“사람은 뼛속까지 인간적이다. 상대방이 걱정할까봐 걱정하는 건 인간뿐이래요.”
이 두 마디에 노 작가가 하고 싶었던 말이 함축되어 있다. 뼛속까지 인간적인 사람들과 함께, 뼛속까지 인간적인 북콘서트를 떠올리며 홍대의 밤거리를 걸었다. 혹 누군가 내가 걱정할까 봐 걱정하고 있진 않을까? 행복한 착각을 하면서.


- 넘버 노희준 저 | 민음사
역사와 사회에 복수하는 연쇄살인범 이야기『킬러리스트』로 제2회 문예중앙소설상을 수상한 작가 노희준이 또 한 번 범죄 추리소설을 발표했다. 이야기의 속도는 빨라졌고 독자와의 거리는 가까워졌다. 이 기상천외하고도 정교한 전대미문의 추리소설 『넘버』가 민음사에서 출간되었다. 『넘버』는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살인자가 되어 버린 한 남자가 자신의 무죄를 증명하려 애쓰지만 그럴수록 사건에 더 깊이 연루되어 간다는 내용이다.

김미리(채사모 3기)
펜으로 당신의 마음을 움직이고
문장과 문장을 이어 소통하고 싶은 사람






![[추천핑] 어쩔 수 없이 밀려남에 고하다](https://image.yes24.com/images/chyes24/article/cover/2025/09/20250919-727bd620.jpg)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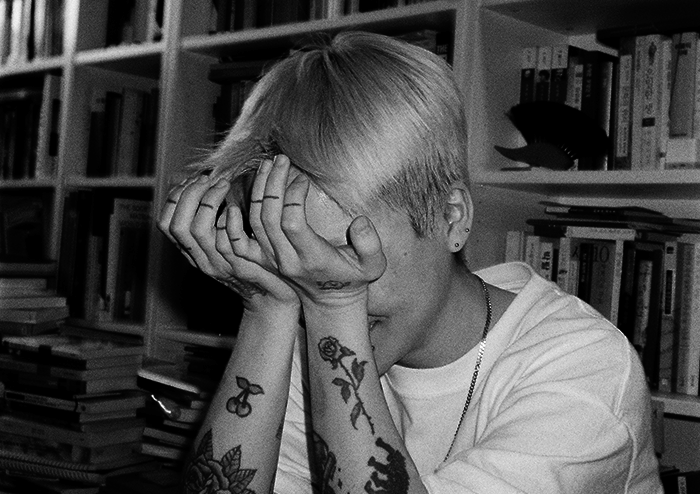










잠파노
2013.12.03
글 잘 보았습니다~
큰엄마
2013.12.03
좋은하루 보내세요^^
adel007
2013.11.30
더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