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욘세가 직접 음악 주도권을 쥐었다! 신보< 4 > 그녀의 내공에 감탄..- 비욘세(Beyonce), 백두산, 타루
2011.07.20
세계적인 스타로 발돋움한 비욘세가 4집 음반을 내놓았습니다. 직접 음악 주도권을 쥐고 만든 작품이라고 하는데요. 음악 내공이 대단합니다. 또한 한국 록 음악의 살아있는 전설 백두산도 새 앨범을 발표했습니다. 유현상의 카리스마 넘치는 보컬과 김도균의 신기에 가까운 기타 실력을 맘껏 확인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인디씬에서 싱어송라이터로 주목을 받고 있는 타루의 신보도 소개합니다.
비욘세(Beyonce)의 < 4 > (2011)
비욘세(Beyonce) 음악은 편곡의 완성품이다. 그의 노래들은 정형화 된 틀을 거부하지만 그것은 불편한 자갈밭이 아니라 매끈하게 닦은 고속도로다. 어떻게 여기서 이런 코드가 먹혀드는지, 어떻게 여기서 이런 악기가 등장하는지 예측할 수 없는 경우가 많다. “내 음악은 알앤비도 아니고, 전형적인 팝도 아니며 록도 아니다. 내가 좋아하는 것을 섞은 모든 것이다.”라는 비욘세의 말은 하나의 이미지로 구속되길 거부하는 당당한 태도를 드러낸다. 비욘세에게 그래미의 영광을 가져다 준 「Single ladies」나 「Check on it」, 「Naughty girl」 같은 곡들의 원단은 편하진 않지만 비욘세 사단의 말끔한 손질로 매끈하게 재단했다. 편곡의 승리다.
비욘세는 파열음을 낸 자신의 매니저이자 아버지 매튜 노울스(Matthew Knowles)와 결별하고 72곡 중에서 12곡을 선택해 네 번째 앨범에 수록했다. 아버지와의 분리선언은 자신이 모든 주도권을 장악했음을 암시하는 부분.
그런데 네 번째 앨범 < 4 >에서 생기는 증발했고 뻣뻣함이 지배한다. 음악의 재창조 작업인 편곡은 여전하지만 다른 가수들과는 다른 뭔가를 제시해야 한다는 올가미에서 비욘세는 여유롭지 못했다. 그는 경쟁이 경쟁력을 만든다는 것을 알고 있다. 트렌드를 이끄는 레이디 가가(Lady Ga Ga)나 리아나(Rihanna) 그리고 아델(Adele)과 더피(Duffy), 애이미 와인하우스(Amy Winehouse)로 대표되는 영국의 네오 소울 가수들에게 밀리지 않으려는 레이스는 오히려 차별성에 함몰된 음악으로 표현되어 앨범의 표피에서 부유한다.
후반부로 갈수록 지루했던 < Dangerously In Love >나 처음부터 끝까지 내달린 < B-Day > 그리고 그 양극단을 두 파트로 분리해 록의 묵직함을 받아들인 < I Am... Sasha Fierce >와 달리 < 4 >는 격정적인 곡들을 후반부에 배치해 각 앨범의 구성에 독립적인 변화를 부여했지만 유기적인 시너지 효과는 존재하지 않는다. 디스코그라피가 쌓이면서 자신의 정체성과 뿌리에 대한 진지함을 드러낸 비욘세는 이번 음반으로 가스펠의 영혼을 품은 2000년대 소울의 기득권을 노렸지만 일관성 없는 배치로 그 노력도 퇴색한다.
비욘세는 지난 5월 < 아메리칸 아이돌 > 시즌 10의 마지막 무대에서 첫 선을 보인 가스펠과 블루스 넘버 「1 1」을 오프너로 선정해 인정받고 싶은 마음을 감추지 않았다. ‘어려운 수학은 모르지만 하나 더하기 하나가 둘이라는 건 안다’는 파워발라드 「1 1」을 머리 곡으로 정한 비욘세는 자신에게도 ‘노래하고 춤추는 여신’이 아닌 ‘인간 냄새 나는 디바’가 존재하고 있음을 과시한다.
넵튠스(Neptunes)와 N.E.R.D.에서 신감각 음악을 창조한 채드 휴고(Chad Hugo)가 작곡에 참여한 「I care」에서 폭발하는 후련한 심벌즈는 차별성을 부여하며 1990년대 흑인 음악의 모든 것을 창출한 베이비페이스(Babyface)가 공동 작곡자로 이름을 올린「Best thing I never had」는 니요(Ne-Yo) 풍의 피아노 전주와 절정으로 치닫는 대곡 스타일의 확실한 기승전결 구조로 드넓은 푸르른 광야의 광활함을 끌어안는다. 두 곡 모두 미드 템포의 「Halo」와 「If I were a boy」의 연장선상에 있는 고품격 발라드 넘버들.
이펙터가 잔뜩 들어간 1980년대의 드럼 사운드와 1970년대의 알앤비 팝이 합일(合一)을 이룬 「Love on top」과 아트 힙합을 들려준 아웃캐스트(Outkast)의 멤버 안드레 3000(Andre 3000)이 서포터로 등장한「Party」는 스티비 원더(Stevie Wonder)의 후반기 명곡인 「For your love」를 떠올린다. 1980년대 흑인 보이 밴드 뉴 에디션(New Edition) 출신인 마이클 비빈스(Michael Bivins)와 보이즈 투 멘(Boyz ll Men)의 멤버인 네이던 모리스(Nathan Morris)와 와냐 모리스(Wanya Morris) 등이 함께 만든 「Countdown」과 「End of time」 그리고 첫 싱글로 커트된 「Run the world (Girls)」는 < 4 >의 힘차고 긍정적인 마무리를 대변한다.
비욘세의 < 4 >는 과유불급(過猶不及)이다. 이제는 빈칸을 채우기보다는 빈틈없는 공간을 비우는 여유를 담아야 한다. 비욘세가 자기 자신을 비울 때가 왔다.
글 / 소승근 (gicsucks@hanmail.net)
백두산 < Rush To The World> (2011)
지난 2009년 20여년 만에 복귀를 선언하며 내놓은 4집 < Return Of The King > 이후 2년 만에 다시 ‘왕의 귀환’이다. 과거 영광을 되새김질하며 후배들의 헌정을 받아도 충분하지만 이들은 세계시장 진출이라는 거창한 목표를 내걸었다.
1980년대 중후반 국내 록 밴드들 중 백두산의 존재는 남달랐다. 블루지한 정통 하드록의 시나위, 서정성 깊은 발라드로 대중화에 성공했던 부활에 견주어 백두산의 등장은 센세이션 그 자체였다. ‘NWOBHM(New Wave Of British Heavy Metal)의 선두주자’ 주다스 프리스트의 한국판이랄까.
샤우팅 창법이 특기인 유현상의 철성(鐵聲)과 김도균의 질주하는 기타 리프는 록 마니아들을 단숨에 사로잡았다. 야구 투수로 말하자면 희소성으로 가치를 인정받는 왼손잡이 투수, 사우스포(Southpaw)에 해당한다. 그것도 스카우터들이 지옥 끝까지 가서라도 계약을 해야 한다는 150km의 빠른 공을 던질 수 있는 그런 존재였다.
데뷔 시절인 1986년과 1987년이 바로 그들의 전성기였음을 떠올리면 많은 우여곡절을 지나 컴백한 백두산은 팬들의 추억을 환기시키는 대상이다. 마운드에 올라오는 것만으로도 박수를 받을만한 노장이지만 오히려 이들은 아직도 싱싱한 어깨를 자랑한다. 마치 불혹에 나이에도 강속구를 던진 메이저 리그의 투수 놀란 라이언처럼 말이다.
타이틀인 「Rush to the world」를 시작으로 여유로운 리프가 인상적인 「Rock away」, 2집의 수록곡을 재녹음한「Revolution」, 「Women driving highway」 같은 트랙들을 보면 김도균이 만들어내는 리프와 유현상의 목소리는 백두산이 자랑하는 주요 구질(Stuff)임을 알아챌 수 있다.
30초짜리 연주곡 느낌으로 시작하는「Sing it out」은 신보에서 뛰어난 곡 구성을 자랑한다. 9분이 넘는 긴 시간이 느껴지지 않게 템포 강약, 완급 조절을 한 경호진(베이스), 박찬(드럼) 리듬파트의 연주가 발군이다. 음악적 변신과 노장이라는 편견으로 백두산을 바라봤던 곱지 않은 시선들을 삼진으로 돌려세울 결정구다.
이렇듯 이들이 보여주는 사운드 질감은 초속(初速)부터 종속(終速)까지 전혀 떨어지지 않는 속도감을 자랑한다. 하지만 미디엄 템포의 발라드 곡인 「Shout it out」과「Just for you」는 밋밋하기 그지없다. 타자(대중)를 현혹시키기엔 변화구 각의 예리함이 완만하다. 차라리 끝까지 그들의 주무기로 승부를 걸었으면 어땠을까 하는 아쉬움이 진하게 남는다.
한국 헤비메탈의 원조라는 이유로 때늦은 이들의 복귀를 전관예우차원에서 접근할 필요는 없다. < Return Of The King > 는 폭발하는 아드레날린의 향연이며 질주 본능을 자극하는 스피드가 있다. 세계시장 진출을 꾀하며 만든 영어 앨범, 이들의 도전이 무모하게 들리지 않는다.
글 / 이건수(Buythewayman@hanmail.net)
타루(Taru) < 100 Percent Reality >(2011)
사람의 욕심은 차차 범위를 넓혀가기 마련이다. 조그만 것을 갖게 되면 더욱 큰 것을 원하게 되는 인간의 천성은 누구도 부정할 수 없는 본능이다. 그러다 보면 점차 자신의 능력에 대한 냉정한 평가를 잊은 채 결과물만을 쫓는 자신을 뒤늦게 발견하곤 한다. 당장은 그 결실이 좋게 보일지 몰라도 훗날 그 만족감은 대부분 미숙함과 부족함에 대한 부끄러움으로 변심해 버리는 것은 보통은 그런 연유에서다.
타루의 새 앨범은 딱 그런 인상이다. 일본 팝밴드 스윙잉 팝시클(Swining Popsicle)의 원조를 받아 브릴리언트 그린(The briliant Green)과 에브리 리틀 씽(Every Little Thing)의 중간점에 자신의 무늬를 새겨 넣은 데뷔작으로는 싱어송라이터로 거듭나고픈 자신의 꿈에 한참 모자랐다고 느꼈음에 틀림없다. 모든 트랙의 작사, 작곡뿐만 아니라 프로듀서의 자리에도 새겨져 있는 굳건한 이름 두자는 자신의 힘으로 대표작을 만들고자 하는 열정의 상징으로 분하고 있다.
문제는 그 의욕에서 비롯된다. 송라이팅 측면에서도, 조율 측면에서도 딱히 인상적인 면모를 감지 해내기가 어렵다. 다소 심심하게 풀어낸 가사와 나른함으로 일관하는 편곡이 < 100 Percent Reality >란 제목에 부합하는 공감대 형성을 방해하는 탓이다. 뮤지션십의 표출욕구가 앞서 나무만 보았을 뿐 숲을 보지 못한 듯한 모습이다.
트랙수를 늘리기 위해 타이틀 「여기서 끝내자」를 여러 버전으로 편곡해 4자리나 채워 넣은 것이 이러한 빈약함을 대변한다. 정석적이지만 호소력 있는 멜로디가 짙은과의 화음을 통해 대중적으로 탈바꿈하며 싱글로서의 매력을 유감없이 뿜어내지만, 교묘하게 프로모션 곡에만 본인 대신 에피톤 프로젝트가 지휘봉을 잡고 있다는 것이 아이러니다. 선율의 힘은 물론 본인으로부터 나온 것이지만, 그 외의 수록곡들이 효율적인 프로듀싱의 부재로 그만큼의 힘을 내지 못하고 있어 능력부족을 의심케 한다. 과욕이라는 인상은 이렇게 듣는 이들을 조금씩 물들여간다.
그렇기에 음악적 스펙트럼은 먼 곳 까지 뻗어나가지 못한다. 조력자로 오랜 공생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센티멘탈 시너리(Sentimental Scenery)를 맞아들였지만,「아이스크림가게, 팬시보이」에서 나타나는 어쿠스틱한 정서? 그동안 보여 왔던 낯익은 모습이다.「말해줘요」, 「내 사람」 등도 보컬에 특화시킨 곡을 만들고자 했던 의도가 보이지만, 너무 무난하게 색을 입힌 탓에 지나가는 사람의 시선을 붙들고 있기에는 버거운 인상이다. 가야할 곳의 이정표를 보지 못하고 지나쳐 헤매고 있는 것인 아닌지 의심스러울 정도다.
좀 커도 화려하고 보기 좋은 옷이 전작이었다면, 이번에 입은 옷은 핏은 좋을지언정 마감질이 시원찮고 디자인 또한 심심하게만 보인다. 음악의 부족함을 메우기 위해 리얼리티를 강조하려했지만, 그것이 대수가 될 수는 없다. 사람들은 그 현실감이라는 소재로 어떤 드라마를 만들어내느냐에 관심이 더 많기 때문이다. 그런 점에서 그의 두 번째 수는 지향점을 잘못 잡았다. 이처럼 재미가 없는 것이 현실이라면 차라리 난 공상을 택하겠다.
글 / 황선업(sunup.and.down16@gmail.com)
 제공: IZM
제공: IZM
(www.izm.co.kr/)
비욘세(Beyonce)의 < 4 > (2011)
|
비욘세(Beyonce) 음악은 편곡의 완성품이다. 그의 노래들은 정형화 된 틀을 거부하지만 그것은 불편한 자갈밭이 아니라 매끈하게 닦은 고속도로다. 어떻게 여기서 이런 코드가 먹혀드는지, 어떻게 여기서 이런 악기가 등장하는지 예측할 수 없는 경우가 많다. “내 음악은 알앤비도 아니고, 전형적인 팝도 아니며 록도 아니다. 내가 좋아하는 것을 섞은 모든 것이다.”라는 비욘세의 말은 하나의 이미지로 구속되길 거부하는 당당한 태도를 드러낸다. 비욘세에게 그래미의 영광을 가져다 준 「Single ladies」나 「Check on it」, 「Naughty girl」 같은 곡들의 원단은 편하진 않지만 비욘세 사단의 말끔한 손질로 매끈하게 재단했다. 편곡의 승리다.
비욘세는 파열음을 낸 자신의 매니저이자 아버지 매튜 노울스(Matthew Knowles)와 결별하고 72곡 중에서 12곡을 선택해 네 번째 앨범에 수록했다. 아버지와의 분리선언은 자신이 모든 주도권을 장악했음을 암시하는 부분.
그런데 네 번째 앨범 < 4 >에서 생기는 증발했고 뻣뻣함이 지배한다. 음악의 재창조 작업인 편곡은 여전하지만 다른 가수들과는 다른 뭔가를 제시해야 한다는 올가미에서 비욘세는 여유롭지 못했다. 그는 경쟁이 경쟁력을 만든다는 것을 알고 있다. 트렌드를 이끄는 레이디 가가(Lady Ga Ga)나 리아나(Rihanna) 그리고 아델(Adele)과 더피(Duffy), 애이미 와인하우스(Amy Winehouse)로 대표되는 영국의 네오 소울 가수들에게 밀리지 않으려는 레이스는 오히려 차별성에 함몰된 음악으로 표현되어 앨범의 표피에서 부유한다.
후반부로 갈수록 지루했던 < Dangerously In Love >나 처음부터 끝까지 내달린 < B-Day > 그리고 그 양극단을 두 파트로 분리해 록의 묵직함을 받아들인 < I Am... Sasha Fierce >와 달리 < 4 >는 격정적인 곡들을 후반부에 배치해 각 앨범의 구성에 독립적인 변화를 부여했지만 유기적인 시너지 효과는 존재하지 않는다. 디스코그라피가 쌓이면서 자신의 정체성과 뿌리에 대한 진지함을 드러낸 비욘세는 이번 음반으로 가스펠의 영혼을 품은 2000년대 소울의 기득권을 노렸지만 일관성 없는 배치로 그 노력도 퇴색한다.
비욘세는 지난 5월 < 아메리칸 아이돌 > 시즌 10의 마지막 무대에서 첫 선을 보인 가스펠과 블루스 넘버 「1 1」을 오프너로 선정해 인정받고 싶은 마음을 감추지 않았다. ‘어려운 수학은 모르지만 하나 더하기 하나가 둘이라는 건 안다’는 파워발라드 「1 1」을 머리 곡으로 정한 비욘세는 자신에게도 ‘노래하고 춤추는 여신’이 아닌 ‘인간 냄새 나는 디바’가 존재하고 있음을 과시한다.
넵튠스(Neptunes)와 N.E.R.D.에서 신감각 음악을 창조한 채드 휴고(Chad Hugo)가 작곡에 참여한 「I care」에서 폭발하는 후련한 심벌즈는 차별성을 부여하며 1990년대 흑인 음악의 모든 것을 창출한 베이비페이스(Babyface)가 공동 작곡자로 이름을 올린「Best thing I never had」는 니요(Ne-Yo) 풍의 피아노 전주와 절정으로 치닫는 대곡 스타일의 확실한 기승전결 구조로 드넓은 푸르른 광야의 광활함을 끌어안는다. 두 곡 모두 미드 템포의 「Halo」와 「If I were a boy」의 연장선상에 있는 고품격 발라드 넘버들.
이펙터가 잔뜩 들어간 1980년대의 드럼 사운드와 1970년대의 알앤비 팝이 합일(合一)을 이룬 「Love on top」과 아트 힙합을 들려준 아웃캐스트(Outkast)의 멤버 안드레 3000(Andre 3000)이 서포터로 등장한「Party」는 스티비 원더(Stevie Wonder)의 후반기 명곡인 「For your love」를 떠올린다. 1980년대 흑인 보이 밴드 뉴 에디션(New Edition) 출신인 마이클 비빈스(Michael Bivins)와 보이즈 투 멘(Boyz ll Men)의 멤버인 네이던 모리스(Nathan Morris)와 와냐 모리스(Wanya Morris) 등이 함께 만든 「Countdown」과 「End of time」 그리고 첫 싱글로 커트된 「Run the world (Girls)」는 < 4 >의 힘차고 긍정적인 마무리를 대변한다.
비욘세의 < 4 >는 과유불급(過猶不及)이다. 이제는 빈칸을 채우기보다는 빈틈없는 공간을 비우는 여유를 담아야 한다. 비욘세가 자기 자신을 비울 때가 왔다.
글 / 소승근 (gicsucks@hanmail.net)
백두산 < Rush To The World> (201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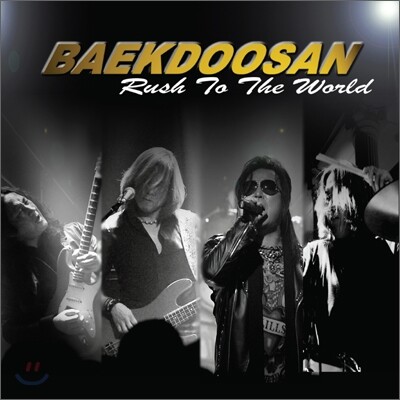 |
 |
1980년대 중후반 국내 록 밴드들 중 백두산의 존재는 남달랐다. 블루지한 정통 하드록의 시나위, 서정성 깊은 발라드로 대중화에 성공했던 부활에 견주어 백두산의 등장은 센세이션 그 자체였다. ‘NWOBHM(New Wave Of British Heavy Metal)의 선두주자’ 주다스 프리스트의 한국판이랄까.
샤우팅 창법이 특기인 유현상의 철성(鐵聲)과 김도균의 질주하는 기타 리프는 록 마니아들을 단숨에 사로잡았다. 야구 투수로 말하자면 희소성으로 가치를 인정받는 왼손잡이 투수, 사우스포(Southpaw)에 해당한다. 그것도 스카우터들이 지옥 끝까지 가서라도 계약을 해야 한다는 150km의 빠른 공을 던질 수 있는 그런 존재였다.
데뷔 시절인 1986년과 1987년이 바로 그들의 전성기였음을 떠올리면 많은 우여곡절을 지나 컴백한 백두산은 팬들의 추억을 환기시키는 대상이다. 마운드에 올라오는 것만으로도 박수를 받을만한 노장이지만 오히려 이들은 아직도 싱싱한 어깨를 자랑한다. 마치 불혹에 나이에도 강속구를 던진 메이저 리그의 투수 놀란 라이언처럼 말이다.
타이틀인 「Rush to the world」를 시작으로 여유로운 리프가 인상적인 「Rock away」, 2집의 수록곡을 재녹음한「Revolution」, 「Women driving highway」 같은 트랙들을 보면 김도균이 만들어내는 리프와 유현상의 목소리는 백두산이 자랑하는 주요 구질(Stuff)임을 알아챌 수 있다.
30초짜리 연주곡 느낌으로 시작하는「Sing it out」은 신보에서 뛰어난 곡 구성을 자랑한다. 9분이 넘는 긴 시간이 느껴지지 않게 템포 강약, 완급 조절을 한 경호진(베이스), 박찬(드럼) 리듬파트의 연주가 발군이다. 음악적 변신과 노장이라는 편견으로 백두산을 바라봤던 곱지 않은 시선들을 삼진으로 돌려세울 결정구다.
이렇듯 이들이 보여주는 사운드 질감은 초속(初速)부터 종속(終速)까지 전혀 떨어지지 않는 속도감을 자랑한다. 하지만 미디엄 템포의 발라드 곡인 「Shout it out」과「Just for you」는 밋밋하기 그지없다. 타자(대중)를 현혹시키기엔 변화구 각의 예리함이 완만하다. 차라리 끝까지 그들의 주무기로 승부를 걸었으면 어땠을까 하는 아쉬움이 진하게 남는다.
한국 헤비메탈의 원조라는 이유로 때늦은 이들의 복귀를 전관예우차원에서 접근할 필요는 없다. < Return Of The King > 는 폭발하는 아드레날린의 향연이며 질주 본능을 자극하는 스피드가 있다. 세계시장 진출을 꾀하며 만든 영어 앨범, 이들의 도전이 무모하게 들리지 않는다.
글 / 이건수(Buythewayman@hanmail.net)
타루(Taru) < 100 Percent Reality >(2011)
 |
 |
타루의 새 앨범은 딱 그런 인상이다. 일본 팝밴드 스윙잉 팝시클(Swining Popsicle)의 원조를 받아 브릴리언트 그린(The briliant Green)과 에브리 리틀 씽(Every Little Thing)의 중간점에 자신의 무늬를 새겨 넣은 데뷔작으로는 싱어송라이터로 거듭나고픈 자신의 꿈에 한참 모자랐다고 느꼈음에 틀림없다. 모든 트랙의 작사, 작곡뿐만 아니라 프로듀서의 자리에도 새겨져 있는 굳건한 이름 두자는 자신의 힘으로 대표작을 만들고자 하는 열정의 상징으로 분하고 있다.
문제는 그 의욕에서 비롯된다. 송라이팅 측면에서도, 조율 측면에서도 딱히 인상적인 면모를 감지 해내기가 어렵다. 다소 심심하게 풀어낸 가사와 나른함으로 일관하는 편곡이 < 100 Percent Reality >란 제목에 부합하는 공감대 형성을 방해하는 탓이다. 뮤지션십의 표출욕구가 앞서 나무만 보았을 뿐 숲을 보지 못한 듯한 모습이다.
트랙수를 늘리기 위해 타이틀 「여기서 끝내자」를 여러 버전으로 편곡해 4자리나 채워 넣은 것이 이러한 빈약함을 대변한다. 정석적이지만 호소력 있는 멜로디가 짙은과의 화음을 통해 대중적으로 탈바꿈하며 싱글로서의 매력을 유감없이 뿜어내지만, 교묘하게 프로모션 곡에만 본인 대신 에피톤 프로젝트가 지휘봉을 잡고 있다는 것이 아이러니다. 선율의 힘은 물론 본인으로부터 나온 것이지만, 그 외의 수록곡들이 효율적인 프로듀싱의 부재로 그만큼의 힘을 내지 못하고 있어 능력부족을 의심케 한다. 과욕이라는 인상은 이렇게 듣는 이들을 조금씩 물들여간다.
그렇기에 음악적 스펙트럼은 먼 곳 까지 뻗어나가지 못한다. 조력자로 오랜 공생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센티멘탈 시너리(Sentimental Scenery)를 맞아들였지만,「아이스크림가게, 팬시보이」에서 나타나는 어쿠스틱한 정서? 그동안 보여 왔던 낯익은 모습이다.「말해줘요」, 「내 사람」 등도 보컬에 특화시킨 곡을 만들고자 했던 의도가 보이지만, 너무 무난하게 색을 입힌 탓에 지나가는 사람의 시선을 붙들고 있기에는 버거운 인상이다. 가야할 곳의 이정표를 보지 못하고 지나쳐 헤매고 있는 것인 아닌지 의심스러울 정도다.
좀 커도 화려하고 보기 좋은 옷이 전작이었다면, 이번에 입은 옷은 핏은 좋을지언정 마감질이 시원찮고 디자인 또한 심심하게만 보인다. 음악의 부족함을 메우기 위해 리얼리티를 강조하려했지만, 그것이 대수가 될 수는 없다. 사람들은 그 현실감이라는 소재로 어떤 드라마를 만들어내느냐에 관심이 더 많기 때문이다. 그런 점에서 그의 두 번째 수는 지향점을 잘못 잡았다. 이처럼 재미가 없는 것이 현실이라면 차라리 난 공상을 택하겠다.
글 / 황선업(sunup.and.down16@gmail.com)
 제공: IZM
제공: IZM(www.izm.co.kr/)
2개의 댓글
추천 기사
추천 상품
필자

채널예스
채널예스는 예스24에서 운영하는 콘텐츠 플랫폼입니다. 책을 둘러싼 다양한 이야기를 만나 보세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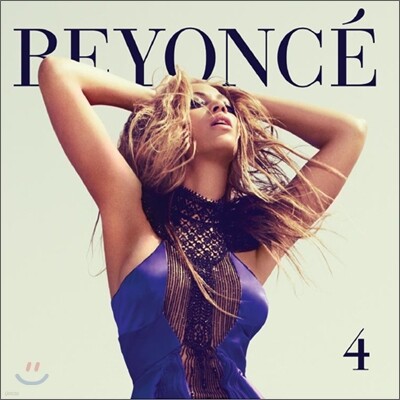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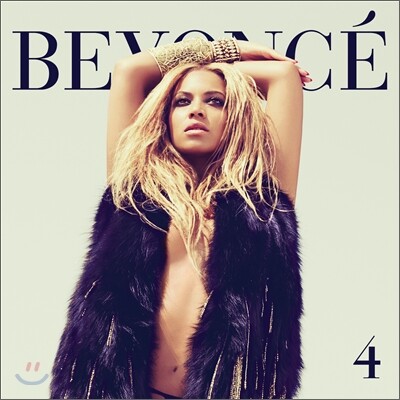
![[에디터의 장바구니] 『나의 오타쿠 삶』 『우리는 내륙으로 질주한다』 외](https://image.yes24.com/images/chyes24/article/cover/2025/08/20250826-a0d12f61.jpg)
![[비움을 시작합니다] 네가 변해야 모든 게 변한다 ①](https://image.yes24.com/images/chyes24/article/cover/2025/08/20250821-ebeed89d.jpg)

![[둘이서] 김사월X이훤 - 두 번째 편지](https://image.yes24.com/images/chyes24/article/cover/2025/01/20250103-4cab7b4b.jpg)
![[큐레이션] 노동에 지친 사람들을 위한 필독서](https://image.yes24.com/images/chyes24/article/cover/2024/12/20241205-f1224690.jpg)









앙ㅋ
2011.10.26
감 동훈
2011.07.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