격주 수요일, <채널예스>에서 대한민국 검찰청의 귀퉁이에서 이끼처럼 자생하던 18년차 검사 정명원이 지방 소도시에서 일하며 만난 세상 사람 이야기를 들려줍니다. |
 언스플래쉬
언스플래쉬
피고인은 피해자의 아들과 결혼하였다가 이혼한 사람이다.
공소장의 첫 문장은 이렇게 시작되고 있었다. 즉, 피고인은 피해자의 전 며느리이고 피해자는 피고인의 전 시어머니라는 이야기다. 죄명은 주거 침입. 여기까지만 보고도 경험이 많은 검사는 대략의 스토리를 유추해낼 수 있다. 피고인과 피해자의 아들 사이의 결혼 생활은 순탄치 않았을 것이다. 그 갈등의 한 부분에 아마도 시어머니가 관여한 부분이 있을 것이다. 이혼으로도 정리되지 않은 분노와 원망이 그들 사이에 있었을 것이고, 아마도 무엇인가를 되찾으려고 전 며느리는 전 시어머니의 집에 침입했을 것이다. 찾으려는 것이 돈이거나 재산이거나 자녀일 수 있겠고, 다만 못다 푼 분노를 풀어내기 위한 것일 수도 있겠다. 흔한 이야기들. 진부하나 실존하는 스토리들이다.
간단히 처리할 수 있겠다고 기록을 넘기는데, 전개가 조금 이상하다. '전 시댁의 마당에 침입한 피고인은 다만 마당 한쪽에서 눈물을 흘리며 서 있었다'고 경찰의 수사 보고서에 적혀 있었다. 행패를 부리거나 집을 난장판으로 만들거나 무언가를 빼앗아 오려는 시도도 하지 않고, 다만 울면서 서 있었다는 것은 어딘지 해석이 잘 안 되는 부분이었다. 답은 피고인이 된 며느리의 진술에 있었다. 어떤 경위로 이혼을 했지만 마음이 다 정리되지 않았고, 그전에 잘 해주시던 시부모를 만나 전처럼 따숩게 밥이라도 먹고 싶어 찾아 왔는데, 받아주지 않을 것 같아 그저 마당에서 울고 있었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이제 의문은 다른 방향으로 향한다. 아무리 아들과 이혼한 사이라 하더라도 그저 마당에 서서 울고 있는 전 며느리를 경찰에 신고까지 할 일인가. 더 없이 인정머리 없는 시어머니가 아닌가 의심하는 찰나, 다음 장에 편철된 시어머니의 진술서에 눈길이 머문다.
더는 연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각자 자기 인생을 향해 걸어가야 할 텐데, 며느리가 마음을 못 잡고 자꾸만 찾아옵니다. 몇 번을 타일러도 보고 화도 내 보면서 돌려보냈지만 자꾸 다시 옵니다. 이제는 법으로 작게나마 어떤 처벌이라도 하는 것이 그 아이도 제 한 몸 건사하고 살게 하는 길이 아닐까 싶습니다. |
'더는 연이 없는...'이라는 부분과 '제 한 몸 건사하고 사는 길' 부분에서 숨을 들이쉬게 된다. 생의 연들은 얼마나 다양하게 얽히고 설키는가, 그 난맥 속에서 각자 제 한 몸 건사하고 산다는 것은 얼마나 또 어려운 일인가. 한때 시어머니였던 여자가 이제는 끊어진 인연의 끈을 놓지 못하는 며느리였던 여자의 등을 두드린다. 네 길을 가라고, 각자의 삶에서 각자의 생을 건사하며 사는 일은 언제고 두렵고 서러운 일이겠지만, 그리 가는 것이 인생이라고 늙은 여자가 젊은 여자에게 말한다. 알겠다고 하고서는 자꾸만 돌아와 울고 서 있는 더는 연이 없는 며느리에게 법으로라도 신신이 당부해달라고 말한다. 뻔해 보이던 범죄 사실의 첫 문장은 이제 다르게 읽힌다.
공소 사실은 주로 관계를 설명하는 문장에서 시작되어 범죄 사실을 완성하는 문장으로 끝난다. '피고인과 피해자는 친구 사이다'로 시작해 '피고인은 이같이 피해자를 속여 3000만 원을 편취하였다'로 끝나기도 하고, '피고인과 피해자는 전혀 모르는 사이다'로 시작해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였다'로 끝나기도 한다. 어떤 공소장의 문장은 '피고인과 피해자는 부부였다'로 시작해 '피고인은 피해자를 살해하였다'로 마무리된다. 공소장의 세계에서 범죄 사실의 다정한 도입부가 끝까지 이어지는 경우는 없다. 관계에서 비롯되는 범죄들의 끝은 주로 관계의 파멸로 마무리된다. 그래서 첫 문장의 관계가 돈독할수록 범죄는 잔혹하고 애잔하다.
공소장은 형식이 정해져 있는 글쓰기다. 죄명에 따라, 범죄의 유형에 따라 시작하는 문장에서 끝나는 문장까지의 구성이 거의 정해져 있다. 하나의 공소장 속에는 반드시 들어가야 할 요소들과 그 순서도 정해져 있다. 그 외에 꾸미는 말, 연결하는 말, 감탄하는 말들은 생략된다. 최대한 건조하게 범죄의 '뼈대'만을 발라 조립해내는 것이 공소장이다.
그러나 원래 범죄는 뼈대로만 구성되어 있지 않다. '범죄 구성 요소'라는 뼈대가 있겠지만 거기에는 살이 있고, 지방도 있고, 피도 땀도 눈물도 있다. 그것들은 하나의 덩어리로 엉켜 누군가의 삶의 한 부분으로 놓여 있다. 모두 다 모양과 질감과 온도가 다르다. 그렇게 다 다른 것들 속에서 공통적으로 존재하는 범죄의 뼈대만을 추려 내는 것이 공소장의 1차 목표다. 있어야 할 뼈대를 정확히 찾아내 있을 곳에 놓으면 성공이다. 그러면 공소장을 쓰는 시험에서 감점을 당하지 않는다.
그러나 어떤 검사는 여기에서 만족하지 않는다. 한 단계 더 나아가고 싶어 한다. 뼈대로만 이루어진 문장의 세상에 어떻게 숨을 불어 넣을 수 있을까. 뼈대를 명확하게 하기 위해 발라지고 생략된 것들의 뉘앙스를 어떻게 전달할 수 있을까. 하여 뼈대로만 이루어진 문장으로도 뼈대가 아닌 사람의 이야기를 오롯이 담는 것이 가능할까. 이것은 마치 해체와 조합과 해체가 반복되는 현대 미술의 한 장르인 것도 같다. 어찌어찌 가장 가까운 곳까지는 갈 수 있을지언정, 그 자체에는 가닿을 수 없는 방법으로 진실을 추구하는 인간의 악취미 같은 것.
그런 의미에서 문장을 쓰는 일에 대해 애착을 가지고 있는 인간은 공소장을 쓰면서 자주 좌절한다. 그 빈약함에 숨이 막히고 그 너절함에 진저리가 난다. 이것은 지나치게 어려운 장르다. 어쩌면 잘 쓰고 싶다는 욕망을 투여하는 것 자체가 금지된 영역이 아닌가 싶다. 그런데, 아주 가끔 만난다. 정확히 있어야 할 위치에 있어야 할 각도로 구성된 뼈대의 세상, 그 사이로 바람이 불고 숨결이 일고 어떤 생의 한순간이 한 치의 오차도 없이 피사되었다고 판단되는 어떤 문장들. 비로소 만족한다. 숨 막히게 절묘한 균형점 위에서 잠시 맞이하는 해방의 순간. 그걸 잊지 못해서, 밥 먹듯 찍어내는 공문서일 뿐이지만, 어떤 사건에서는 공소장의 첫 문장을 오래 고른다. 숨을 멈추고 가장 정확한 문장이 떠올라주기를 기다린다.
이때 귓가에 울리는 부장님의 목소리.
"빨리 공소장 써서 넘기지 않고 뭐하고 있나?"
퍼뜩 정신을 차리고 보니 오래 첫 문장을 찾지 못한 채 남은 미제사건의 목록에는 빨갛게 경고등이 들어와 있다.
이런, '버려진 섬마다 꽃이 피었군.' (feat. 김훈, 『칼의 노래』 첫 문장)
못다 이룬 작가의 꿈을 꿀꺽 삼키며 검사는 익히 알고 있는 방식의 공소장을 향해 내달린다.
피고인과 피해자는 직장 동료 사이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평소 자신을 무시한다고 생각해 앙심을 품고...
추천기사
‘대한민국 No.1 문화웹진’ 예스24 채널예스
칼의 노래
출판사 | 문학동네
칼의 노래 - 한국문학전집 014
출판사 | 문학동네

정명원(대구지방검찰청 상주지청 검사(지청장))
『친애하는 나의 민원인』을 썼다. 대한민국 검찰청의 귀퉁이에서 이끼처럼 자생하던 18년차 검사가 지방 소도시에서 일하며 만난 세상 사람 이야기를 들려줄 예정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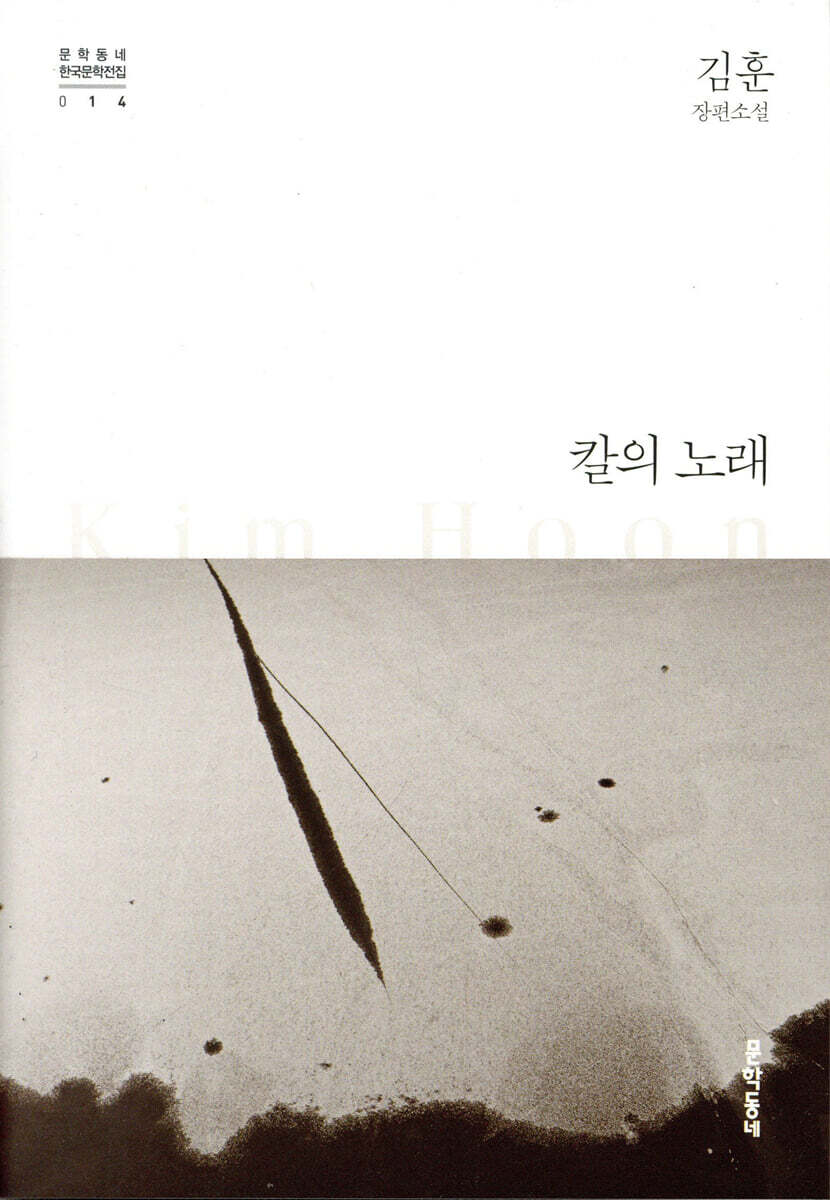
![[시골검사 J의 무탈한 나날] 욕 같지만 실은 욕이 아닌 이야기 | YES24 채널예스](https://image.yes24.com/images/chyes24/b/3/3/a/b33aabdb874bdc25d0192f30ec18bacd.jpg)
![[시골검사 J의 무탈한 나날] 나의 사무실 변천사 | YES24 채널예스](https://image.yes24.com/images/chyes24/2/0/e/9/20e96ce8104e94cadc25e8f0a6d717c3.jpg)
![[시골검사 J의 무탈한 나날] 시장에 간 양복쟁이들과 장화 | YES24 채널예스](https://image.yes24.com/images/chyes24/8/b/3/7/8b376809ba0b1e4542f284ee176600a8.jpg)

![[서점 직원의 선택] 서점 매니저가 추천하는 책](https://image.yes24.com/images/chyes24/article/cover/2025/11/20251128-db2868f9.jpg)


![[서점 직원의 월말정산] 7월의 즐길거리를 소개합니다](https://image.yes24.com/images/chyes24/article/cover/2025/07/20250731-ea87383d.jpg)
![[송섬별 칼럼] 범인은 현장에……](https://image.yes24.com/images/chyes24/article/cover/2025/07/20250702-9644fa19.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