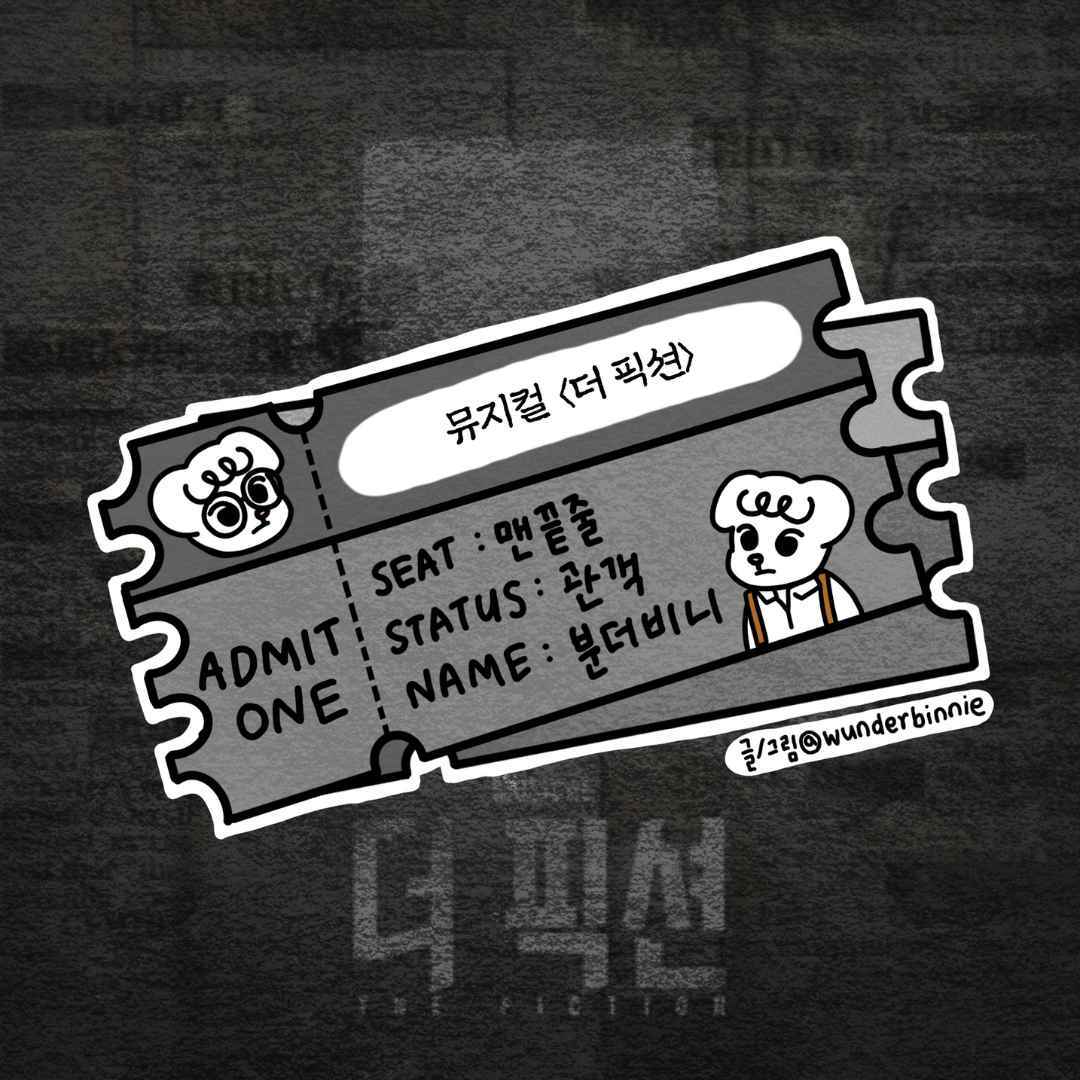영화 평론가 김소미가 극장에서 만난 일상의 기술을 소개합니다. 서울을 살아가는 30대로서 체감한 영화 속 삶의 지혜, 격주 금요일 연재됩니다. |
 영화 <애프터썬> 포스터
영화 <애프터썬> 포스터
11살 소피와 아버지 캘럼의 여름 휴가를 따라가는 영화 <애프터썬>에서 샬롯 웰스 감독은 동성 연인과 갓난 아이를 키우고 있는 31살 소피의 사정을 암시한다. 소피는 진정 사랑하는 사람을 만났고, 이제는 아이의 좋은 부모가 되고 싶다. 한 인간의 책임감이 나의 바깥으로 한없이 넓어져야만 하는 고통스러운 성숙의 순간에 그는 처해있다. 이런 생경한 버거움을 다독여 줄만한 위로나 용기는 도대체 어디에서 찾아야 할까. <애프터썬>이 주는 놀랍도록 끈덕진 여운은 그것이 바로 우리 자신 안에, 켜켜이 응축된 기억 속에 있다고 말하기 때문일 것이다. 지글거리는 캠코더 화소처럼 조용히 들끓기 시작한 소피의 기억은 정신적 위기 속에서 때로 주저 앉았던 아버지조차도 결국은 자신의 굳건한 출처임을 알아차린다.
완전한 어린이도 그렇다고 완전한 어른도 아닌 나이일 때, 나는 자주 어쩔 줄을 모르고 헤매왔다. '아홉살 인생', '열세살, 수아'가 제목에서 이미 가리키는 것처럼 그 나이의 생은 왜 힘이 드는가. 서서히 무언가 알아차리기 시작했지만 그것을 정확히 숙고할 만한 능력은 갖추지 못해 불안하기 때문이다. 폭발적으로 늘어나는 느낌의 집합체들이 느린 속도로 하나씩 분류되고 정의되기에, 우리는 극복할 수 없는 시차 속에 필연적으로 실수나 상실을 겪는다. <애프터썬>이 유독 관객의 정서적 장벽을 무너뜨리고 마음을 뒤흔드는 배경에는 이러한 보편의 공감대가 있을 것이다. 이른 나이에 부모가 되었다가 결별한 커플, 친구같은 아빠와 딸, 주로 미국인 관광객이 모여드는 튀르키예의 중저가 리조트와 그곳의 나른하면서도 다소 권태롭기까지한 분위기를 나의 것으로 추억하는 이는 많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희미한 사진적 이미지와 '공기'로 남아있는 유년 시절, 그 귀퉁이에서 문득 지치고 멍한 표정을 짓곤 했던 어른들의 얼굴에 관해 나는 기억한다. <애프터썬>은 이보다 더 특정적일 수는 없는 로컬의 풍경 속에 관객을 초대한 다음, 관객 각자가 자신의 시간이 잠들어있는 객실을 문을 두드리게 하는 영화다. 한번 그 문을 열고 나면 오래도록 빠져나가지 못한 채 복도에 서성이게 된다. 지금 <애프터썬>에 대한 열렬한 반응은 그 복도에 묶인 사람들로부터 공유되는 것이다.
 영화 <애프터썬> 스틸컷
영화 <애프터썬> 스틸컷
어른의 회고로부터 조직된 한 시절을 그린다는 점에서 <애프터썬>은 성숙의 아픔에 관한 이야기가 된다. 그 때는 놓칠 수 밖에 없었던 것을 지금은 이해하게 되었다고 말할 때 깃드는 것은 기쁨 보다는 쓸쓸한 감정이다. 샬롯 웰스 감독이 자신의 아버지를, 31살 소피(셀리아 롤슨-홀)가 11살의 자신(프랭키 코리오)과 아버지 캘럼(폴 메스칼)을 최선을 다해 이해하려는 시도는 카메라의 힘을 빌려 이루어진다. 이 영화의 프레임은 주관적 기억 바깥의 이미지를 포괄한다. 영화의 한 장면. 소피는 방 침대에서 하릴 없이 앉아있고, 캘럼은 화장실 변기에 앉아 팔을 감고 있던 붕대를 뜯어낸다. 캘럼은 목소리는 아무렇지 않은 듯 말하고 있지만 그의 형상은 가까스로 자신을 지탱하고 있는 사람처럼 위태롭다. 11살의 소피가 보지 못한 것을 31살의 소피가 보고 있다고 말할 수 있는 장면이다. 캘럼의 팔에 남은 상처가 대변하는 어떤 분투의 시간, 최소한 아이 앞에서는 그것을 숨기려는 책임감의 무게를 현재의 소피는 이제 알아차린다. 샬롯 웰스 감독은 촬영 장소를 찾기 위해 튀르키예의 여러 호텔을 찾아다닐 때 바로 이 장면을 위한 화각이 확보되는 공간을 찾는 데 시간을 쏟았다. 그다지 호화롭지 않은 호텔이면서 카메라가 벽을 사이 둔 두 부녀를 모두 담을 수 있을만한 넓은 객실을 찾기란 쉬운 일이 아니었다. 서로를 보고 있지 않은 소피와 캘럼이 한 화면에 나란히 담기는 어려움이 비단 화각의 문제만은 아닐 것이다. 그것은 카메라의 문제를 고민하기 이전에, 자기 서사를 재현하는 성숙한 관점에 대한 문제다.
31살 소피의 거대한 플래시백이라고도 말할 수 있는 <애프터썬>은 기억의 '재해석'을 우리 삶의 중요한 사안으로 끌어올린다. 훌륭한 많은 영화 내러티브(narrative)들은 결국 기억을 어떻게 재구성할 것인가의 문제를 저마다 독창적으로 풀이한 결과물이다. 어떤 영화는 기억의 작동 방식과 형상을 중심에 두고 탐구하면서 '인간의 기억이란 무엇인가?' 그 상징성을 묻는다. 근작 중에서는 코고나다 감독의 영화 <애프터 양>이 적절한 예다. 한편 어떤 영화는 예술의 재료로서 기억이란 가능한 구체적이고 개인적인 세공을 거쳐 재현되었을 때 비로소 보편의 의미가 있다고 믿는다. 영화 그 자체가 어떤 치열한 기억의 시도인 경우로, <애프터썬>이 바로 그렇다. 중요한 지점은 나이 든 소피가 지난날의 캠코더 영상을 돌아볼 때, 그의 시선이 더이상 자신만을 주체로 삼지 않는다는 점이다. 요컨대 이것이야말로 각도의 문제다. 기억의 카메라를 돌려, 어둠 속에 있던 대상 — 아버지를 비추는 것. 번쩍이는 스트로보 라이트가 동원된 영화의 클라이맥스 댄스 신은 치열하다 못해 노골적일 정도로 그 조우의 순간을 장면화했다. 과거와 현재 사이의 번쩍이는 접경 지대 속에서 <애프터썬>은 내 쪽으로 철저히 기울어져 있던 기억을 구부려 상대에 가 닿도록 한다. 그리고 우리 인식의 지평이 비로소 넓어지는 순간을 덤덤히 찬미한다.
나 자신이 어린이일 때 가끔 넋나간 어른의 표정을 대하는 일은 불안하고 두려웠다. 그리고 나 자신이 주변 어린이를 대하는 어른의 입장이 된 지금, 아무리 노력해도 때로는 무구한 어린 존재에게 내 피로를 들킬 수 밖에 없다는 사실에 항복한다. 그 괴리 속에서 나는 다시 과거의 많은 얼굴들을 애틋히 떠올린다. 관계의 좁은 틀을 탈피해 바라본 사랑하는 이의 진정한 초상에 관해 <애프터썬>은 하나의 완전한 원체험을 제시하는 영화다. 결코 좁힐 수 없는 시차를 있는 그대로 드러내면서도, 영화는 결정적 순간에 편집술을 통해 기어코 두 명의 어른이 하나가 되게 만든다. 처음에는 분투였다가 이내 춤추는 것 같고, 마침내 거세게 끌어안도록.
추천기사
‘대한민국 No.1 문화웹진’ 예스24 채널예스

김소미 <씨네21> 기자
보는 사람. 영화를 쓰고 말하는 기자. <씨네21>에서 매주 한 권의 잡지를 엮는 일에 가담 중이다. 한양대학교 연극영화학과에서 영화를 공부하고 독립 영화잡지 <아노>의 창간 에디터, CGV 아트하우스 큐레이터 등으로 일했다. 영화의 내면과 형식이 만나는 자리를 오래 서성거린다.






![[김소미의 혼자 영화관에 갔어] 흉터와 악수 - <유령> | YES24 채널예스](http://image.yes24.com/images/chyes24/1/b/5/b/1b5b60aae564a283d6c7293d07020cfb.jpg)
![[김소미의 혼자 영화관에 갔어] 헤어질 결심과 사랑 이야기 - <3000년의 기다림> | YES24 채널예스](http://image.yes24.com/images/chyes24/b/7/6/4/b7642bb7e3c18a8e974022a5c5b0d3c5.jpg)
![[김소미의 혼자 영화관에 갔어] 험난한 21세기 관객의 길 - <아바타: 물의 길> | YES24 채널예스](http://image.yes24.com/images/chyes24/d/3/2/1/d32169ae870dd8f229d2eec26f7edd73.jpg)

![[서점 직원의 선택] 예스24 사내 동호회 추천 책](https://image.yes24.com/images/chyes24/article/cover/2025/11/20251107-43d6abe9.jp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