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요나 소설가
한요나 소설가
무더위가 어느덧 지나가고 선선한 바람이 불어오는 가을의 문턱, 몽환적이면서도 환상적인 작품으로 한국 SF의 새로운 얼굴로 떠오른 한요나 작가를 만났다. 이유를 알 수 없는 이상 기후와 유전 공학으로 만들어진 10월의 아이들, 그리고 각자의 고민을 안고 찾아오는 사람들의 안식처 'NO-LITER'까지. 흔들리고 불안한 이들의 손을 따뜻하게 맞잡아 줄 『오보는 사과하지 않는다』의 세계 속으로 들어가 보자.
「작가의 말」에서 '시가 어느 날 문을 벌컥 열고 들어왔던 것과 달리, 소설은 가랑비에 옷이 젖듯 스며들어 왔다'고 하셨는데요. 작가님에게 시와 소설은 어떤 의미인지 각각 들어보고 싶어요.
말 그대로 시는 어느 날 갑자기 시작됐어요. 역시 비유로 설명할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요. 시는 언제 어떻게 친해졌는지 기억도 안 나는 학교 친구 같아요. 말하는 것도 자유롭고요. 그에 비해 소설은 사회에서 만난 친구 관계 같아요. 어떤 사람의 면면을 보고, 말을 고르고, 노력해서 친구가 된 케이스요. 그래서 앞으로도 조심하고 노력하고 믿음을 나눠야 할 대상, 그게 바로 소설인 것 같아요.
요즘 출판계를 살펴보면 한국 소설, 그중에서도 특히 SF 장르가 많은 사랑을 받고 있잖아요. 작가님이 생각하시는 SF 소설만의 매력이 있다면 무엇일까요?
SF 소설은 지금 여기가 아닌 공간에서 현재를 속속들이 이야기할 수 있다는 점이 좋습니다. 그래서 수없이 이야기된 사회적 이슈를 끌고 와도 진부하게 느껴지지 않고, 위험한 줄타기를 해도 상대적으로 위험도가 낮게 느껴져요. 하지만 무엇보다도 독자가 조금 더 멀리까지 갈 수 있도록 한다는 것이 SF 소설의 매력이라고 생각해요.
특히, 한국 SF는 늦게 부흥기를 맞이한 것에 비해 빠르게 다양성의 세계를 끌어들였어요. 한국 SF에서 인물의 다양성은 때때로 어떤 세계관보다도 더 넓은 것 같아요. 이야기가 끝난 뒤에도 '이 다음에는 인물들이 무엇을 할까? 어떤 삶을 살까?' 혹은 '이 인물이 다른 세계에 떨어지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를 자꾸 상상하게 되거든요. 앞으로 한국 SF가 더 먼 곳까지 갈 수 있을 거라고 믿어요.
'김도브', '김이고', '파와 엠' 그리고 '지지'까지 소설 속 등장인물의 이름이 독특하고 매력적인데요. 어떻게 이런 이름을 짓게 되셨는지 그 과정이 궁금해요.
이름은 그 사람의 출신 국가나 언어권을 떠오르게 해요. 심지어는 연령대를 추측할 수도 있어요. 예를 들어 한글 이름은 대체로 1980, 90년대생이라고 추측할 수 있습니다. 아름, 보라, 초롱, 한빛 같은 이름은 제 세대에 유행한 이름이거든요. 저는 성별, 나이, 출신 국가 등이 드러나는 이름을 쓰고 싶지 않았어요. 동시에 어느 나라 사람이 읽어도 쉽게 읽고 발음할 수 있는 이름을 선호하고요. 앞으로도 이런 이름들을 계속 찾을 것 같습니다.
'사람다움 같은 단어는 빠르게 사라졌으면서 어른스러움이라는 단어는 왜 사라지지 않는 걸까' 김도브가 스스로 던지는 질문이 인상 깊었어요. '사람다움'과 '어른스러움'의 차이는 어디에서 온다고 생각하시나요?
'어른스러움'은 경험의 차이라고 생각해요. 하지만 '사람다움'은 감각에서 와요. 경험에 상관없이 세계와 존재, 사람들을 감각, 감지할 수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어른스럽지 않다고 해서 사람답지 않은 게 아니듯이, 어른답다고 해서 사람다운 게 아니듯이 말이죠. 동시에 '어른스러움'이 좋은 걸까? 생각해요. 저는 어른에게, 때로는 아이들에게도 강요되는 '어른스러움'이 폭력적이라고 생각합니다. '너는 이제 이러이러한 걸 감당해야 하는 나이가 됐어' 누가 그 기준을 정의할 수 있을까요?
"지금 세대와 다음 세대 역할을 동시에 맡아야 할 세대가 있다고 생각해. 난 그 세대에 도착한 사람이고. 나는 도브도 그런 나이라고 생각해" 노원이 도브에게 건넨 말인데요. '그 세대에 도착한 사람'으로서 우리는 어떤 태도를 지녀야 하는지, 작가님의 생각이 궁금합니다.
노원이 말하는 '그 세대'는 제가 생각하는 '청년의 개념'이에요. 제가 서른이 되었을 때, 나는 이쪽에도 저쪽에도 완전히 속할 수 없는 세대가 되었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오히려 내가 두 세계를 이어 주는 다리 역할을 할 수 있지 않나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요즘 아이들의 언어를 윗세대에게 알려 주고 싶고, 이제 조금 알 것 같은 어른들의 생각을 요즘 언어로 바꿔서 말해 보고 싶다는 마음이에요. 그러니까 청년들이 지금을 '스펙트럼이 가장 넓을 때', 그리고 자신을 '어느 쪽에도 속하지 않아서 자유로운 때'라고 생각하면 좋겠어요.
'노리터'라는 하나의 세계를 만들어 내셨어요. 그 안에는 각자 고민을 안고 찾아온 사람들이 서로 끌어안고 온기를 나누잖아요. 작가님에게도 '노리터' 같은 공간이 있으신가요?
신림에 아주 멋진 바가 있는데요. 신청곡을 틀어 주는 바예요. 주로 록 음악이 나오고, 록을 좋아하는 손님들이 많이 갑니다. 제가 가면 꼭 '너바나'의 곡을 틀어주시는 사장님이 계시죠. 낯가림이 심한 제가 사람들에게 먼저 말을 걸기도 하는 공간입니다.
아직 펜데믹의 그늘에서 벗어나지 못해서일까요? 이상 기후와 불안한 일들이 계속해서 몰아닥치는 소설 속 세계가 그리 낯설지만은 않게 느껴졌어요. 불안한 마음으로 하루하루 살아가고 있을 독자분들께 한 말씀 부탁드려요.
이상한 기후는 앞으로 더 심해질 거예요. 인간이 만든 세계의 이상 현상이죠. 그러니까 앞으로는 인간 말고, 아니 인간을 포함한 다른 존재들과 지구에 대해 생각하며 살았으면 좋겠어요. 불안한 만큼 서로에게 다정했으면 좋겠고요. 서로가 아니면 안 된다는, 내가 아니면 안 된다는 생각으로요. 이어져 있기 때문에 일어나는 일들이잖아요. 이상 기후도, 팬데믹도. 극복하는 것도 이어져 있는 모양과 마음으로 해결해야 한다고 생각해요. 저는 소설을 통해 여러분에게 손을 내밀고 있죠. 우리가 각자의 방식으로 서로를 바라보고 잡아주길 바랍니다.
*한요나 시인, 소설가. 1989년 대구에서 태어났다. 동국대학교 대학원에서 문예창작학을 전공했다. 2018년 독립문예지 <베개>에 시를 발표하며 작품 활동을 시작했고, 시집 『연한 블루의 해변』이 있다. 제2회 넥서스 경장편 작가상 우수상을 수상했다. |
추천기사
‘대한민국 No.1 문화웹진’ 예스24 채널예스
오보는 사과하지 않는다
출판사 | &(앤드)
오보는 사과하지 않는다
출판사 | &(앤드)

출판사 제공
출판사에서 제공한 자료로 작성한 기사입니다. <채널예스>에만 보내주시는 자료를 토대로 합니다.












![[인터뷰] 조예은 “소외되거나 경계 밖에 있는 존재들에게 서사를 부여하는 게 이야기의 의무라고 생각해요.”](https://image.yes24.com/images/chyes24/article/cover/2025/08/20250805-6c7f6d08.jpg)

![[서점 직원의 선택] 만우절 추천 도서 - 거짓이 당신을 속일지라도](https://image.yes24.com/images/chyes24/article/cover/2025/04/20250401-8d5a7a7c.jpg)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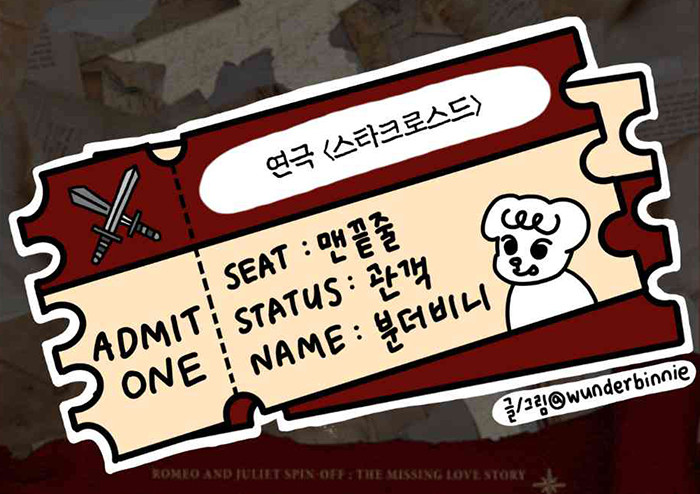
![[이벤트 종료] 새로워진 채널예스 기대평을 작성해주세요!](https://image.yes24.com/images/chyes24/article/cover/2024/11/20241126-81642dcc.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