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다은의 엉뚱한 장면 : 작품의 완성도 혹은 작품 전체에 대한 감상과는 무관하게 특정 장면이 엉뚱하게 말을 걸어올 때가 있다. 그 순간은 대개 영화의 큰 줄기에서 벗어난 지엽적인 장면이 관람자의 사적인 경험을 건드릴 때 일어나는 것 같다. 영화의 맥락에 구애받지 않은 채, 한 장면에서 시작된 단상을 자유롭게 뻗어가 보려고 한다. |

여기 한 가족이 있다. 한적한 차 가게를 운영하는 남편 제이크, 회사 일로 제이크보다 바쁜 아내 키라, 그들이 입양한 중국계 딸 미카, 그리고 아시아인 모습을 한 테크노 사피엔스 양. 양은 부부가 미카에게 중국 역사를 일러주기 위해 구입한 안드로이드로 미카는 양을 친오빠처럼 따른다. 다양한 인종과 문화, 인간과 비인간으로 조화를 이루던 가족은 그러나, 양이 갑자기 작동을 멈추면서 변화를 맞이한다. 제이크는 양을 수리하기 위해 동분서주하지만, 그가 회생 불가능하다는 사실만 거듭 확인하던 중, 양의 몸체에 기억장치가 숨겨져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된다. 부부는 그 장치에 저장된 짧은 순간들을 재생해 보며 양과 함께 한 과거만이 아니라 자신들이 모르던 양의 지난 세월 또한 마주한다.
프롤로그에 등장하는 격렬한 댄스를 끝으로 당혹스럽게도 영화 초반 이미 수명을 다한 안드로이드 양. 그는 어떤 존재인가. 인간을 돕기 위해 생산된 테크노 사피엔스의 기능이 소멸한 후에야 이 물음이 고개를 든다. 미카에게 그는 돌봄 노동을 하는 안드로이드이기 전에 같은 아시아계 정체성으로 연결된 존재다. 서구 사회에서 아시아인으로 산다는 건 무엇인가. 둘은 이 물음을 절실하게 공유한다. 미카는 부모와의 인종적 차이로 친구들에게 놀림을 받자, 그 사실을 양에게만 털어놓고 조언을 구한다. 제이크는 뒤늦게 양의 친구 복제인간을 만나 양이 인간이 되고 싶다고 말한 적은 한 번도 없지만, ‘아시아인이 된다는 것’에 대한 고심을 늘 마음에 품고 있었다고 듣는다.
제이크와 키라는 해본 적 없고 할 수도 없을 이 자문으로 미카와 양은 내밀하게 아시아인으로서의 감정을 교환한다. 인종적 동질감이 인간과 비인간의 차이를 무화하며 친연성을 높인다. 하지만 양은 그 자신의 말처럼 프로그래밍 된 대로 말하고 행동하는 기계가 아닌가. 그는 제이크가 차 한 잔에 세상이 담겨 있다며 그 풍요로운 느낌을 예찬하는 대목에서 말한다. “제게도 차가 지식이 아니면 좋겠어요.” 그는 “장소와 시간에 대해 진짜 기억”을 갖고 싶다고 고백한다.

그렇다면 제이크와 키라가 양의 기억장치에 접근할 때마다 마치 플래시 백처럼 되살아나는 과거의 파편들은 누구의 것이라고 해야 할까. 그것은 진짜 기억이 아닌가. 양의 시선이 자동적으로 포착한 순간들은 기억이 아닌 기록, 정보라고 불러야 할까. 거기에는 감정이 부재한다고 말해야 할까. 기록을 기억으로 만들어주는 건 무엇일까. 양의 메모리 장치를 다시 열어 지난 시간의 단면을 ‘기억’으로 불러온 주체는 살아있는 인간이라고 해야 할까. 그것은 양의 기억이 아닌 양에 대한 기억이라고 말해야 할까. 제이크가 무한한 우주를 유영하다 어느 행성에 접촉하듯 양의 기억장치에 접속하는 신비로운 장면처럼, <애프터 양>에서 기억이란 누군가의 신체에 갇히지 않은 채, 시간을 초월해 세계의 심연에 잠재되어 깨어나길 기다리는 이미지일까, 개념일까.
영화는 양이 놓인 모호한 지대와 그가 불러일으킨 물음에 명징한 답을 제시하지 않는다. 다만, 주관적인 인상에 근거해 말하자면, <애프터 양>은 도드라진 육체적 특질에서 시작하지만, 점차 그 육체성을 흐리고 지우는 의외의 과정을 거쳐 앞의 질문들을 남기는 것 같다. 도입부에 새겨진 인종적 차이, 인간과 비인간의 차이는 서사를 밀고 가는 동력으로 작용하지 않는다. 차이를 부각해서 서사에 극성을 불어넣는 대신, 영화는 한 존재가, 하나의 차이가 사라진 구멍만을 내내 맴돌며 들여다본다. 다소 직접적이고 단순한 대사의 결(“끝은 시작이라는 말이 있어요”, “무가 없으면 유도 없어요”), 톤의 변화가 거의 없이 표현을 절제하는 연기, 어느 이상 좁혀지지 않는 인물들 사이의 거리, 좀체 앞으로 나아가지 않는 듯한 시간은 (영화의 의도와 무관하게) ‘인간적인’ 감정이나 의미가 들어설 여지를 차단하며, 이 시공간을 깊은 우울감에 잠기게 한다.
그래서일까. 영화를 보고 나면, 제이크, 키라, 미카도 양과 크게 다름없는 안드로이드 같다. 아니, 존재를 구분 짓는 경계들이 무의미하게 느껴진다. 기록, 혹은 기억의 조각들은 여기저기 아련하게 부유하는데, 정작 누군가의 구체적인 육체성을 경험하거나 대면하지는 못한 것 같은 인상. <애프터 양>의 쓸쓸함과 공허함은 이에 기인할 것이다.
추천기사
‘대한민국 No.1 문화웹진’ 예스24 채널예스

남다은(영화평론가, 매거진 필로 편집장)
채널예스는 예스24에서 운영하는 콘텐츠 플랫폼입니다. 책을 둘러싼 다양한 이야기를 만나 보세요.






![[남다은의 엉뚱한 장면] 다시 영화를 찍을 수 있을까 - <오마주> | YES24 채널예스](http://image.yes24.com/images/chyes24/0/1/f/7/01f730336e83d8ecb3075d957520af50.jpg)
![[남다은의 엉뚱한 장면] 오래된 아파트 단지의 나무들 - <봉명주공> | YES24 채널예스](http://image.yes24.com/images/chyes24/8/e/f/6/8ef6132c254232cfd9aec72a01b596da.jpg)
![[남다은의 엉뚱한 장면] “난 길을 잃었어요” - <스펜서> | YES24 채널예스](http://image.yes24.com/images/chyes24/3/5/8/e/358e116fcc234018c69b2999fa6b0fd7.jpg)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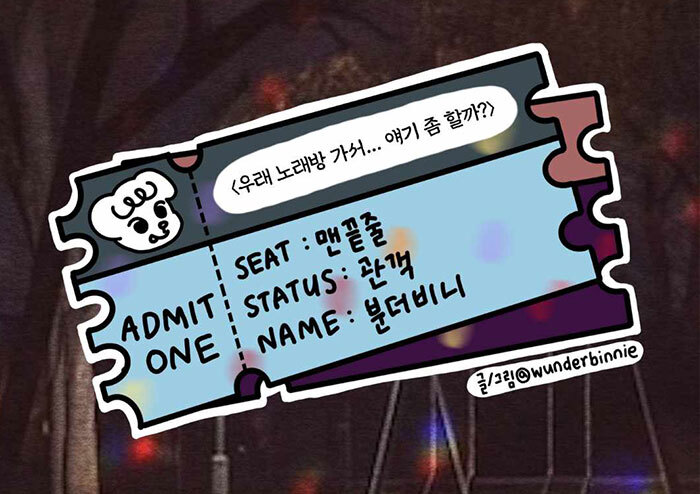
![[이벤트 종료] 새로워진 채널예스 기대평을 작성해주세요!](https://image.yes24.com/images/chyes24/article/cover/2024/11/20241126-81642dcc.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