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민용 앵커
한민용 앵커
한민용 JTBC 앵커가 직접 취재하고 보도한 <한민용의 오픈마이크>의 취재 일기를 담은 『내일은 조금 달라지겠습니다』가 출간됐다. 우리 곁에 있지만 우리가 몰랐던 이웃의 아픔, 그리고 조용히 그들을 돕고 있던 또 다른 이웃에 관한 이야기다. 하루에 7번 식당 출입을 거절당한 시각장애인과 안내견, 급식카드를 사용할 식당이 없어 편의점에서 끼니를 때우는 아이들….. 한민용 앵커는 이들에게 망설임 없이 손 내민 이웃들을 조명하는 한편, 타인의 선의에만 기대지 않을 수 있도록 정책적인 대안까지 제시하며 작지만 분명한 변화를 이끌어낸다. 내일은 조금 더 달라지리라는 믿음으로, 희망의 기록은 계속된다.
책의 출발점이 된 <한민용의 오픈마이크> 코너에 대해 간단히 설명해주세요.
앵커가 직접 아이템을 선정하고 취재해 보도하는, 앵커 고유의 시선을 담은 ‘앵커코너’입니다. 이 코너를 통해 결식아동, 장애인 안내견, 보호종료아동 등 제가 평소 쓰고 싶던 기사들을 보도했어요. 대부분은 뉴스의 주인공으로 여겨지지 않던 사람들의 이야기였습니다. 속된 말로 ‘잘 팔리는 기사’의 대척점에 있는 기사들이라고 할 수 있지만(웃음) 제가 기자 생활을 하며 세상에 내놓은 것들 중 가장 귀하다고 여기는 이야기들이에요.
메인 앵커가 스튜디오를 벗어나 현장을 다닌다는 게 많은 분들께 신선하게 다가간 듯해요. 어떻게 현장을 오가는 생활을 하게 되셨어요?
해외에서는 앵커가 직접 재난 현장 등에 내려가 마이크를 잡는 경우가 많죠. 그게 꼭 정답이라고는 생각하지 않아요. 언론 환경도 많이 다르니까요. 다만, 언론인이라면 현장과 너무 멀어지면 안 된다는 생각을 갖고 있어요. 현장과 멀어지면 감수성이 떨어지거든요. 예를 들어 ‘누군가 죽었다’, 굉장히 큰일이잖아요. 그런데 매일매일 누군가는 죽고, 그런 기사를 매일매일 읽다 보면, 어느 순간 누군가 죽었다는 소식에도 ‘그렇구나’ 하게 되기 쉬운 것 같아요. 하지만 그 현장을 본다면, 유족의 흐느낌을 듣는다면, ‘그렇구나’ 할 수 없어요. 누군가의 고통을 ‘구체적’으로 아는 것이 중요한 직업이라고 생각해요.

책에 우리 주변의 여러 이웃들의 목소리를 담았습니다. 그중 특별히 오래 남는 이야기가 있나요?
책에 담은 이야기들은 하나같이 ‘특별히 오래 남은 이야기’들이지만, 굳이 하나를 꼽는다면 ‘시각장애인 안내견과의 하루’를 꼽겠습니다. 요즘 하루도 빠짐없이 뉴스에 ‘장애인 이동권’ 문제가 나오는데요. 그게 뭔지, 왜 중요한지 안 와닿는다는 분들이 적지 않더라고요. 장애를 갖고 있으면, 어딘가를 가는 것에도 ‘용기’가 필요해요. 제가 만난 시각장애인 혜경 씨 역시 마찬가지였어요. 혜경 씨는 자기 앞에 놓인 문턱을 낮춰보고자, 더 멀리, 더 자유로이 걸어보고자, 안내견과 함께 걷기 시작했어요.
안내견은 혜경 씨가 계단을 찾아달라고 하면 계단을 찾아주고, 건널목을 찾아달라고 하면 건널목을 찾아줍니다. 이렇게 혜경 씨의 ‘눈’이 돼주고 있지만 여전히 ‘개는 안 된다’며 여기저기서 출입을 거부당하고 있어요. 같이 점심을 먹으려다 7번을 거절당했어요. 전부 신고해서 과태료를 물게 하고 싶다는 생각이 들 정도로 분하더라고요. 하지만 혜경 씨 생각은 달랐습니다. ‘잘 몰라서 그렇지, 알면 덜 할 거다’라는 마음이더군요. 안내견 출입 거부 문제는 장애인 이동권의 작은 부분일 거예요. 하지만 이 이야기가 장애인 이동권에 대해 한 번쯤 깊이 생각해보는 계기가 될 수 있을 것 같아 꼭 읽어주시면 좋겠어요.
어려운 상황에 놓인 분들을 카메라 앞에 세우다 보니 조심스러운 부분이 많았을 것 같아요.
앞서 이야기한 혜경 씨만 해도, 문전박대 당하는 모습을 전국민에게 보여주고 싶지 않았을 거예요. 의도대로만 기사가 읽히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밥 먹을 땐 지팡이 들고 다니면 되잖아. 이기적이네’ 같은 부정적인 반응이 있을 수도 있고요(실제 있었어요). 그런 모든 걱정을 무릅쓰고 카메라 앞에 선 이유가 다들 분명 있으셨을 거예요. 그분들이 상처받을 만한 일들을 제가 모두 차단해줄 순 없겠지만, 기사가 나간 뒤 ‘그래도 용기를 낼 가치가 있었다’고 느끼시길 바랐어요.
취재하며 앵커님이 보거나 만난 작지만 분명한 변화들은 어떤 게 있을까요?
너무 많은데 하나만 소개하자면, ‘우리 동네 아이들은 우리 동네 어른들이 책임진다!’는 구호를 외치며, 아이라면 누구나 따뜻한 밥 한 끼 먹을 수 있는 푸드트럭을 운영하는 분들이 있었어요. 보도가 나가고, 이 작은 푸드트럭에 1천 명이 넘는 분들이 기부금을 보내왔어요. 송금할 때 남길 수 있는 메모를 통해 ‘적어서 죄송’, ‘다음엔 더 많이’ 편지들도 보내주셨는데, 내가 모르는 세상이 여기 있구나, 싶었어요.
<오픈마이크>가 ‘좋은 저널리즘’의 훌륭한 사례라고 말하는 시청자들이 많았어요. 앵커님이 생각하시는 ‘좋은 저널리즘’이 궁금합니다.
‘좋은 저널리즘’은 시대의 흐름에 따라 조금씩 다른 얼굴을 하고 있지 않을까 싶어요. 물론 진실을 추구하고, 권력을 감시하고,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는, 큰 틀에서의 모습은 바뀌지 않을 것이고, 바뀌어서도 안 된다고 생각하지만요. <오픈마이크>를 기획할 무렵, 제가 생각한 좋은 저널리즘은 ‘통합’이었어요. 알고리즘 때문에, 점점 더 내가 듣고 싶은 이야기만 듣게 되고, 내가 관심 있는 분야만 계속 보게 됐잖아요. 저마다의 ‘필터 버블’을 깨주는 것이 지금 언론이 해야 할 일이라고 생각했어요. 당신의 세계에서 한 발자국 떨어진 곳에서는 이런 삶이 이어지고 있다고, 보여주고 들려주는 거죠.
작가로서 새로운 출발을 하시게 되었어요. 다음 책은 어떤 이야기를 쓰고 싶으신가요?
이 책이 처음이자 마지막이지 않을까요? (웃음) 주변 사람들이 ‘이 책은 어떤 책이니’라고 물으면 ‘잘 안 팔릴 것 같은 책’이라고 답해요. 아무래도 제가 책을 낸다고 하니, 방송가 이야기랄지, 스튜디오 비하인드랄지, 앵커석에 앉은 사람만 할 수 있는 이야기일 거라고 기대하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하지만 이 책은 제가 썼던 기사와 마찬가지로, 잘 팔릴 것 같진 않지만, 그렇기 때문에 ‘널리 널리 읽히길’ 간절히 바라는 책이에요. 언젠가 또 책을 쓰게 된다면 그때도 잘 안 팔릴 것 같은 책을 쓰고 싶어요. 이렇게 말하면 출간 제안이 안 오겠네요.(웃음)
*한민용 당신의 이야기가 궁금한 사람. JTBC 기자 겸 앵커. 펜으로 세상을 바꿀 수 있다고 믿어 기자가 됐다. 2013년 기자 생활을 시작해 어느덧 10년 차다. 그중 절반은 사회부 기자로, 대한민국에서 일어난 온갖 사건·사고를 취재하며 보냈다. ‘그래도 살 만한 세상이다’라는 말을 좋아한다. 2018년부터는 <뉴스룸> 주말 앵커를 맡아 평일에는 현장을, 주말에는 스튜디오를 오가는 생활을 계속하고 있다. 여전히 낭만적 저널리즘을 꿈꾼다. |
추천기사
‘대한민국 No.1 문화웹진’ 예스24 채널예스
내일은 조금 달라지겠습니다
출판사 | 위즈덤하우스

출판사 제공
출판사에서 제공한 자료로 작성한 기사입니다. <채널예스>에만 보내주시는 자료를 토대로 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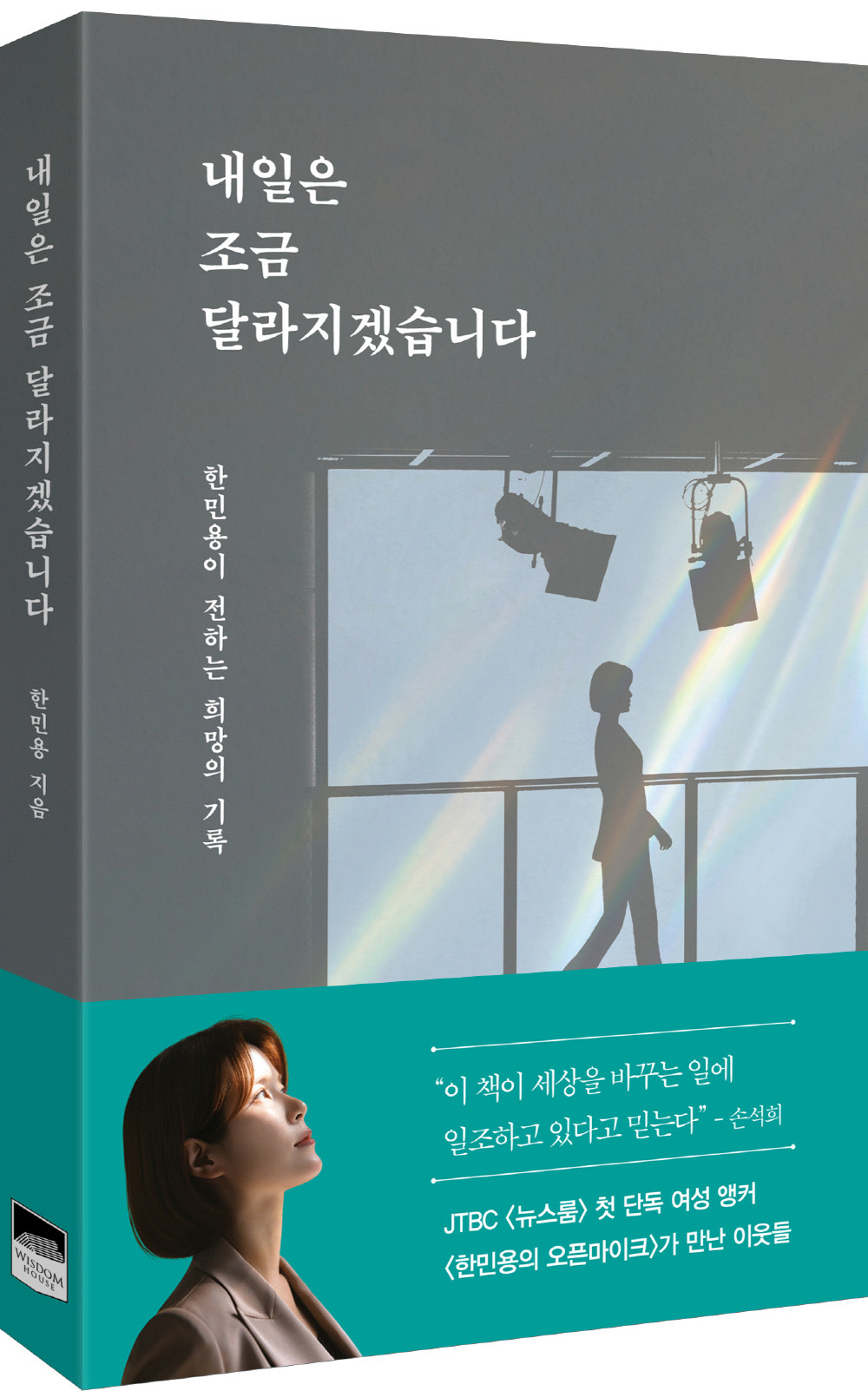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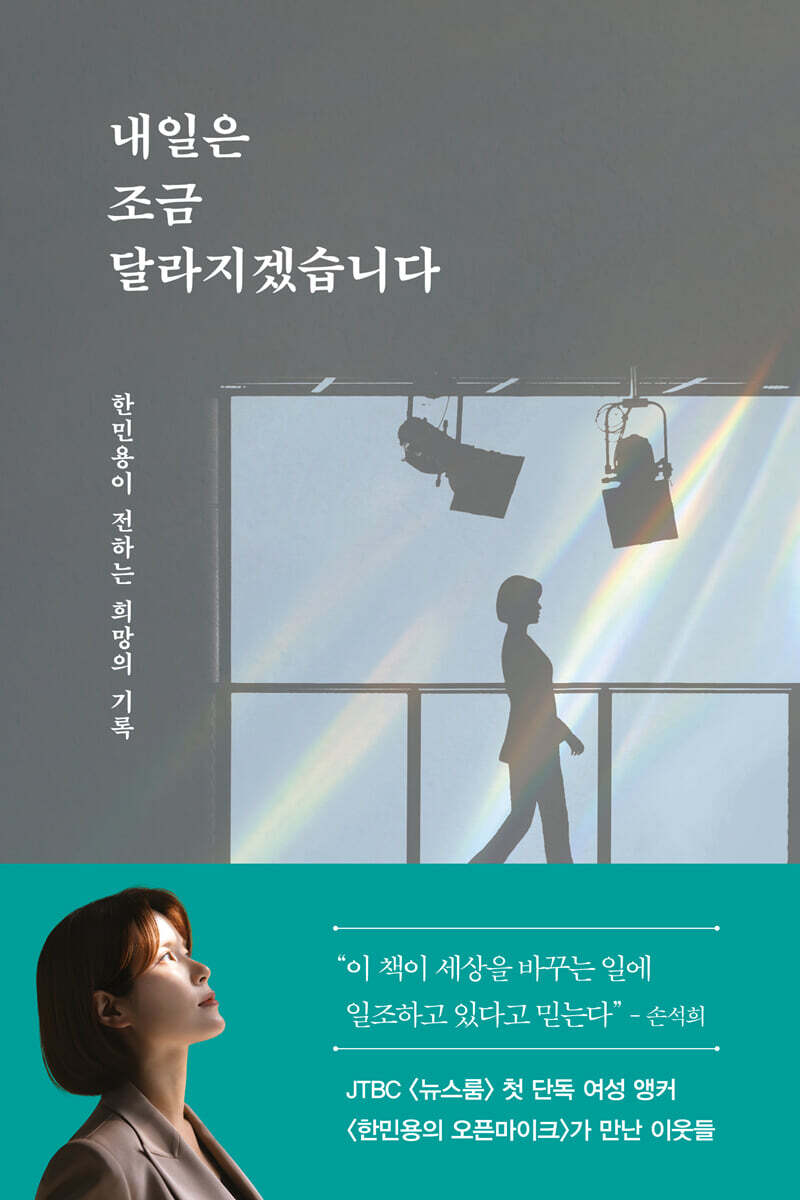






![[더뮤지컬] 불평등∙소외∙소멸…두산인문극장이 '지역'에 던지는 질문](https://image.yes24.com/images/chyes24/article/cover/2025/03/20250326-b592586c.jpg)

![[이벤트 종료] 새로워진 채널예스 기대평을 작성해주세요!](https://image.yes24.com/images/chyes24/article/cover/2024/11/20241126-81642dcc.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