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열린책들이 창립 35주년을 맞이해 내놓은 스무 권의 세계문학 중단편 세트의 표지에는 한글 제목이 없다. 모국어가 품은 작가의 이름만이 크고 단단하게 책의 상단과 하단에 나뉘어 위치한다. 가운데에는 제비, 오렌지, 열쇠, 추락하는 사람, 초승달, 날카로운 햇빛, 무엇인가 지나간 흔적 등등이 가위로 오린 색종이처럼 불균질한 형태로 놓여 있다. 붉은 점과 짝을 이룬 새빨간 입술은 곧 입을 열어 뭐라고 말할 것만 같다. 모든 책은 한손으로 가뿐하게 쥘 수 있다. 가볍다.
2018년부터 열린책들 디자인팀을 이끌어온 함지은이 회사의 35주년 기념작을 디자인하면서 주력한 감각은 ‘소장의 기쁨’이다.
“세계문학 시리즈는 열린책들의 정신을 함축하고 있다고 생각해요. 273권에 이르는 동안 한 번도 쉬지 않았어요. 그 마음과 함께 달라진 시대와 독자의 요구를 충분히 반영하고 싶었어요. 책이 유일한 정보 통로였던 시대도, 문학이 불가침의 영역이던 시대도 지났잖아요. 책이 인스타그래머블하지 않을 이유는 없다고 생각해요.”
동시에 예술성을 저버릴 이유도 없다. 책의 중앙에서 주제와 뉘앙스를 명료하게 드러내는 이미지는 한 장 한 장 손으로 오려 붙이는 페이퍼 컷아웃 기법의 산물이다. 대학에서 회화를 전공한 함지은은 디지털 드로잉의 편리함 대신 수작업의 불완전함을 선택했다.
“손으로 한 작업에서만 느껴지는 밀도나 디테일, 그런 요소들이 부딪치고 합쳐지면서 생기는 오라가 분명히 있다고 생각해요.”
길고 좁은 판형 또한 시대의 반영이다.
“책 한 권을 주머니에 넣고 카페에서 보내는 오후를 상상했어요.”
그런 상상들은 35주년 기념 박스 세트를 산뜻한 쪽으로 이끌었다. 주말 오후의 갤러리 산책이 그렇듯 가볍고 화사하며, 예술을 사랑하는 마음은 기본이다.
『열린책들 창립 35주년 기념 세계문학 중단편 세트』. 책은 10권씩 '정오(Noon)' 세트와 '자정(Midnight)' 세트로 나뉘어 있다.
지난 몇 년 동안 함지은의 대표작은 베르나르 베르베르의 『죽음』이었다. 특히 한정판은 야광 퍼포먼스로 화제를 모았다. 화제의 이유를 알려면 어두운 방에서 홀로 해골 문양의 홀로그램 표지를 마주해야 한다. 이윽고 해골 문양 위로 초록빛 백조가 떠오르는 마법 같은 순간이 당신을 찾아갈 것이다. 문학 분야 표지 디자이너로 이름 높은 박진범은 2019년 올해의 북디자인으로 이 책을 꼽았다. 이유는 선명했다.
“디자이너가 책을 완벽하게 파악하고 치밀하지 않으면 절대 만들어질 수 없는 책.”
함지은이 『열린책들 창립 35주년 기념 세계문학 중단편 세트』의 표지에서 제목을 지우고, 뒤표지에 단 한 줄의 발췌문만을 새긴 이유도 이와 같다.
“디자인 스타일을 물어보셨던데, 굳이 단어로 치환하면 ‘가변성’이 아닐까 해요. 책의 본질이 먼저고 디자인은 그에 따라 늘 변화해야 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일까? 스무 권 중 어느 책이든 손에 쥐는 순간, ‘믿보명’ 중단편을 읽는 시간으로 진입하게 된다. 짧고 즐거울 것이다.

추천기사
‘대한민국 No.1 문화웹진’ 예스24 채널예스

정다운
채널예스는 예스24에서 운영하는 콘텐츠 플랫폼입니다. 책을 둘러싼 다양한 이야기를 만나 보세요.

이혜련(아더스튜디오)
채널예스는 예스24에서 운영하는 콘텐츠 플랫폼입니다. 책을 둘러싼 다양한 이야기를 만나 보세요.









![[올해의 장르] 문학동네 총총 시리즈 이연실, 이자영 편집자 | YES24 채널예스](http://image.yes24.com/images/chyes24/2/3/1/0/231050678fc2e507a6e56883aa367b36.jpg)
![[올해의 롱런] 소설가 이미예, 오늘 밤 당신이 사고 싶은 꿈은 | YES24 채널예스](http://image.yes24.com/images/chyes24/0/2/d/3/02d37f55b06a4a47ee8afe0e905540d9.jpg)
![[올해의 OO 특집] 책라방의 기쁨과 슬픔 - 소설가 김금희 | YES24 채널예스](http://image.yes24.com/images/chyes24/e/0/a/c/e0ac5718318bbd66b4c7015df5efa327.jpg)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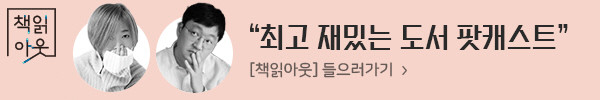
![[인터뷰] 오은 “산문은 수렴하듯 쓰고, 시는 발산하듯 쓰죠“](https://image.yes24.com/images/chyes24/article/cover/2025/08/20250811-ea2210ec.jpg)

![[취미 발견 프로젝트] 독서하고 싶은 공간 만들기](https://image.yes24.com/images/chyes24/article/cover/2025/02/20250226-346177ac.png)



![[세트] 죽음 (총2권)](https://image.yes24.com/goods/73501696?104x14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