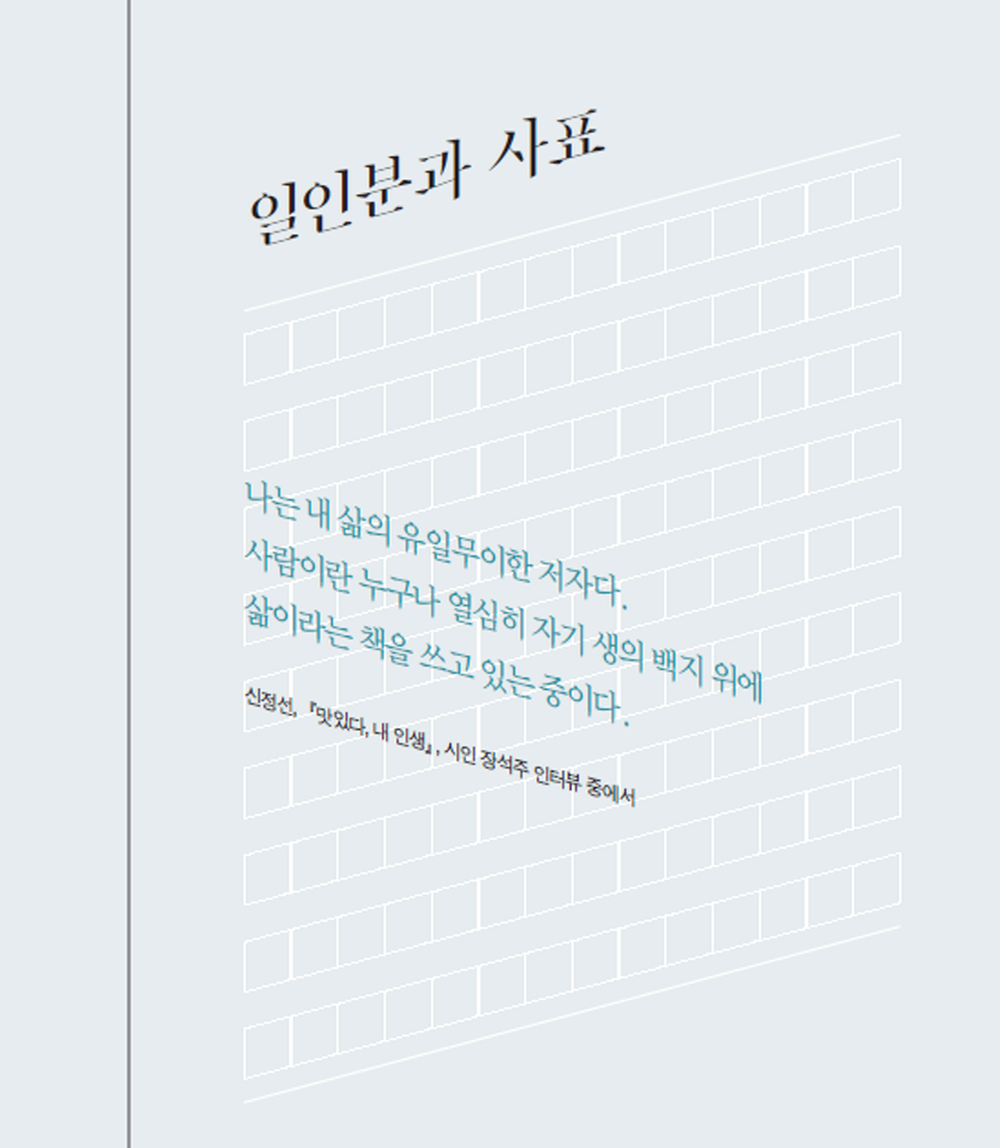
나는 내 삶의 유일무이한 저자다.
사람이란 누구나 열심히 자기 생의 백지 위에 삶이라는 책을 쓰고 있는 중이다.
- 시인 장석주 인터뷰 중에서. 신정선 저 『맛있다 내 인생』 223쪽
서울에 올라와 가장 먼저 놀란 것은 밥공기였다. 서울이라 딱히 달랐던 것은 아닐 테고, 고등학교 시절까지는 집에서 밥을 먹고 다니다가 대학을 서울로 오면서 본격적으로 식당 밥을 먹게 되었는데, 말하자면 그 시절의 집밥과 식당 밥의 차이였을 것이다. 일인분의 밥공기가 시골집에서 먹던 사이즈의 3분의 1이나 되었을까. 매 끼니마다 고봉으로 한 그릇을 꽉꽉 눌러 담아 주시고 그것도 모자라 그 많은 밥을 다 먹고 나면 기다렸다는 듯이 한 주걱의 밥을 더 퍼오셔서 밥그릇이 바닥을 드러내기 전에 묻지도 않고 채워주시던 어머니 생각이 나 혼자 웃던 스무살이었다. 요즘 나는 집에서 작은 막걸리잔을 밥공기로 쓰고 있는데, 실로 격세지감을 느낀다.
카피라이터로 회사에 들어가서 놀랐던 것 중 하나는 밥을 먹으러 차를 타고 제법 멀리까지도 가는 일이었다. 어려운 프로젝트로 고생하는 후배들을 위로해주고 싶은 선배들이 이따금씩 밥을 먹자며 차에 태워 한적한 교외로 데리고 갔다. 산기슭 어느 평상에선 푸짐한 닭백숙이 차려지기도 했고, 식당의 외관은 허름해 보이지만 한눈에도 요리의 내공은 단단해 보이는 중국집에서 난자완스니 유린기니 하는 그 전엔 이름만 겨우 들어본 근사한 안주로 식초처럼 생긴 이과두주를 낮술 삼아 홀짝이기도 했었다. 한정식집이라는 곳도 그렇게 처음 갔었는데 서양식 정찬처럼 코스로 끝없이 나오는 일인분의 양에 놀라 어이구야를 연발했던 기억이 난다.
카피라이터의 일이란 게 아홉시에 딱 시작해서 여섯시에 칼같이 끝날 수 있는 일이 아닌지라 선후배 동료들과 늦게까지 회의를 하거나 아예 여관이나 호텔 방을 잡아 2박 3일 쯤 합숙하며 아이디어에 골몰하기도 했었는데, 축구 A매치나 야구 코리안 시리즈라도 있는 날엔 일 따위야 나 몰라라 저만치 미뤄두고 정해진 일정인 양 TV 앞에 모여서 같이들 보곤 했다.
"미드필드가 구멍이다, 오늘은 골키퍼가 두 명 몫을 하는구만, 4번 타자가 저렇게 제 역할을 못 해서야 쯧쯧쯧 혀을 차고 침을 튀기며 열을 올리다가 누구였나 이런 얘기를 농담처럼 던졌다. 우리가 경쟁PT 준비하는 걸 스포츠 중계하듯 카메라가 잡아 보여준다면 가관이겠다, 그치? 저 카피라이터 좀 봐, 왜 저리 쩔쩔 매고 우물쭈물하고 있어? 저 회사는 기획이 자신감이 없군 그래, 에이 저 정도는 아트가 마무리했어야지...뭐 그러면서들 보겠지? 음하하하하."
좌중이 웃었고 내 입꼬리도 어색하게 웃고는 있었지만 어리버리 초짜였던 나는 왠지 서늘한 기분이었다. 그 모호하고 뒷골 당기는 게 뭐였는지 나는 오래 지나고 나서야 명료하게 알게 되었는데 그건 일인분이라는 화두였다. 일에서의 일인분.
인간이 하는 일에 혼자 할 수 있는 일은 없다. 일이란 결국 함께 하는 일과 동의어다. 하지만 함께는 언제나 혼자의 합이다. 각각의 혼자가 자기 할 일을 잘 하지 않고서 함께 하는 일의 뛰어난 성과를 기대하기란 어렵다. 무엇보다 일에서 일인분을 못 하면 눈치를 보게 된다. 시키는 일만 겨우 하게 되고 그조차 제대로 해낸 건지 스스로 알 수 없어 주눅이 든다. 생활에서도 의기소침해지고 일이 점점 재미없어진다. 비굴해지기 쉽고 비겁한 결정 뒤에 숨어 스스로 자기 합리화 할 위험도 커진다. 자기 업무 영역의 전문성에서 그리고 자기 위치와 역할에 맞는 일인분을 거뜬히 해내는 것은 그래서 중요하다. 일에서 눈치 보는 인간이 되면 삶에서 주체적이기 몹시 어려워지기 때문이다.
카피라이터건 아니건 자기 업무에서 일인분을 해내는 수준까지 가능한 한 빨리 도달하는 것은 그래서 매우 중요하다. 내가 만약 내 분야에서 사원급의 연차라면 나의 목표는 그것이 되어야 한다. 일인분의 수준에 어느 정도 도달했다고 해서 끝난 건 아니다. 역할과 직급에 따라, 때로는 프로젝트의 특성에 따라 일인분은 달라지기 때문이다. 끊임없이 공부하지 않을 수 없는 이유다.
일인분은 의외로 사표와도 관련된다. 동료이자 친구인 카피라이터 H가 그 증거다. 자기 업의 영역에서 일인분 이상을 너끈히 해내는 유능함에 도달하기 위해 치열하게 노력한 그는 구체적인 사안마다 자기 의견과 소신을 상대가 누구건 상관없이 최선을 다해 설득했고 그러다가 꼰대 같은 사장과 여러 번 부딪쳤다. H가 미련 없이 사표를 던졌을 때 그에게 다음 행보의 계획 같은 건 전혀 없어서 나는 몹시 놀랐다. 몇 년 후 그 다음 회사에서 불운하게도 임원으로서 자기가 감당해야 할 일인분을 못 하고 있다고 스스로 느꼈을 때 H는 역시 사표를 던졌다.
가장이자 회사원으로서 자기 판단으로 사표를 던진다는 게 어떤 일인지 해본 사람은 안다. 백척간두에서 그야말로 허방을 향해 한발을 내딛는 그 두려움이란. 그러나 H가 잘 나갈 때나 그렇지 못할 때나 자기 일에서 일인분을 멋지게 해내는 사람이란 걸 누구보다 그 자신이 알았다. 그래서 H는 어려운 시절이 와도 힘들지언정 구차하지 않았다.
일은 살기 위해 하는 것이다. 자기 일을 잘 해야 하는 건 자기 삶을 잘 살기 위해서다. 한번 뿐인 자기 삶을 주체적으로 살기 위해서다. 시인의 말대로 우리는 누구나 자기 삶의 유일한 저자로서 생의 백지 위에 열심히 자기 삶을 써가는 중이다. 어디서 무슨 일을 하고 있건 간에 잊지 말아야 할 사실이다. 내 삶의 유일한 저자가 누구의 눈치나 보고 의기소침한 채 주눅이 들어서야 어찌 제대로 자기 삶을 써나갈 수 있겠는가. 그러니 일하는 자라면 자신에게 물어야 한다. 함께 하는 일에서 나는 지금 나의 일인분을 하고 있는가? 내가 있는 곳에서 내 위치와 역할에 합당한 일인분을 누구나 수긍할 만한 수준으로 해내고 있는가? 무엇보다 스스로의 눈으로 자신의 일인분을 긍정할 때 우리는 비로소 당당할 수 있게 된다.
H는 지금 또다른 광고회사에서 새로운 삶을 열정적으로 써가고 있는 중이다. 물론 일인분 그 이상을 충분히 해내면서 말이다. 그곳에서 커지고 높아진 일인분의 몫을 제대로 하지 못한다고 자기 스스로 판단하는 날이 혹시라도 온다면, H는 마음 속 두려움을 내색하지 않으며 또다시 씩씩하게 사표를 던질 것이라고 나는 믿어 의심치 않는다.
추천기사
‘대한민국 No.1 문화웹진’ 예스24 채널예스
맛있다, 내 인생
출판사 | 예담

이원흥(작가)
<남의 마음을 흔드는 건 다 카피다>를 쓴 카피라이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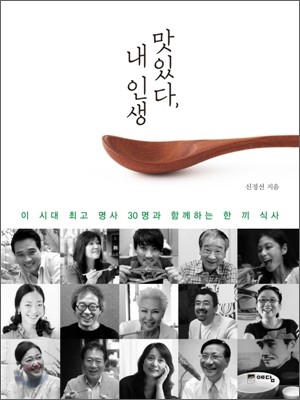

![[이원흥의 카피라이터와 문장] 보이는 게 다일지 몰라 | YES24 채널예스](http://image.yes24.com/images/chyes24/1/d/2/8/1d287247c7ebe8b7e5c227179ede98a7.jpg)
![[이원흥의 카피라이터와 문장] 농담에도 방향성이 있다 | YES24 채널예스](http://image.yes24.com/images/chyes24/f/d/b/8/fdb8c520783a76713a1bf5efe16f8b02.jpg)
![[책읽아웃] 휴일 아침에 눈 뜨자마자 읽으면 좋을 책 | YES24 채널예스](http://image.yes24.com/images/chyes24/d/a/2/9/da2985673fb4e8dfb8dd75ae459719fe.jpg)

![[취미 발견 프로젝트] 손으로 독서하기](https://image.yes24.com/images/chyes24/article/cover/2025/08/20250829-08dcde92.jpg)

![[추천핑] 국경을 넘는 한국 문학](https://image.yes24.com/images/chyes24/article/cover/2025/04/20250423-ab42d6ee.pn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