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출처_imagetoday
인문학 열풍이란 게 진짜 있었는지 모르겠다. 어느 날 깨어나 보니 너도나도 인문학을 외쳐댔다. 항상 찬밥이었던 문사철에도 볕 들 날 있다는 듯 책들이 팔리기 시작했다. 초기의 백가쟁명은 신속히 진압되고 ‘몇 년간 책을 몇 권 읽었다’는 사이비들이 천하를 몇 조각으로 나누었다. 이런 사람들을 믿지 않는다. 책을 많이 읽는다고 사람이 여물지 않기 때문이다.
몇만 권을 읽었다는 사람의 글을 보면 헛웃음이 난다. 여기저기서 주워 모은 것들을 입시 공부하듯 줄을 긋고 달달 외운 다음 ‘나를 당할 자는 없으며, 시간이 지나면 나만 살아남을 것’이라는 악다구니는 어떤가. 많이 읽었는지도 의심스럽지만, 읽고 듣고 본 것을 찬찬히 살피고 궁리해보지 않은 것은 어떻게든 표가 난다. 퍼 넣고 소화를 시키지 못하니 배탈이 나는 것이다. 그런 일이라면 인간보다 절대로 배탈 나지 않는 슈퍼컴퓨터나 인공지능이 더 잘할 것이다.
책을 읽는 행위로 상징되는 인문학의 효용은 무엇일까? 많은 지식을 뽐내는 것인가? 스티브 잡스처럼 기술과 융합시켜 엄청난 부를 거머쥐는 것일까? 자식에게 책을 읽으라고 할 때 우리는 무엇을 기대하는가? 좋은 문학작품을 읽거나, 소설보다 더 극적인 역사를 더듬다 보면 별의별 사람과 사건이 많다. 내 자식들이 그 사람과 사건들을 넓고 얕게 외웠다가 지적인 대화에 써먹기를 바라지 않는다. 인터넷으로 잡동사니를 끌어모은 후 전통을 어설프게 떡칠하는 ‘디지로그’가 되거나, 제 것 아닌 감정이나 생각에 싸구려 감상을 섞은 후 ‘에디트(edit)’하여 대박 치기를 원하지 않는다.
나는 무엇보다 내 자식들이 그 많은 사람과 사건에 깃들어 있는 ‘형편’과 ‘사정’을 헤아리기를 바란다. 남의 입장을 살피고, 그의 자리에 서보고, 따뜻하게 품어주는 사람이 되기를 바란다. 그런 ‘공감’의 능력을 얻지 못한다면 몇 수레의 책을 읽은들 무엇에 쓰겠는가?
인문이란 ‘천문(天文)’의 대구(對句)로 등장한 말이라고 한다. 하늘의 이치에 대해 이 땅에 살아가는 인간의 이치요, 자기탐구다. 나는 예술도 포함해야 한다고 믿지만 대개 문사철, 즉 문학, 역사, 철학을 지칭한다.
보통 사람들과 가깝기로는 역시 문학이다. 아름다운 시구(詩句), 파란만장한 스토리, 가슴을 저미는 비애, 박장대소할 해학, 간절한 염원과 안타까운 좌절, 선과 악, 사랑과 배신, 승리와 패배, 타락과 부활 등 인간에 대한 모든 것이 문학 속에 녹아있다. 무엇보다 문학은 인간과 삶에 깃든 ‘형편’과 ‘사정’을 그려내기에 우리는 삶에 지칠 때, 혼자라고 느낄 때, 세상에 화가 나고, 다른 인간에게 실망했을 때 저마다의 ‘형편’과 ‘사정’을 그 위에 포개고 견주어보며 울고 웃고, 깨달음과 위안을 얻는다.
유난히 굴곡진 역사 속에서 삶을 견뎌야 했던 우리에게 문학은 저항과 치유의 수단이기도 했다. 수천만 동포 중에 가장 잔인하고 어리석고 무모한 자들이 권좌에 올라 역사와 개인의 삶을 비틀고 모욕할 때 문학은 불이었다. 흔들리는 완행버스 뒷자리에서 깜박이며 금서(禁書)의 한 줄을 비추는 실내등이거나, 뿌리 뽑힌 채 주변으로 몰리며 떠도는 새벽에 앙상한 노동의 손마디를 덥히는 모닥불이거나, 분노가 봇물 터지듯 함성으로 터질 때 선봉에서 길라잡이로 타오르는 횃불이었다. 문학은, 우리에게, 특별한 그 무엇이었다.
유명한 소설가가 술자리에서 여성을 성추행했다는 기사를 보았을 때 어이가 없었다. 그 여성은 업무상 만난 출판 관계자였다. 본디 그를 높게 평가하지 않았기에 큰 충격을 받지는 않았다. 잘 봐줘야 이류 글쟁이가 얄궂은 소설 한 편 냈다가 영화가 되고 화제에 오르니 뭐라도 된 줄 알고 노추를 드러냈다고 생각했다. 우리는 문화예술계에서 오래 버티면 대가의 아우라를 덧씌운다. 예술적 성취보다 장수(長壽)가 더 중요한 성공의 비결인 셈이다. 물론 다 장삿속이다.
중뿔난 성도착자의 일탈이라는 나의 해석은, 그러나 완전히 빗나갔다. 시인, 만화가, 디자이너, 미술계… SNS에 피해자들의 폭로가 이어졌다. 멀쩡한 곳이 있었나 싶다. 사과문을 발표한 자도 있지만, 절반 정도는 자기변명이거나 묘하게 남을 탓하는 분위기마저 풍긴다. 하기야 어찌 말(言)로 그들을 당하랴.
내막을 보면 대부분 자신이 지닌 지위를 이용해 약자의 위치에 있는 여성을 욕보인 것이다. 나라가 약육강식의 정글, 갑질 공화국이 된 지 오래다. 그나마 숨 쉴 구멍이라고 믿었던 문화예술계조차 무도한 포식동물들이 어슬렁거리는 골짜기였음을 알고 난 심정은 참담하다. 위로는 정신병자들과 무당이 나라를 거덜 내는데 옆에는 야차(夜叉)와 금수가 날뛰니 여기가 지옥이 아니면 어디인가.
문화예술계는 자정을 다짐한다. 그러나 개인의 마음속에 깃든 악을 무슨 수로 찾아내어 바로잡을 것인가. 솔직히 문화예술계에서 믿기 어려운 풍문이 들려온 것은 어제오늘의 일도 아니다. 피해자와 지금까지 방관했던 주변인들의 용기 있는 고발과 모든 사람의 지지가 무엇보다 중요하다. 혹시라도 예술적 자유와 재능을 들어 덮으려고 해서는 안 된다.
다시 말하건대 문화와 예술의 가치는 남의 ‘형편’과 ‘사정’을 헤아리고 공감하는 능력을 고양하는 데 있다. 밥을 위해, 경력을 위해, 혹은 뭔가를 배우기 위해, 추잡한 농담과 신체적 희롱을 견디는 여성의 수치심과 굴욕조차 헤아리지 못한다면 말로써 비단을 짜고 붓으로 황금을 쏟아낸들 공감 능력이 결여된 사이코패스에 불과하다. 사이코패스가 있을 곳은 문단이나 미술관이 아니라 병원과 상담실이다. 문학과 예술이 다시 제자리를 찾기를 간절히 바란다. 그렇지 않고서야 이 어지러운 세상을 어찌 견디고 다시 세워갈 것인가.

강병철(소아청소년과 전문의, 꿈꿀자유 서울의학서적 대표)
서울대학교 의과대학을 졸업하고 같은 대학에서 소아과 전문의가 되었다. 2005년 영국 왕립소아과학회의 ‘베이직 스페셜리스트Basic Specialist’ 자격을 취득했다. 현재 캐나다 밴쿠버에 거주하며 번역가이자 출판인으로 살고 있다. 도서출판 꿈꿀자유 서울의학서적의 대표이기도 하다. 옮긴 책으로 《원전, 죽음의 유혹》《살인단백질 이야기》《사랑하는 사람이 정신질환을 앓고 있을 때》《존스 홉킨스도 위험한 병원이었다》《제약회사들은 어떻게 우리 주머니를 털었나?》 등이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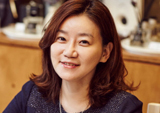
![[에디터의 장바구니] 『빨래』 『비신비』 외](https://image.yes24.com/images/chyes24/article/cover/2025/11/20251121-aa8fb1bb.jpg)
![[더뮤지컬] <생계형 연출가 이기쁨의 생존기> 좋은 창작 환경이란 무엇일까요?](https://image.yes24.com/images/chyes24/article/cover/2025/11/20251104-c5a4cbfa.jpg)
![[더뮤지컬] "韓 뮤지컬 60년 역사 정리" 국내 최초 한국뮤지컬학회 창립](https://image.yes24.com/images/chyes24/article/cover/2025/08/20250826-5f8e717b.jpg)
![[인터뷰] 이금이, 역사의 행간에 숨어 있는 진실을 찾아내기](https://image.yes24.com/images/chyes24/article/cover/2025/08/20250821-d41176b0.jpg)
![[리뷰] 웹소설의 유행은 패션입니다](https://image.yes24.com/images/chyes24/article/cover/2025/05/20250515-47aa41f3.png)



책사랑
2016.10.31
jijiopop
2016.10.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