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나는 영화 <스포트라이트>를 저널리즘 영화로만 받아들이고 싶지 않다. 기자들이 주요 등장인물이고, 저널리즘의 교본으로 쓰일 만한 내용이라는데 동의한다. 하지만 이 영화는 저널리즘에 국한되지 않는, 보다 크고 무거운 메시지를 던지고 있다고 나는 생각한다. 그것은 ‘내부자 사회를 지탱하는 작은 악들’에 대한 경고다.
<스포트라이트>는 가톨릭 신부들의 아동 성추행을 다룬다. 수십 년간 보스턴 사회에서 많은 이들이 알고 있으면서도 방치해온 문제였다. 성추행 피해자들을 대리하는 변호사 개러비디언(스탠리 투치)이 기자에게 하는 말은 의미심장하다.
“새로 온 당신네 편집국장이 유태인이라면서... 나는 아르메니아 사람이야. 이 사건은 외부인이 필요한 사건이지.”
그가 “이 도시(보스턴)가 주는 소외감”을 말하는 것은 보스턴 사회의 결속력과 폐쇄성 때문이다. 기자, 변호사, 판사... 등장인물 대부분이 보스턴 출신이다. 그 중 상당수는 고교 선후배다. 그들은 수십 년 동안 한 울타리 안에서 내기 골프를 하고 파티에서 만나고 일을 함께 도모해온 사이다. 그들은 기자에게 말한다.
“(편집국장은) 몇 년 있다가 떠날 사람이야. 당신은 어디로 갈 거냐고.” “여긴 우리 고향이잖아.”
그들이 사교의 네트워크 속에서 사는 사람들이란 사실은 피해자들이 가난하고 소외된 계층 아이들이란 것과 대조를 이룬다. 그렇다고 그들이 악인들은 아니다. 성추행 합의로 돈을 벌어온 변호사는 한때 신문사에 제보 편지를 보냈고, 기자는 아동 성추행을 ‘데일리 기사(daily coverage)’로 처리하고 넘어갔다. 다들 “나는 내가 할 일을 했을 뿐”이라고 말한다.
이들 중 알리바이가 없는 사람은 없다(Everybody has an alibi). 심지어 아이들을 추행한 신부조차 “만졌지만 즐겁지는 않았다”고 말한다. 내부자들은 서로가 서로에게 책임을 떠넘긴다. 이러한 침묵의 나선 속에서 아이들은 계속해서 신부들에게 성폭행 당하고, 정신병을 앓고, 마약과 술에 빠져들고,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외부인(편집국장/변호사)의 등장과 함께 진실이 몸통을 드러내고 나서야 내부자들은 양심의 가면을 벗는다. 그리고 다른 내부자들에게 묻는다. “자넨 어디 있었나? 왜 이렇게 오래 걸린 거야?”
그것은 곧 우리에 대한 물음이기도 하다. 당신들, 왜 이렇게 오래 걸린 거야? 왜 지금 구경하고만 있는 거야?

한국 사회는 훨씬 더 강고하게 짜인 내부자들의 사회인지 모른다. 2012년 12월 선거 과정에서 댓글 작성 사실이 발각되기까지 애국심으로 무장한 국정원 직원들은 매일 정시에 출근해 퇴근시간 때까지 댓글을 달았다. 그들은 “내가 아니라도 누군가는 해야 할 일이야” “나는 위에서 시키는 대로 할 뿐이야”라고 되뇌었을 것이다.
2014년 4월 세월호 사건도 수많은 ‘작은 부패’들이 없었다면 일어나지 않았을 것이다. 일본에서 들여온 낡은 세월호는 불법 증축됐고, 과적에 평형수는 부족했다. 그렇게 배가 바다 위를 달리기까지 크고 작은 이권들이 오갔다. 저마다 비리의 한 축을 담당하고 있었지만 자신이 책임질 일은 아니라고 생각했을 것이다. 배가 가라앉은 다음에도 다르지 않았다. 선장과 선원들을 배를 버렸고, 구조에 나선 해경은 배 주위만 빙빙 돌았고, 대통령은 뒤늦게 모습을 나타냈다. 그들은 반문하고 싶을 것이다. “나보고 더 이상 어떻게 하라고?”
시스템 꼭대기에 서 있는 추기경과 국정원장, 대통령이 가장 큰 책임을 져야 한다. 그러나 그 시스템 속에서 무감각하게 방조자 역할을 했던 이들도 n분의 1, 아니 자기가 가진 힘만큼의 책임은 져야 하지 않을까. 한두 차례 기사를 썼다는 이유로 책임을 회피했던 보스턴과 한국의 기자들도 혐의를 벗기 어렵다. 바쁘게 살았다는 것만으로 모든 죄를 용서받을 순 없다. “우린 어둠 속에서 넘어지며 살아요. 갑자기 불이 켜지면 탓할 것들이 너무 많이 보이죠.” 편집국장 배런(리브 슈라이버)의 위로는 “어둠 속에서 넘어지지 말라”는 경고이기도 하다.
 |
 |
미국 정치학자 한나 아렌트는 『예루살렘의 아이히만』에서 ‘악의 평범성(the banality of evil)’을 말한다. 독일 나치 전범 아돌프 아이히만이 유태인 학살이라는 반인륜 범죄를 저지른 건 아무 생각 없이 자신의 직무를 수행하는 ‘사고의 결여’ 때문이라는 것이다. 우리가 아이히만은 아니라고 해도 이 물음에서 비켜갈 수 없다.
평범한 사람들의 작은 악(惡)들이 거악(巨惡)을 떠받치고 있는 건 아닌가. 거악은 한두 사람의 악인이 아니라 선량한 시민들의 작은 악들이 모인 결과가 아닌가.
주기도문(主祈禱文)엔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라는 구절이 있다. 우리는 그 악이 바깥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서 오는 것일 수도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한다. 그 위험성을 인식하고 경계하지 않으면, 늘 깨어 있지 않으면, 내부의 악과 끊임없이 싸우지 않으면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악마와 악수하게 될 것이다. “나는 할 일을 했다”고 말하며. ‘나는 최선을 다했다’고 믿으며.
[추천기사]
- ‘권석천의 무간도’를 시작하며
- 존중받아야 할 삶, 기억해야 할 역사 : <귀향>
- 현실주의자의 3원칙 <검사외전>
- 당신의 손길은 좋아요 백만 개, <좋아해줘>
- 영화 <클래식>, 남편과 보고 싶지 않은 이유
예루살렘의 아이히만
출판사 | 한길사

권석천(중앙일보 논설위원)
1990년부터 경향신문 기자로 일하다가 2007년 중앙일보에 입사해 법조팀장, 논설위원 등을 지냈다. 앞에 놓인 길을 쉬지 않고 걷다 보니 25년을 기자로 살았다. 2015년에 <정의를 부탁해>를 출간했다. 이번 생에는 글 쓰는 일에 최선을 다하며 살고 싶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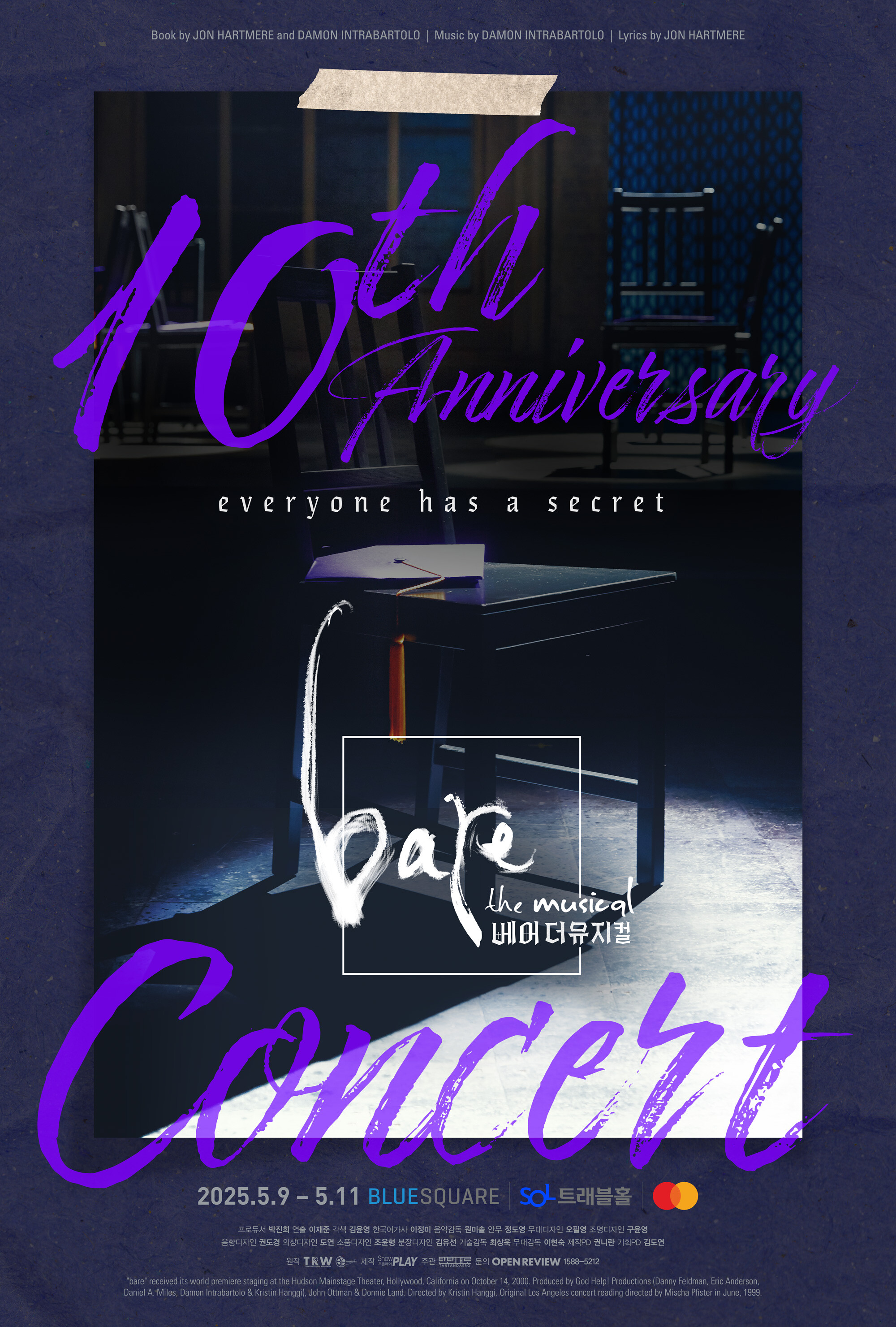
![[큐레이션] 인류애를 회복하고 싶은 사람을 위한 소설](https://image.yes24.com/images/chyes24/article/cover/2025/01/20250121-9bf6400c.png)
![[리뷰] 새로운 관계의 실험 『보스턴 사람들』](https://image.yes24.com/images/chyes24/article/cover/2025/01/20250102-bff12fec.jpg)



iuiu22
2016.03.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