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 12월 20일 오후 12시 30분. 인천공항에서 아시아나 OZ502 파리행 비행기를 탔다. 1년 만에 서울을 떠나 파리로 간다. 서울을 떠나기 전에 해야 할 일들을 다 처리했다. 단 하나 처리하지 못한 게 <월간 채널예스> 서평이었다. 그래서 이성복의 시론 『극지의 시』를 챙겨가지고 비행기에 올랐다.
2007년에 나온 나의 책 『한국인의 문화적 문법』과 2011년에 나온 『프로방스에서의 완전한 휴식』에서 나는 이성복의 시를 인용한 적이 있다. 나와 이성복을 따로 아는 사람들이 두 사람이 비슷한 느낌을 준다고 말하는 걸 몇 번 들은 적이 있지만 이성복을 직접 만난 적은 없다. 한 번 만날 기회가 있었는데 빗나간 적은 있다. 2005년쯤 내가 파리에 살고 있을 때 마침 이성복의 시집이 프랑스어로 번역되었다. 그 때 이성복이 파리에 와서 몇 가지 행사를 할 예정이었다. 그런데 이성복이 부친상을 당해서 오지 못했다.
그 해 가을 나는 오를레앙에서 이성복 없이 열린 문학 행사에 참석한 적이 있다. 파리의 오스테를리츠 역에서 기차를 타고 갔던 기억이 생생하다. 그 모임에는 이성복 시집의 번역자 노미숙과 그의 남편 알랭 젠느티요, 클로드 무샤르를 비롯한 프랑스 시인들, 이성복의 시집을 출판한 블랭 출판사의 편집자, 지방 라디오 방송국 피디, 오를레앙의 문화예술인, 파리에 체류 중이던 이성복의 고향 친구라는 화가 등이 참석했다. 오를레앙의 유명한 서점 2층에서 열렸다. 서점의 이름은 틀릴 수도 있지만 ‘레 탕 모데른’Les Temps Modernes이라고 흐릿한 기억 속에 남아 있다. 그 서점으로 가는 길에 오를레앙시립 도서관이 있었는데 거기에서 조르주 바타이유가 사서로 일했다고 한다.
인천 공항은 수많은 중국 여행객들로 붐볐다. 비행기가 아니라 무슨 완행열차를 타러 나온 느낌이었다. 천천히 이동하던 비행기는 20분 만에 빠른 속도로 활주로를 달리더니 이내 이륙하여 하늘을 향해 치솟아 올랐다. 지상의 산과 건물들이 경사진 각도로 보이더니 이내 구름만 보였다. 비행기는 1만 미터 높이까지 올라간 지점에서 수평으로 날기 시작했다. 나는 이성복의 시론집 『극지의 시』를 꺼내 읽기 시작했다. 이 책은 2015년 9월 9일에 나왔다. 그 무렵 나는 『응답하는 사회학』 마지막 원고를 수정하고 있었다. 문학과지성사 인문팀장 김현주 씨가 내 책의 편집을 담당했는데 내 책의 최종 원고 수정이 끝나는 날 이성복의 시론집 세 권을 내밀었다. 미리 줄 수도 있었는데 그랬더라면 나의 책 『응답하는 사회학』에 몇 군데 인용할 가능성이 높아서 원고 마감이 늦어질까 봐 일부러 늦게 전달했다고 한다.
나는 사회학자이지만 시 읽기를 즐긴다. 그리고 내가 쓰는 글에 즐겨 시를 인용하기도 한다. 내가 논문이나 산문으로 주장하는 것을 가슴을 울리게 표현해주는 시를 발견하면 너무 기쁜 나머지 나는 그 시를 나의 글 안에 자리를 마련하여 정중하게 모신다. 그렇게 함으로써 논리적이면서 감성적이고, 현실적이면서도 시적인 분위기를 만들어진다.
이성복은 1952년생이다. 그는 시인으로서 자신이 해온 작업을 차분하게 정리하고 마무리하는 단계에 들어섰다. 작년 2014년에는 시집 『어둠 속의 시: 1976-1985』, 산문집 『고백의 형식들: 사람은 시 없이 살 수 있는가』, 대담집 『끝나지 않는 대화』 이렇게 무려 세 권의 책을 펴냈다. 세 권 다 열화당에서 나왔다. 2015년에는 문학과지성사에서 작고 아담한 규모의 시론집 세 권을 동시에 펴냈다. 그 중의 한 권이 『극지의 시: 2014-2015』다. 그런데 기이하게도 지난 가을 내가 아는 두 사람이 이 시론집에 실린 한 구절을 똑같이 인용했다. 한 사람은 목사인데 설교에서 이 구절을 인용했고 또한 사람은 사회학자인데 학회 발표문에서 이 구절을 인용했다. 그 구절은 다음과 같다.
“입이 벌어질 정도로 어마어마한 남벽南壁 아래서 긴 호흡 한 번 내쉬고, 우리는 없는 길을 가야 한다. 길은 오로지 우리 몸속에 있다는 것을 깨달으며, 밀고 나가야 한다. 어떤 행운도 어떤 요행도 없고, 위로도 아래로도 나 있지 않은 길을 살아서 돌아와야 한다.”
안나푸르나 등반에서 조난당한 30대 초의 대원이 사고 당하기 전날 밤 텐트 속에서 쓴 글이라고 한다. 시인은 이 인용문이 글쓰기의 완벽한 은유라고 보고, 목사는 이 글이 기독교인의 삶의 자세라고 해석하며, 사회학자는 이 글이 진정한 사회학자의 자세를 보여준다고 말한다.
이성복은 이렇게 썼다. “시가 향하는 자리, 시인이 머물러야 하는 자리는 더 이상 물러설 수도 나아갈 수도 없는 ‘극지’이고, 그 지점에 남아있기 위해서는 무작정 버티는 것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진정한 시가 ‘극지의 시’라면 진정한 믿음은 ‘극지의 믿음’이고 진정한 사회학은 ‘극지의 사회학’이다.
이제 60대의 나이로 들어선 나는 가끔씩 1970년대 나의 20대 시절을 떠올려본다. 그러면서 『극지의 시』에 나오는 다음과 같은 구절을 음미해본다. “1976-1985년, 그 시절 저는 좋은 예술가가 되고 싶었답니다. 그 시절에는 열정과 고통과 꿈이 있었습니다. 저에게는 그 시절만이 아름답습니다.” 나는 위의 문장을 다음과 같이 바꾸어본다. “1974-1989년, 그 시절 저는 진정한 학자와 지식인이 되고 싶었답니다. 그 시절에는 열정과 고통과 꿈이 있었습니다. 저에게는 그 시절만이 아름답습니다.” 이성복은 위의 문장에 이어 이렇게 썼다. “이제 얼마 남지 않은 시간 동안 저는 본래 출발했던 그 자리만을 놓치지 않으려 애쓸 것입니다.” 『응답하는 사회학』에 실린 “패자의 윤리학”이라는 글에 자세하게 밝혔지만 1989년 귀국 이후 1990년대는 나의 수난기였다. 2000년대 나는 파리에서 정신적 망명시기를 보냈고 그 시절 나는 그냥 사회학자에서 ‘사회학자/작가’로 변신했다. 늦게나마 내가 나 나름의 특색을 지닌 사회학자가 될 수 있었던 건 시를 읽었기 때문이다. 이성복의 『불화하는 말들: 2006-2007』에 실린 다음의 시를 읽으며 나는 ‘시’라는 단어를 ‘사회학’으로 바꾸어 읽어보기도 한다.
시 쓰는 사람은(사회학자는) 고정관념으로부터
자유로워야 해요.
‘자기’라는 것도 관념일 뿐이에요.
습관과 무감각은 우리를 살게 해주지만
우리를 삶과 절연(絶緣)시키는 것이기도 해요.
시가(사회학이) 고통스러운 것은 고정관념을 벗기기 때문이에요.
그것은 우리 자신을 파괴하는 거예요.
‘대한민국 No.1 문화웹진’ 예스24 채널예스

정수복(사회학자/작가)
스스로를 학문적, 지리적, 사회적 차원에서 고정된 경계선을 넘나드는 ‘탈(脫)경계 지식인’으로 생각한다. 1980년대 말 프랑스 파리에서 유학 생활을 마치고 귀국하여 활동하였고, 2002년 삶의 거처를 다시 파리로 옮겨 10년 가까이 체류하다 2011년 말 귀국했다. 『파리를 생각한다-도시 걷기의 인문학』과 『파리의 장소들-기억과 풍경의 도시미학』을 펴냈고, 사회학 저서로서는 『의미세계와 사회운동』 『녹색 대안을 찾는 생태학적 상상력』 『시민의식과 시민참여-문명전환을 꿈꾸는 새로운 시민운동』 등이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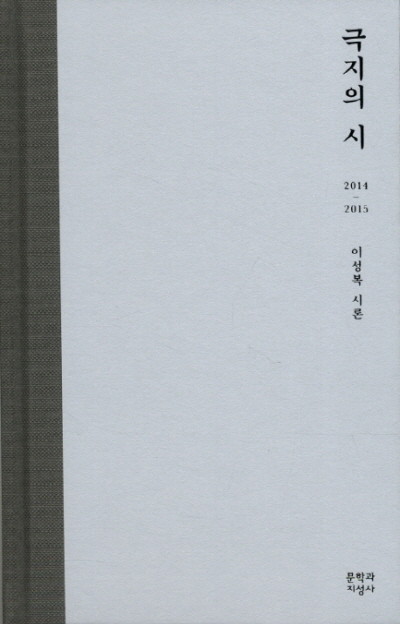
![[김미래의 만화절경] 서울의 공원과 고스트 월드](https://image.yes24.com/images/chyes24/article/cover/2025/09/20250922-2c09f7ab.jpg)
![[큐레이션] 독주회 맨 앞줄에 앉은 기분을 선사하는 시](https://image.yes24.com/images/chyes24/article/cover/2025/09/20250910-a343a9af.png)
![[큐레이션] 눅눅한 계절을 산뜻하게, Chill한 시집들](https://image.yes24.com/images/chyes24/article/cover/2025/07/20250701-51c853bf.jpg)
![[김승일의 시 수업] 에필로그로서의 시](https://image.yes24.com/images/chyes24/article/cover/2025/04/20250430-218f8487.png)
![[큐레이션] 잠들면 안 돼! 정월 밤의 시집들](https://image.yes24.com/images/chyes24/article/cover/2025/02/20250211-03a0c11d.jpg)







언강이숨트는새벽
2016.02.11
극지의 고통이라도 그 절망 가운데라도 뜨겁고 차가웠던 날들이 있어서
남은 날들을 숨 쉬는 지도...
이룬 것 없는 사람은 어쩌면 행복한지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