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에디터 통신
▶ 『나는 당신에게만 열리는 책』
이동진의 빨간책방 오프닝 에세이
안녕하세요. 저는 위즈덤하우스 편집자 유희경입니다. 이유 없이 모두 밉던 청소년 시절, 저를 붙잡아준 건 라디오였습니다. 전파를 타고 들려오는 디제이의 목소리와 음악들은 언제나 다정했어요. 라디오를 켜는 순간 저는 이해받지 못하는 외톨이가 아니게 되었죠. 그런데, 나이가 들면서 라디오와 멀어지게 되더라고요. 그렇게 추억 속 감성으로만 묻어두었던 라디오를, 요즘 다시 듣는데요.
지금 여러분이 듣고 있는 팟캐스트입니다. 내용이나 형식은 예전의 느낌과 다르지만 역시 다정해서, 살아가는데 큰 힘을 얻고 있어요. 오늘 소개해드릴 책은 제가 즐겨듣는 팟캐스트 <이동진의 빨간책방>의 오프닝들을 모아놓은 책 『나는, 당신에게만 열리는 책』입니다
시그널 음악과 함께 이동진 작가가 들려주는 오프닝 멘트들, 참 좋죠? 저 역시 참 좋아했고, 듣고 잊기엔 너무 아까운 글들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빨간책방>에 간간이 모습을 드러내곤 하는 작가 허은실 씨의 글들인데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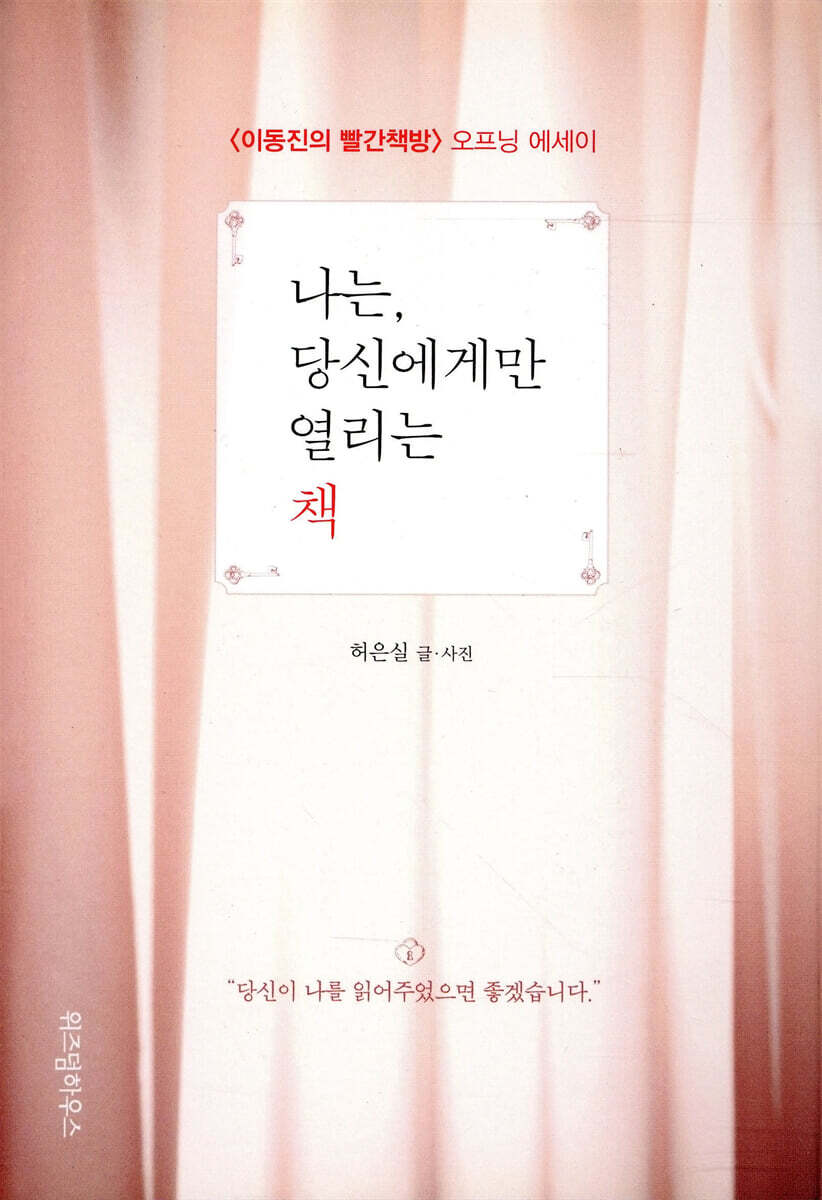 |
 |
애청자들에게 위안을 주었던 오프닝 중 가장 좋았던 것들만 모았습니다. 책의 한 부분을 읽어드릴게요. 달리 보면 ‘冊’이라는 한자는 ‘멀 경(?)’자 둘이 엮여 있는 모양이기도 합니다. 멀고 먼 것들이 책이라는 매개를 통해 만납니다.
이곳과 저곳, 먼 존재들을 연결하는 끈. 그게 바로 책이 아닐까요.
당신과 나, 우리는 이렇게 서로 멀리 있습니다.
동시에 나와 당신, 우리는 이렇게 가까이 있습니다.
우리 사이에 책이 있기 때문이지요.
이 고독한 세계에서
책이든
무엇이든
연인이든
타인이든
우리에게 위안을 주는 것은
누군가, 무언가와 연결돼 있다는 느낌입니다
이 책의 한 챕터인 <이 고독한 세계에서 책은>의 일부인데요, 이처럼, 『나는, 당신에게만 열리는 책』은 일상을 읽어보게 만드는 책입니다.
이 책을 통해 우리는 ‘소슬(蕭瑟)바람’이란 단어에서 쑥 향이 나는 거문고 소리를 낙엽의 마른 잎맥에서 여름 나무의 시원한 그늘을 읽게 됩니다. 맞은편에 앉아 있는 사람의 표정이나 길을 걷다 멈춰 서서 들여다본 들꽃, 나뭇가지에 단풍이 들어가는 과정 등 우리가 살면서 만나는 모든 것을 찬찬히 읽어내는 방법을 배우게 되죠.
세상의 작은 것들을 한 장 한 장 넘겨가며 글자들에 눈을 맞추듯 읽다 보면 작고 당연한 것들의 소중함을 느끼게 된다고, ‘읽어내는 것’ 즉 독서란 사람이 살아가는 일과 다르지 않다고, 이 책은 나직한 목소리로 일러줍니다.
허은실 작가의 에세이 『나는, 당신에게만 열리는 책』의 5부 108편의 글들은 작가가 신중히 캐내어 매만진 말 그리고 삶에 조심스레 밑줄 그으며 공명하는 독서의 경험을 독자에게 건네는 책이 되어줄 겁니다.

소리 나는 책
대로는 오퇴유의 경마장을 끼고 뻗어 있었다. 한쪽은 말들이 달리는 트랙이었고 다른 쪽은 모두 같은 모형에 따라 지은, 작은 광장들로 분리된 건물 군이었다. 나는 그 화려한 병영 같은 건물들을 지나 게이 오를로프가 자살한 집 앞에 이르렀다. 마레샬 리요테 가 25번지. 몇층일까? 그후 분명 수위는 바뀌었을 것이다. 게이를 층계에서 만나곤 했거나 그 여자와 엘리베이터를 같이 탄 적이 있는 어떤 주민이 아직도 이 건물에 살고 있을까? 아니면 내가 이곳에 자주 오곤 하는 것을 보았던 어떤 사람이 나를 알아보지 않을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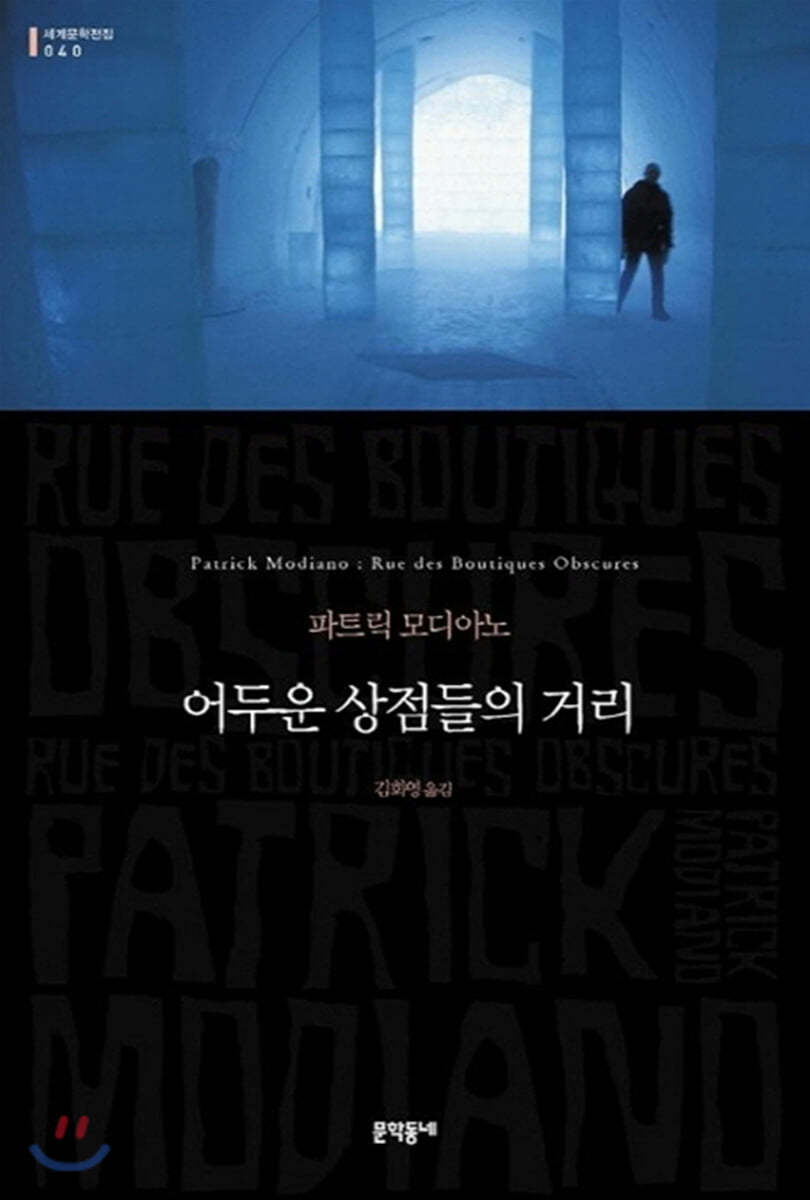 |
 |
저녁이면 가끔 나는 가슴을 두근거리며 마레샬 리요테 가의 계단을 올라가곤 했을 것이다. 그 여자는 나를 기다리고 있었으리라. 그의 창문들은 경마장 쪽으로 나 있었다. 그 꼭대기에서 경마를 구경하면 재미있었을 것이다. 마치 사격놀이 스탠드의 한쪽 끝에서 다른 쪽 끝으로 달려나가서 모든 목표물들을 다 맞히면 큰 상을 타게 되어 있는 작은 인형들처럼 아주 조그맣게 보이는 기수들이 내닫는 모습을 보고 있으면 과연 기이한 느낌이었을 것이다.
우리는 서로 어느 나라 말로 이야기했을까?영어?조르지아제 노인과 함께 있는 사진은 그 아파트에서 찍은 것일까? 아파트는 어떤 가구들로 꾸며져 있었을까?' ‘귀족집안 출신’이며 ‘존 길버트의 절친한 친구’였던 하워드 드 뤼즈란 이름의-나?-남자와 모스크바에서 태어나고 팜 아일랜드에서 러키 루치아노를 알았던 옛날 댄서는 서로 무슨 이야기를 할 수 있었을까?
- 『어두운 상점들의 거리』 (파트릭 모디아노/문학동네) 中에서

어두운 상점들의 거리
출판사 | 문학동네
나는, 당신에게만 열리는 책
출판사 | 위즈덤하우스

이동진
어찌어찌 하다보니 ‘신문사 기자’ 생활을 십 수년간 했고, 또 어찌어찌 하다보니 ‘영화평론가’로 불리게 됐다. 영화를 너무나 좋아했지만 한 번도 꿈꾸진 않았던 ‘영화 전문가’가 됐고, 글쓰기에 대한 절망의 끝에서 ‘글쟁이’가 됐다. 꿈이 없었다기보다는 꿈을 지탱할 만한 의지가 없었다. 그리고 이제, 삶에서 꿈이 그렇게 중요한가라고 되물으며 변명한다.









![[젊은 작가 특집] 장진영 “글을 쓰면 멋진 일이 많이 일어나는 것 같아요”](https://image.yes24.com/images/chyes24/article/cover/2025/06/20250617-3a5c6c82.jpg)
![[취미 발견 프로젝트] 독서하고 싶은 공간 만들기](https://image.yes24.com/images/chyes24/article/cover/2025/02/20250226-346177ac.png)




양명욱
2015.12.08
양명욱
2015.12.08
양명욱
2015.12.08
더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