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탄이 다가오고 있다. 해가 오후 세시 반이면 져버리고, 성탄 전후로 2주간 나라 전체가 겨울잠에 빠져 버리는 독일에 와 있는 나는, 지금 ‘손가락으로도 성탄을 느끼고, 발가락으로도 성탄을 느끼고 있다’. ‘그리고 이 감정은 성탄절이 다가올수록 더 커져가고 있다.’
작은따옴표로 인용한 저 문장들에 기시감을 느낀 이들이 많을 것이다. 그렇다면, 그것은 당신의 기억 속에 영화 <러브 액추얼리>가 남아 있기 때문일 것이다. 원래는 Wet Wet Wet의 노래인
항상 시류에 편승해 뭐라도 얻어걸리길 바라는 필자로서는, 성탄 분위기가 조계사 문턱까지 당도하는 이 시점에 성탄에 관하여 쓰지 않을 수 없다. 사실, 내가 이 영화를 언급한 이유을 밝히자면 그것은 문필가라는 호칭에 다소 어긋나게, 다분히 개인적인 사건에서 그 근원을 찾을 수 있다. 그리고 개인적 사건이란 항상 그렇듯, 일단 시침을 96,360번 역회전시키고, 분침이 5,781,600번 되돌려, 11년 전으로 거슬러 가야 한다.
눈치 빠른 독자는 예상했겠지만, 나는 성탄을 앞두고 개봉한 이 영화를 당연히 성탄을 앞두고, 한 여성과 보았다. 그리고 나중에 그 여인과는 연인관계로 발전하였다. 영화 한 편은 이토록 위대한 힘을 가지고 있는 것이다. 물론, 영화 한 편이 전지전능한 신이 되어 모든 것을 해결해 준 것은 아니다. 극장 문을 열기 전까지 아무런 관계도 아니었던 우리 둘 사이에는 역시 우리 둘이 어떠한 관계로 발전, 폭발, 해체 될 것이라는 것을 전혀 예상치 못했던 굉장히 눈치 없는 청년이 끼어 있었으며, 향후 소설가가 될 한 (총명했던) 남자 역시 이 영화로 인해 연애로 청춘을 소진하느라 위대한 소설을 쓸 젊음의 시기를 놓쳐버릴 것을 예상치 못했으며, 그 옆에 있었던 한 어린 여성 역시 자기 생의 일부분을 이 두 남자 중 한 명과 꽤나 오래 보낼 줄을 몰랐었다.
일단, 사건의 개요는 이렇다. 그다지 할 일 없는 세 청춘은 <러브 액추얼리>를 함께 봤다. 성탄을 앞두고 합창단처럼 오순도순하게 손을 맞잡고 본 것은 아니었고, 그렇다고 아무것도 몰랐던 그 녀석이 둘 사이에 앉아서 팝콘을 들고 있는데, 그녀와 내가 양 쪽에서 팝콘을 집으려고 손을 뻗다가, 그만 손을 잡아서 화면에서는 휴 그랜트와 마틴 맥커친이 사랑을 펼치고, 관객석에서는 우리가 미래에 움틀 사랑의 씨앗을 뿌려댔던 것도 아니었다. 우리 셋은 마치 합심이라도 한 듯이 ‘도대체 이 영화가 뭐야’라는 심드렁한 기색과 시간이나 때우자는 심산으로 상영관 안에 들어갔는데, 그때부터 비과학적인 마법이 시작됐다.
영화가 시작되자마자 등장인물들은 ‘크리스 마스니까요’라는 대사로, 성탄에는 무슨 짓을 해도 용서가 된다는 듯 우리의 등을 감상적 세계로 떠밀었고, 빌 나이는 아무리 생각해도 마법과 다름없는
그리고 약 두 시간이 지난 후 극장 밖으로 나오니, 세상은 아름다워져 있었다. 이전에 보이던 추운 세상은 어느덧 훈훈하게 데워진 내 심리적 온도의 상승효과로 인해 따스하게 보이기 시작했고, 한 생물학적 여성과 함께 영화를 보고 나온 두 남자 동물은 한 여성을 다른 시선으로 보기 시작했다(물론, 나는 그 전부터 좀 더 애틋한 시선으로 보고 있었으나, 확실히 러브 액추얼리가 기폭제 역할을 했다). 그리고 역사는 언제나 기록자의 윤색과 각색에 의해 재구성되듯, 필자의 기억에 의하면 그날 이후 그녀는 나를 선택해 우리는 성탄 이후에도, 세상을 구원하러온 아기 예수처럼 서로를 구원해주겠다는 듯 사랑을 실천했다. 생에서 즐거운 시간을 함께 보냈던 사람에게 그 모든 감정이 사실은 영화 한 편 때문이었다고 말하는 건 어불성설인 표현이지만, 영화가 그 감정을 북돋아주고 확인해주는 부채와 조명이었음은 부인할 수 없다. (이래서 누군가 성탄절에 보자고 그 이면에 깔린 심리학적, 인구학적 속셈을 파악해야하는 것이다. 영화 한 편으로 인구가 증가할 수도 있으니까).

하지만, 십 수년이 흐른 지금 나는 조금은 낭만주의자적인 입장에서 기억을 왜곡해서라도 이 역사적 사건을 기술하고 싶다. 이 역시 영화적으로 말하자면, 영화는 어쩌면 법적으로만 성인이었던, 그 어리고 여린 시간을 함께 했던 우리 사이에 존재했던 미장센에 지나지 않았을지도 모른다. 그때 내가 우스꽝스럽게 길에서 넘어지더라도, 혹은 그 친구가 한 겨울에 얼토당토 아니하게 바나나껍질을 밟아서 미끄러지더라도, 우리는 그 사건 이후에 서로를 다르게 봤을 지도 모른다. 이런 표현은 너무 흔하지만, <러브 액추얼리>의 대사를 빌리자면 ‘크리스마스 였으니까’.
영화도, 시기도, 찬바람도, 때로는 여린 청춘을 갑자기 무너지게 한다. 쉽사리 요동치거나, 무너지지 않는 지금 돌이켜 보니, 청춘은 어쩌면 아름답게 무너질 줄 아는 시기의 다른 이름 같다. 그래서 성탄이 올 때마다 해묵은 <러브 액추얼리>를 다시 보고 싶다.
[추천 기사]
- 우리별도 잘못하지 않았어, <안녕, 헤이즐>
- 한 번의 만개 <프랭크>
- 맘 속에 피어나는 작은 불씨 - <지골로 인 뉴욕>
- 뜻대로 되진 않았지만 - <앤 소 잇 고즈>
러브액츄얼리 (극장판)
출판사 | 블루

최민석(소설가)
단편소설 ‘시티투어버스를 탈취하라’로 제10회 창비신인소설상(2010년)을 받으며 등단했다. 장편소설 <능력자> 제36회 오늘의 작가상(2012년)을 수상했고, 에세이집 <청춘, 방황, 좌절, 그리고 눈물의 대서사시>를 썼다. 60ㆍ70년대 지방캠퍼스 록밴드 ‘시와 바람’에서 보컬로도 활동중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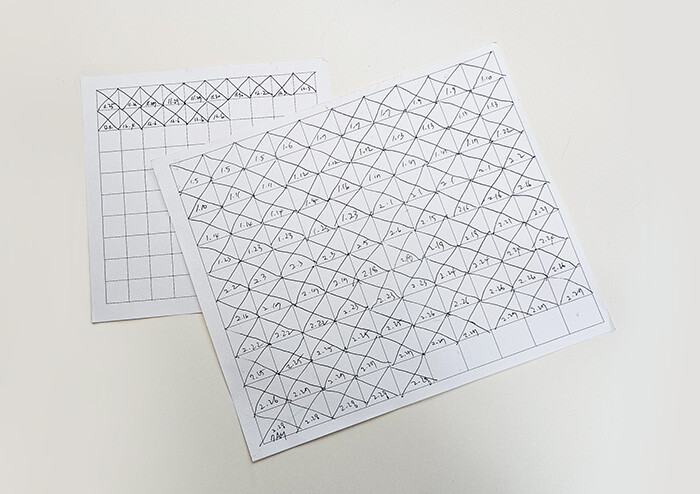

![[취미 발견 프로젝트] 독서하고 싶은 공간 만들기](https://image.yes24.com/images/chyes24/article/cover/2025/02/20250226-346177ac.png)
![[취미 발견 프로젝트] 잘 가 2024년, 어서 와 2025년!](https://image.yes24.com/images/chyes24/article/cover/2024/11/20241127-077b2057.jpg)



앙ㅋ
2015.01.15
보랏빛카우
2015.01.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