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트링과 밴드 합주 위에서 이별의 책임을 비겁하게 떠넘기는 '헤어지자 말해요'. 친숙한 기승전결을 취하면서도 본인만의 개성과 역량을 표출한 양질의 발라드를 거부할 이유가 없다. '오디션 우승자'란 칭호가 무색할 만큼 빛을 못 봤던 10년 차 뮤지션 박재정에게도 드디어 대표곡이 생겼다.
타이틀곡의 인기에 이끌려 앨범의 다음 페이지를 들췄다면 그의 기획 의도에 호되게 당한 뒤다. 혼자란 느낌이 들 때마다 노랫말을 붙였다 밝힌 <Alone>은 첫 곡 '헤어지자 말해요'를 지나친 이후부터 극한의 외로움으로 얼룩진다. 마음 편치 않은 이야기를 최대한 널리 퍼뜨리기 위해 대중 친화적 발라드가 관객을 끌어모으는 용도로 등장한 것.
감춰둔 연막 안은 한없이 적적하다. 피아노 한 대 아래 홀로 버텨온 옛 시간을 드리운 'Alone'부터 세상의 소리와 완전히 분리된 녹음실 한가운데에 놓인다. 있는 그대로의 감정 기록을 위해 악기는 최후방으로 밀어냈고, 기교 없는 중저음 가창이 남은 40여 분의 러닝타임을 깊숙이 타격한다.
쓸쓸함에 흠뻑 젖었음에도 호소하거나 울부짖지 않는다. 기악 구성을 절제한 인정과 체념의 화법은 직관적 제목의 트랙에서 도드라진다. 한 번 더 건반과 마주한 '망가진 내 자신을 보면서'는 사랑이란 흔한 감정조차 조심스레 내비쳐야 하는 현실을 덤덤히 고백하고, 느리게 기타를 튕기는 엔딩곡 '슬픔이 나를 지배할 때'는 자책으로 갉아먹은 지난날에 대해 숨소리가 들릴 정도로 후회와 단념 사이를 속삭인다.
연이은 우울의 잠식에 비관적 단상도 떠오르나 이를 차단하기 위한 음악적 묘수로 재즈를 내세운다. 진정한 쉼터가 되어야 할 '집'에서마저 느낀 불편은 아늑한 피아노 선율로 애써 포장했고, 병환으로 생을 마감한 조부에게 '표현하지 못했던 아쉬움'은 선선한 리듬감의 베이스와 가녀린 백 보컬을 만나 입체적인 그리움으로 피어났다.
완성도 높은 재즈는 '일상'에서 정점을 찍는다. 플루트, 현악 4중주, 기타, 피아노가 균형을 이루는 고풍스러운 악곡은 나른한 멜로디를 되풀이하다 코러스와 같이 화음을 쌓아가며 영원한 반복에 대한 회의를 아련히 풀어낸다. 이전까지 발표한 자작곡이 '가사'와 '4년' 단 두 곡뿐이라 어쩌면 모르고 지나쳤을, 싱어송라이터 박재정의 작곡 감각에 내공이 깃들었음을 직감할 수 있다.
외로이 지새운 나날에도 멈추지 않고 성장할 수 있던 건 음악과 함께 곁을 지킨 오랜 친구들 덕이다. 피아니스트 박현중은 브라질리안 재즈를 대표하는 뮤지션 엘리안느 엘리아스의 실황 연주자까지 드럼 세션으로 초빙할 정도로 편곡과 녹음에 심혈을 기울였고, 박재정과 협업 경험이 있는 알앤비 듀오 콧(cott)의 김형표는 상호 간 음악적 신뢰를 바탕으로 견고한 사운드를 구축하는 데 힘을 보탰다.
결국 고립이 아닌 자립. 과거의 나와는 작별을 고하고 새로운 나에겐 행복과 사랑을 찾길 바라는 '끝인사' 속 열여섯 번의 '안녕', 일순간 뻗치는 허탈한 몇 마디에 무수한 해방감이 밀려온다. 잔잔히 철썩이던 고독의 파도가 스스로를 침식했지만, 깎여 나가고 퇴적되길 거듭한 자리엔 강건한 세월의 지층이 쌓였다. 당장 그 가치를 입증하는 건 중요치 않다. 시간은 언제나 그의 편에 서 있다.
추천기사
‘대한민국 No.1 문화웹진’ 예스24 채널예스

이즘
이즘(www.izm.co.kr)은 음악 평론가 임진모를 주축으로 운영되는 대중음악 웹진이다. 2001년 8월에 오픈한 이래로 매주 가요, 팝, 영화음악에 대한 리뷰를 게재해 오고 있다. 초기에는 한국의 ‘올뮤직가이드’를 목표로 데이터베이스 구축에 힘썼으나 지금은 인터뷰와 리뷰 중심의 웹진에 비중을 두고 있다. 풍부한 자료가 구비된 음악 라이브러리와 필자 개개인의 관점이 살아 있는 비평 사이트를 동시에 추구하고 있다.













![[서점 직원의 월말정산] 7월의 즐길거리를 소개합니다](https://image.yes24.com/images/chyes24/article/cover/2025/07/20250731-ea87383d.jpg)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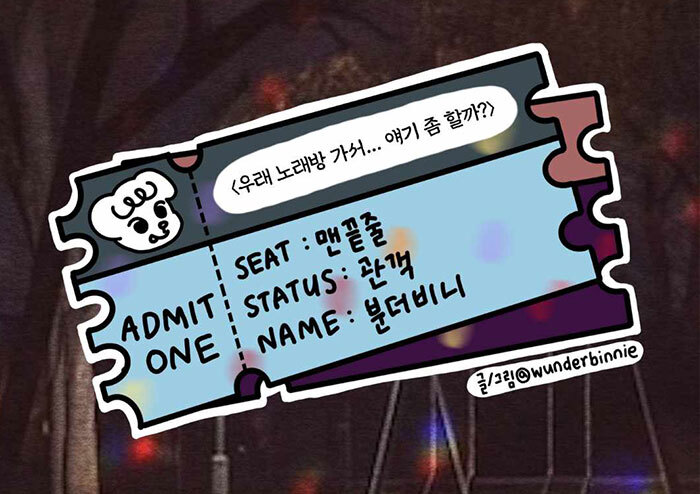
![[더뮤지컬] "구슬이 서로 부딪치듯" 애정 가득한 뮤지컬 <원스> 연습 현장](https://image.yes24.com/images/chyes24/article/cover/2025/02/20250218-c8e7ce4e.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