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어가 한국어와 다르다는 것을 잘 보여주는 사례 중 하나가 free의 용법이다. 우리에게 free는 ‘스스로 말미암다’는 뜻을 가진 ‘자유’라는 말로 받아들여진다. 한국어로 ‘외부적인 구속이나 무엇에 얽매이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상태’를 이르는 말이 ‘자유’다. ‘자유’는 다분히 우리 입장에서 정치적인 뉘앙스를 풍긴다. 그 이유는 뭘까. 아마도 이 개념 자체가 외부에서 들어왔기 때문이 아닐까.
영어에서 ‘자유’를 의미하는 말로는 Freedom과 liberty가 있다. 자유의 여신상이 The Statue of Freedom이 아니라 The Statue of Liberty라는 사실에서 둘의 차이를 짐작할 수 있을 것이다. 보통 freedom이 원래부터 타고난 자유의 상태를 뜻한다면, liberty는 정치적으로 획득한 자유를 의미한다는 것이 정설이다. 그런데 free라는 말에는 우리가 잘 모르는 의미가 하나 숨어 있다. 바로 ‘사랑하다’라는 뜻이다. 물론 동사로 쓰일 때 그렇다. 그렇게 생각해도 free와 love라니 뭔가 어울리지 않는 느낌이다.

Free는 freogan이라는 말에서 기인했다. ‘해방시키다’는 뜻으로 무엇인가를 풀어주는 것을 표현하던 말이었다. 그런데 이 말이 왜 ‘사랑하다’라는 의미이기도 했을까. 흥미로운 것은 이 말에 ‘즐거움’이라는 함의도 있었다는 사실이다. 사랑하는 것은 즐거운 일이니 자유와 쾌락이 서로 연결되지 말란 법은 없다. 이런 추측 말고 다른 연결고리도 있을 듯하다. Free라는 말을 풀어보면 ‘사랑하다’ 뿐만 아니라 ‘명예롭게 하다’라는 뜻도 있다. ‘명예(honor)’라는 말은 그렇게 받아들인다는 의미다. 그래서 honor을 동사로 쓸 경우에 ‘계산서를 승인한다’는 뜻을 가지기도 한다.
Honor이란 무엇보다도 널리 알려지는 것이다. 따라서 누군가 그 사람을 알아주는 것 자체가 ‘명예’다. 이런 의미에 근거해서 다시 free로 돌아가보면, 왜 ‘사랑’이 여기에 끼어드는지 알 수 있다. ‘사랑하다’는 사랑에 취해 어떤 대상을 흠뻑 바라본다는 의미다. 그러려면 그 대상을 알아보고 인정해야한다. ‘승인’이 전제되어야 비로소 상대를 받아들일 수 있다. 따라서 무엇인가를 자유롭게 만든다(to make free)는 것, 다시 말해서 ‘해방시킨다’는 것은 그 대상을 전적으로 ‘승인’함을 뜻한다.
이처럼 free는 상대방을 온전히 인정하는 상태를 지칭한다. 물론 free에 담겨 있는 사랑의 의미는 남녀 간에 이루어지는 감정만을 뜻하는 것은 아니다. 신의 사랑으로부터 형제애까지 모두 포괄하는데 무엇보다도 ‘남자들끼리 사랑’ 즉 우애(friendship)를 가리킨다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중세까지만 해도 사랑은 보통 친구를 향한 감정이었다. 누구를 사랑으로 대한다는 것은 곧 우애를 의미했다. 이 우애의 본질은 상대를 사랑하는 것, 다시 말해서 사귈 수 있는 능력이자 자질이다.
고대 그리스에서 사랑은 철학이기도 했다. 사랑-이야기(philo-sophia)가 바로 철학이었다. 이 문제를 다룬 책이 바로 플라톤의 『향연』이다. 『향연』은 eros, 말하자면 사랑의 문제를 놓고 소크라테스와 그의 친구들이 나눈 대화에 대한 기록이다. 액자소설처럼 이야기를 전달하면서 대화하는 구성이 돋보이는 작품으로 유명하다. 이 책에서 소크라테스는 사랑의 문제를 아름다움의 문제와 연결시킨다. 앞서 말했던 free와 ‘즐거움’의 관계가 여기에서 드러나는데, 자신의 입장을 디오티마에 대한 이야기를 통해 은근히 드러내면서 소크라테스는 사랑에 대한 자신의 견해를 밝힌다.
이 일을 향해 올바르게 가려는 자는 젊을 때 아름다운 몸들을 향해 가는 것으로 시작해야 합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이끄는 자가 올바로 이끌 경우 그는 하나의 몸을 사랑하고 그것 안에 아름다운 이야기들을 낳아야 합니다. 그 다음에 그는 어느 한 몸에 속한 아름다움이 다른 몸에 속한 아름다움과 형제지간임을 깨달아야 하며, 종적인 아름다움을 추구해야 한다고 할 때, 모든 몸들에 속한 아름다움이 하나요 같은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는 것이 아주 어리석은 일임을 깨달아야 합니다. 이걸 파악하고 나면 모든 아름다운 몸들을 사랑하는 자가 되어 하나의 몸에 대한 이 열정을 무시하고 사소하다 여김으로써 느슨하게 만들어야 합니다.
그 다음에 그는 몸에 있는 아름다움보다 영혼들에 있는 아름다움이 더 귀중하다고 여겨야 합니다. 그래서 누군가가 미미한 아름다움의 꽃을 갖고 있더라도 영혼이 훌륭하다면 그에게는 충분하며, 이 자를 사랑하고 신경 써 주며 젊은이들을 더 훌륭한 자로 만들어줄 그런 이야기들을 산출하고 추구해야 합니다. 그렇게 하면 이번에는 그가 행실들과 법들에 있는 아름다움을 바라보도록, 그리고 그것 자체가 온통 그것 자체와 동류라는 것을 보도록 강제될 것이고 그럼으로써 몸에 관련된 아름다움이 사소한 어떤 것이라고 여기게 될 것입니다. 이끄는 자는 그를 행실들 다음으로 앎들로 이끌어야 합니다. 그렇게 하면 그가 이번에는 앎들의 아름다움을 볼 수 있게 되고, 또한 이제는 아름다움 여럿을 쳐다보고 있기에, 더 이상 어리디 어린 소년이나 특정 인간이나 하나의 행실의 아름다움에 흡족하여 종처럼 하나에게 있는 아름다움에 노예 노릇 하면서 보잘 것 없고 하찮은 자가 되지 않습니다. ( 플라톤 『향연』 142~143 쪽 )
소크라테스의 진술에서 사랑과 자유는 앎을 매개로 서로 이어진다. 처음에 사랑은 아름다운 몸에서 시작된다. 그 다음에 사랑은 몸의 아름다움을 넘어서 영혼의 아름다움을 귀중하게 여기는 단계로 나아간다. 그러나 영혼의 아름다움을 사랑하면 행실과 법을 준수하는 ‘훌륭함’으로 나아간다. 그러나 여기에서 멈춘다면 사랑은 도덕의 문제에 갇혀버릴 것이다. 사랑은 이런 행실과 법을 넘어서서 앎의 아름다움에 대한 추구에 이른다. 행실과 법이 강제적인 것이라면, 앎은 ‘스스로 말미암는 것’에 근거한다. 이 앎의 아름다움이야말로 “종처럼 하나에게 있는 아름다움에 노예 노릇”을 하지 않고 자유롭게 개인으로 존립할 수 있게 만드는 힘이다. 고대 그리스인은 아름다움을 ‘즐거움’의 문제로 보았다. 아름다운 것을 보면 즐겁다는 사실을 환기해보자. 이렇게 하나에 종속하지 않고 독자적으로 아름다운 것을 즐길 수 있는 상태야말로 진정한 자유다.
영어에서 free가 사랑의 의미를 내포하고 있는 것은 바로 이런 소크라테스의 가르침 때문이다. Free는 묶여 있지 않은 상태이자 사랑의 아름다움을 통해 혼자 살아갈 수 있는 앎을 깨달은 상태다. Free will은 이런 상태를 지속시키기 위한 능력(virtue)이다. 이 능력을 배양하기 위한 여러 가지 배움의 과정을 liberal arts라고 불렀다. Free man이 되기 위해 공부해야하는 일곱 가지 학문이 바로 liberal arts다. 일곱 가지 학문은 trivium에 속하는 문법, 논리, 수사학과 quadrivium에 속하는 산술, 기하학, 음악, 천문학이었다. 여기에서 liberal이란 이기적이지 않다는 뜻이다. 따라서 liberal arts는 실용적인 목적을 가지지 않고 앎의 아름다움에 매료되어 자유롭게 공부하는 학문을 의미했다.
누군가 우리에게 “Are you free?”라고 한다면 이는 “지금 나를 도와줄 수 있니?”하고 물어보는 것이다. 상대를 도와주기 위해 필요한 것은 이기적이지 않은 태도다. Free는 흔쾌히 남을 도와줄 수 있는 상태 또는 능력을 암시한다. 또한 “Feel free to talk to me”라는 표현은 필요하면 언제든지 나에게 말을 걸어도 좋다는 뜻이다. 듣는 입장에서 이런 말을 해주는 이는 정말 훌륭한 ‘친구’이자 ‘연인’이다. 상대에 대한 사랑이 없다면 쉽게 할 수 없는 말이다. 물론 시간이 지나면서 이런 표현들이 가식적이고 의례적으로 바뀌었다는 사실을 무시할 수는 없다. 근대는 중세와 다르다. 중세에는 사랑을 지키기 위해 죽는 것을 honorable하게 생각했지만, 요즘은 대체로 ‘철없다’고 받아들여진다. 그만큼 세상은 변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근대 이후의 삶은 과거에 본질적이었던 것을 탈맥락화하고 탈신비화해서 합리적인 판단의 대상으로 만들어놓았다. 그 결과 우리는 ‘과학적 사고’라는 안전한 삶의 방식을 획득했지만, 그로 인해서 잃어버린 것들에 대한 막연한 향수도 함께 지니게 되었다. 그렇다고 근대 이전의 삶이 마냥 행복하거나 아름다웠던 것은 아니다. 이 모든 것은 우리가 근대 이후를 살고 있기 때문에 ‘자연스러운 것’으로 받아들여지고 있을 뿐이다. Freedom은 앎의 아름다움에서 공동선(common good)을 발견하게 만든다. 자유로운 개인들로 이루어진 아름다운 세계, 결과야 어떻든 근대의 이상은 바로 이 원리를 실현하고자 했던 거대한 기획이었다.

- 행연 플라톤 저/강철웅 역 | EJB(이제이북스)
주연(酒宴)이 마련된 장소를 배경으로, 술을 섞어 사랑 이야기를 들려주는 플라톤의 통찰력이 빛을 발하는 작품이다.
[추천 기사]
- Dutch pay의 진실
- Moralist는 그렇게 착하지 않다
-강풀 “아빠가 읽을 만한 그림책이 없어 그렸죠”
-욱하는 것도 습관이다
-Ale과 영국의 애국주의

이택광
미술, 영화, 대중문화 관련 글을 쓰고 있는 작가. 경희대학교 글로벌커뮤니케이션학부 영미문화전공 교수로 재직하면서 문화평론가로 활동하고 있다. 경북에서 태어나 부산에서 자란 그는 어릴 적에 자신을 안드로메다에서 온 외계인이라고 생각했다고 한다. 그래서 지구환경에 한동안 적응하지 못했으며 우주여행을 떠나는 그림을 그려서 꽤 큰상을 받기도 했다고 추억한다. 그는 자신의 모토를 "그림의 잉여를 드러내는 글쓰기" 라고 밝히며 글쓰기는 그림 그리기의 대리물이라고 생각하기에 그림에 대한 글을 계속 쓸 생각이라고 포부를 이야기한다. 이러한 글쓰기에 대한 생각을 바탕으로 1999년, 영화주간지 <씨네 21>에 글을 발표하며서 본격적인 문화비평을 시작한 이후, 다양한 저서를 통해 독자들과 만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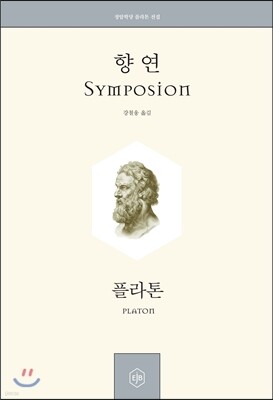



감귤
2014.08.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