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경의 도발은 더 유연해지고 우아해졌다
유연하며, 우아한 취향의 소유자. 십 년 전에는 정체를 알 수 없는 고양이과 동물이라고 생각했는데, 밀림의 암사자처럼 그새 진화한 것이다. 정작 자신은 고양이가 아니라 강아지 타입이라고 말하지만. 그리고, 이 책은 남편에 대한 열렬한 러브레터이기도 하다.
2013.05.03
이십대 초반에 많은 책을 읽었다. 대학 초년생이 다들 그러듯이, 니체나 헤겔 같은 걸 읽으면서 지성을 단련하면 좋았겠지만, 많은 책을 읽는다는 것은 나에게 물론 그 자체로 즐거움이기도 했거니와 장사 수단을 갈고 닦기 위한 시장 연구이기도 했다. 잡문이 돈이 된다는 걸 알았을 때, 그래봤자 푼돈이지만, 어쨌든 나는 잡문을 팔기 위해 많은 에세이를 숙독했다. 대부분은 ‘샘터’나 ‘좋은생각’ 스타일이었고, 나머지는 ‘네가 지금 그 모양 그 꼴로 사는 건 모조리 너 때문이다!’ 라고 외치는 자기계발서들이었다. 그래서 그 중에서 김경은 특별할 수밖에 없었다. 그런 연유로 하왕십리 반지하에서 살던 스물 한두살 때 나는 자주 김경을 읽었는데, 『뷰티풀 몬스터』 『김훈은 김훈이고 싸이는 싸이다』등이 연달아 출간되던 시점이다.
중앙대 앞 서점에서 『뷰티풀 몬스터』의 ‘섹시한’ 북 디자인과 내지 디자인을 보고 선망과 동경과 질투, 그런 게 뒤섞인 감정으로 가슴이 두근거렸던 기억이 생생하다. 물론 나도 십 대때 책을 한 권 낸 적이 있지만 고등학교 때려친 이야기로 평생 사골처럼 우려먹을 수는 없는 거니까, 나는 자라고 싶었다. 이를테면 김경숙에서 ‘숙’ 하나를 떼어버리고 요염한 고양이과 동물처럼 매끈하면서도 야성적인 글을 쓰는 그녀처럼. 그 무렵 자주 읽던 《한겨레21》에서도 자주 김경의 글을 찾아 읽었는데, 요즘 미니스커트가 유행이라 허벅지 두꺼운 여자애들도 입고 다닌다, 라는 한탄 내지는 세태 비평 같은 글줄을 읽고 허벅지 두꺼운 여자애로서 매우 섭섭했던 기억도 생생하다.

『나는 항상 패배자에게 끌린다』 출간한 김경
한마디로 그녀는 ‘어른 여자’였다. 그리고 글 쓰는 여자 중에 드문 ‘섹시한 여자’였다. 요즘 정혜윤 PD나 칼럼니스트 임경선 씨 같은 분들이 가세해서 물이 굉장히 좋아지긴 했지만, 어쨌든 섹시한 여자가 원색적 도발이 아니라 ‘지루한 세상에 불타는 구두를 던지듯’ 농담같으면서도 지적인 도발을 던지는 글을 쓰고 자주 분노하는 그 자체가 ‘어른 여자’처럼 느껴졌다. 아마도 그 불타는 구두는 새빨간 새틴의 스틸레토 킬힐이었을 것이다. 요즘 뜨는 낸시 랭을 ‘발견’한 것도 김경이지 않은가. 게다가 자신이 피처 기자로 일하는 패션지 《바자》에서 “우리는 정치를 모르고 당신은 패션을 모르니 우리 한 번 만나봅시다”라고 고 노무현 대통령을 다룬 피처 기사의 신선함이라니, 이후 남성 패션지에서 일하는 기자 친구에게 그런 기획을 제안했지만 ‘너무 위험해서’ 거절당했다. 하지만 김경이라는 서른 셋의 어른 여자는 이런 위험한 짓을 마구 하고, 교도소에서 오는 팬레터를 잔뜩 받으면서도 밤길 무서운 줄 모르고 마감을 마치고 술을 마시고 연애를 하고 춤을 추는 그런 여자였던 것이다.
그러면서 몇 년간, 어쩌다 그 김경으로부터 메일을 받았는데 원고 청탁이었다. 그냥 매우 덤덤하게 거래가 이루어졌고 별 일 없이 살다가 『셰익스피어 베케이션』을 읽었다. 그리고 평생 한 번도 해 본 적이 없는 짓을 했는데 그건 어떤 책을 읽고 저자에게 이메일을 보낸 것이다. 나에게 간혹 이메일을 보내주는 독자들을 보면 정말로 미안하고 황송한 마음이 든다. 나로서는 책장을 덮는 순간 저자와의 만남이 완결되는 것이어서, 이메일이라는 형태로 뒷이야기를 기대하는 독자들의 사랑은 굉장히 대단하게 여겨진다. 긴 내용은 아니었지만 그 ‘거래’시 전달받은 이메일 주소로 몇 줄 썼다. 저는 여행을 좋아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여행기는 더욱 좋아하지 않지요. 하지만 당신의 여행은 주사위같은 내 방에 앉아 읽어도 마치 함께 여행을 떠난 것 같은 기분이 드는군요. 즐거운 여행이었습니다. 뭐 이런 내용이었던 것 같다. 이런 종류의 이메일을 보내지 않으므로 답신도 기대하지 않았는데, 몇 달 있다가 메일을 늦게 확인했다, 고맙다, 라는 메일이 왔다. 회사 주소 메일이건만 확인을 안했다니 무슨! 이라고 1초 정도 생각했지만 이후 어쩌다 보니 《보그》의 탁월한 피처 기자였고 『영애씨, 문제는 남자가 아니야』를 쓴 김윤경 씨가 다리가 되어 만나게 되었고, 나는 그녀를 사랑하게 되었다.
나는 늘 기자, 그것도 피처 기자라는 사람들을 늘 존경해 왔는데 그들은 정말로 호기심이 많다. 나는 사실 안 만날 수 있다면 평생 아무도 안 만나고 뒹굴며 책만 읽어도 좋을 사람이다. 그러나 피처 기자들은 기본적으로 인생에 대한 호기심, 사람에 대한 애정과 궁금증이 많은 사람들이며 김윤경이나 김경은 그 농도가 매우 짙다. 고양이과 동물같다고 앞서 썼지만 5개월 된 강아지처럼 눈을 반짝이며 그거 너~(3초 정도 길게 끌어야 한다)무 재밌겠다! 라고 말하는 그 열정은 1년의 3개월 정도를 뜨겁게 사느라 나머지는 변온동물 같은 내가 따라가기 힘든 온도였다. 이번 신간 『나는 항상 패배자에게 끌린다』를 읽고 또 잘 하지 않는 짓을 했다. 책에 뭔가를 적는 것. 한참 읽으면서 뭘 적고 나서 한 번 더 읽으려고 보니 bic 볼펜으로 이런 게 적혀 있었다. bic볼펜으로 이렇게 ‘나쁜 취향은 취향이 없는 것보다는 낫다. 그러나 더 나쁜 것은 주입된 ‘습관‘을 제 취향으로 착각하는 것이다. 그런 의심 없는 믿음은 취향이 없는 것보다 더욱 악덕이다.’ 걷기 예찬에 대해서도 써 있다. ‘언니, 어떤 시인이, 이름은 까먹었는데 시상을 어떻게 떠올리냐는 질문에 이런 말을 했어요. 산책할 때 천사들이 귓가에 속삭인다고.’ 내 이름이 나오는 페이지를 보고 깜짝 놀랐지만 솔직하게 썼다. ‘사람을 사랑스럽게 보려고 하는 당신의 사랑 때문에 나를 사랑스럽게 봐 주셨을 뿐.’
마지막 장에는 이렇게 써 있다. ‘김경의 도발은 더 유연해지고 우아해졌다.’ 그 말이 이 책에 딱 어울린다. 유연하며, 우아한 취향의 소유자. 십 년 전에는 정체를 알 수 없는 고양이과 동물이라고 생각했는데, 밀림의 암사자처럼 그새 진화한 것이다. 정작 자신은 고양이가 아니라 강아지 타입이라고 말하지만. 그리고, 이 책은 남편에 대한 열렬한 러브레터이기도 하다. 유치한 걸 다 알면서도 넣었을 것이다. 패티 스미스를 좋아하세요? 같은 게 낯간지러운 줄 알면서도. 나는 최근 사랑이란 걸 잠시 의심했지만, 이 책을 덮고 다시 믿게 되었다. 그런 게 정말 있긴 있다고. 비록 내 것은 아닐지라도, 바라보는 것만으로 충만한 그것.
중앙대 앞 서점에서 『뷰티풀 몬스터』의 ‘섹시한’ 북 디자인과 내지 디자인을 보고 선망과 동경과 질투, 그런 게 뒤섞인 감정으로 가슴이 두근거렸던 기억이 생생하다. 물론 나도 십 대때 책을 한 권 낸 적이 있지만 고등학교 때려친 이야기로 평생 사골처럼 우려먹을 수는 없는 거니까, 나는 자라고 싶었다. 이를테면 김경숙에서 ‘숙’ 하나를 떼어버리고 요염한 고양이과 동물처럼 매끈하면서도 야성적인 글을 쓰는 그녀처럼. 그 무렵 자주 읽던 《한겨레21》에서도 자주 김경의 글을 찾아 읽었는데, 요즘 미니스커트가 유행이라 허벅지 두꺼운 여자애들도 입고 다닌다, 라는 한탄 내지는 세태 비평 같은 글줄을 읽고 허벅지 두꺼운 여자애로서 매우 섭섭했던 기억도 생생하다.

『나는 항상 패배자에게 끌린다』 출간한 김경
한마디로 그녀는 ‘어른 여자’였다. 그리고 글 쓰는 여자 중에 드문 ‘섹시한 여자’였다. 요즘 정혜윤 PD나 칼럼니스트 임경선 씨 같은 분들이 가세해서 물이 굉장히 좋아지긴 했지만, 어쨌든 섹시한 여자가 원색적 도발이 아니라 ‘지루한 세상에 불타는 구두를 던지듯’ 농담같으면서도 지적인 도발을 던지는 글을 쓰고 자주 분노하는 그 자체가 ‘어른 여자’처럼 느껴졌다. 아마도 그 불타는 구두는 새빨간 새틴의 스틸레토 킬힐이었을 것이다. 요즘 뜨는 낸시 랭을 ‘발견’한 것도 김경이지 않은가. 게다가 자신이 피처 기자로 일하는 패션지 《바자》에서 “우리는 정치를 모르고 당신은 패션을 모르니 우리 한 번 만나봅시다”라고 고 노무현 대통령을 다룬 피처 기사의 신선함이라니, 이후 남성 패션지에서 일하는 기자 친구에게 그런 기획을 제안했지만 ‘너무 위험해서’ 거절당했다. 하지만 김경이라는 서른 셋의 어른 여자는 이런 위험한 짓을 마구 하고, 교도소에서 오는 팬레터를 잔뜩 받으면서도 밤길 무서운 줄 모르고 마감을 마치고 술을 마시고 연애를 하고 춤을 추는 그런 여자였던 것이다.
그러면서 몇 년간, 어쩌다 그 김경으로부터 메일을 받았는데 원고 청탁이었다. 그냥 매우 덤덤하게 거래가 이루어졌고 별 일 없이 살다가 『셰익스피어 베케이션』을 읽었다. 그리고 평생 한 번도 해 본 적이 없는 짓을 했는데 그건 어떤 책을 읽고 저자에게 이메일을 보낸 것이다. 나에게 간혹 이메일을 보내주는 독자들을 보면 정말로 미안하고 황송한 마음이 든다. 나로서는 책장을 덮는 순간 저자와의 만남이 완결되는 것이어서, 이메일이라는 형태로 뒷이야기를 기대하는 독자들의 사랑은 굉장히 대단하게 여겨진다. 긴 내용은 아니었지만 그 ‘거래’시 전달받은 이메일 주소로 몇 줄 썼다. 저는 여행을 좋아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여행기는 더욱 좋아하지 않지요. 하지만 당신의 여행은 주사위같은 내 방에 앉아 읽어도 마치 함께 여행을 떠난 것 같은 기분이 드는군요. 즐거운 여행이었습니다. 뭐 이런 내용이었던 것 같다. 이런 종류의 이메일을 보내지 않으므로 답신도 기대하지 않았는데, 몇 달 있다가 메일을 늦게 확인했다, 고맙다, 라는 메일이 왔다. 회사 주소 메일이건만 확인을 안했다니 무슨! 이라고 1초 정도 생각했지만 이후 어쩌다 보니 《보그》의 탁월한 피처 기자였고 『영애씨, 문제는 남자가 아니야』를 쓴 김윤경 씨가 다리가 되어 만나게 되었고, 나는 그녀를 사랑하게 되었다.
 |
마지막 장에는 이렇게 써 있다. ‘김경의 도발은 더 유연해지고 우아해졌다.’ 그 말이 이 책에 딱 어울린다. 유연하며, 우아한 취향의 소유자. 십 년 전에는 정체를 알 수 없는 고양이과 동물이라고 생각했는데, 밀림의 암사자처럼 그새 진화한 것이다. 정작 자신은 고양이가 아니라 강아지 타입이라고 말하지만. 그리고, 이 책은 남편에 대한 열렬한 러브레터이기도 하다. 유치한 걸 다 알면서도 넣었을 것이다. 패티 스미스를 좋아하세요? 같은 게 낯간지러운 줄 알면서도. 나는 최근 사랑이란 걸 잠시 의심했지만, 이 책을 덮고 다시 믿게 되었다. 그런 게 정말 있긴 있다고. 비록 내 것은 아닐지라도, 바라보는 것만으로 충만한 그것.


- 나는 항상 패배자에게 끌린다 김경 저 | 달
사랑, 패션, 라이프스타일, 인물, 사회 등 우리 삶의 깊숙한 면면을 훑어 취향의 넓은 스펙트럼을 펼쳐 보이는 이 책은 “우리가 진실로 무엇을 좋아하고, 누구를 사랑하는지 알게 된다면 인생이 무슨 대단한 보물찾기 같은 것이 될 수 있다”는 걸 저자 자신이 자기 영혼을 걸고 사랑했던 것들에 대한 모든 경험담과 사유를 불러들여 그야말로 살아온 생애로 증명한다. 무엇보다 한 존재가 다른 한 존재를 끌어당기는 놀라운 인력, 세상의 수많은 영혼 중 아무 계산도 없이 즉흥적으로 한 영혼을 선택하게 하는 힘이 취향임을 인식한다면 세상이 다르게 보일 것이라고 전한다.
‘대한민국 No.1 문화웹진’ 예스24 채널예스
6개의 댓글
추천 기사
추천 상품
필자

김현진(칼럼니스트)
'개인적인 것이 정치적인 것'이라는 오래된 캐치프레이즈를 증명이라도 하듯 '88만 원 세대'이자 비주류인 자신의 계급과 사회구조적 모순과의 관계를 '특유의 삐딱한 건강함'으로 맛깔스럽게 풀어냈다 평가받으며 이십 대에서 칠십 대까지 폭넓은 독자들에게 사랑받는 에세이스트. 『네 멋대로 해라』, 『뜨겁게 안녕』, 『누구의 연인도 되지 마라』, 『그래도 언니는 간다』, 『불량 소녀 백서』 등을 썼다.






![[더뮤지컬] <외쳐, 조선!> 박정혁, 30퍼센트의 성장](https://image.yes24.com/images/chyes24/article/cover/2025/08/20250805-af51576f.jpg)
![[젊은 작가 특집] 고선경 “인공지능과 연애하는 인물을 그려 보고 싶어요”](https://image.yes24.com/images/chyes24/article/cover/2025/06/20250617-c4941e46.png)
![[더뮤지컬] 홍성원, 오래도록 살아 숨쉬기 위해](https://image.yes24.com/images/chyes24/article/cover/2025/05/20250514-4121a0c0.jpg)
![[더뮤지컬] <애나엑스> 김도연, Trust Your Gut](https://image.yes24.com/images/chyes24/article/cover/2025/02/20250227-84a03876.jpg)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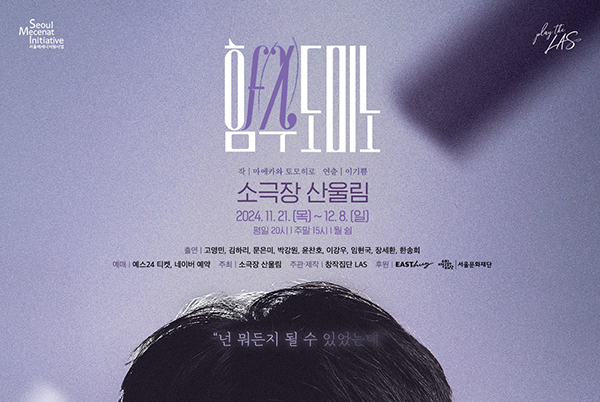







sind1318
2013.05.31
즌이
2013.05.31
gksmfm
2013.05.12
더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