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아버지는 아들들에게 왜 그리 인색하셨을까? - 연극 <봄날> 이대연
무대가 좋은 배우, 연극 <봄날>의 이대연
배우들에게는 역시 주5일 근무가 통하지 않는다. 2년 전에 했던 작품인데도 그들은 토요일까지 연습에 매진하고 있었다. 오현경, 이대연…
- 글 | 윤하정
|
이 희곡의 형식은 이중구조다. 그 하나는 극동아시아, 시베리아, 멀리는 우랄 산맥 너머까지 퍼져 있던 동녀풍속(童女風俗)을 중심으로 엮어가는 줄거리와, 다른 하나는 그 줄거리의 장면과 장면 사이에 봄에 대한 시.그림.영화.연주.산문.편지 등을 삽입함으로써, 그 두 가지의 구조가 서로 결합 또는 이완되도록 구성했다. 이것은 동녀풍속이 갖고 있는 설화적 요소를 좀 더 실제적으로 가깝게 표현하기 위해서이다.
극단 백수광부에서 보내온 대본의 첫머리 작가노트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다. 동녀풍속과 봄. 3월 31일부터 대학로예술극장 대극장 무대에 오를 연극 <봄날>의 키워드다. 여태 이 작품을 관람하지 못한 기자로서는 이대연 씨가 오현경 씨를 엎고 있는 포스터를 보고 있자니, 몇 년째 잘 나가는 모녀관계를 다룬 연극의 연장인가 싶었다. 그런데 ‘동녀풍속’과 ‘봄’이 키워드란다. 도대체 어떤 작품일까? 토요일 한낮 노량진역 근처에서 이대연 씨를 직접 만나보았다.
“일요일만 쉽니다(웃음). 한 번 했던 작품이라 아무래도 처음 하는 것보다는 수월하죠. 앙코르 공연에서도 새로운 걸 더 찾으면 좋겠지만, 이미 찾아갔던 길이 있어서 생각만큼 쉽지는 않아요.”
배우들에게는 역시 주5일 근무가 통하지 않는다. 2년 전에 했던 작품인데도 그들은 토요일까지 연습에 매진하고 있었다. 오현경, 이대연… 내로라할 배우들이 같은 공연에 다시 참여하는 이유는 작품성으로밖에 설명할 수 없다.
“재작년 공연했을 때 무척 아름다웠고 좋았던 기억이 있어요. 무엇보다 오현경 선생님에 대한 존경과 연출하는 이성열 선배에 대한 믿음이 있고요. 두 분 모두 대학 연극반 선배들입니다(웃음). 당시에도 많은 분들은 ‘<봄날>은 오현경을 위한 공연이다’라고 말했어요. ‘노배우가 무대 위에서 저렇게 아름다울 수 있구나’ 감동했었죠.”
1984년 초연된 <봄날>은 2009년 공연 당시 ‘서울연극제’ 연출상과 ‘대한민국 연극대상’ 연기대상(오현경) 등을 휩쓸었다. 그러나 단순한 ‘아버지와 아들’ 얘기는 아니다.
“부모 자식 간의 현실적인 이야기는 아닙니다. ‘동녀풍속’이라는 설화를 통해서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서사적인 작품이에요. 마지막에 그런 대사가 있습니다. ‘그 봄날에 아버지는 왜 그렇게 인색했는지, 우리 자식들은 왜 그렇게 조급했는지…’ 아버지가 항상 주장하는 것도 ‘봄날은 짧다’는 거예요. 봄날의 조급증과 안타까움, 세대 순환의 이미지를 담고 있어요.”
아버지의 절대 권력, 여자아이를 안으면 회춘한다는 동녀풍속, 인생의 덧없음을 일깨우는 짧은 봄날. 무대에는 아버지와 동녀, 이름도 없는 장남, 차남, 삼남 등 7명의 아들이 등장한다. 연기하는 입장에서는 이런 작품이 훨씬 어렵지 않을까?
“아무래도 그렇죠. 하지만 이런 연기는 또 하는 재미가 있어요. 연출하는 성렬이 형이나 오현경 선생님이 틀을 잘 잡아주시고요. 요즘은 TV 드라마 같은 편안한 연극이 많은데, 연극적인 리얼리티가 그것만은 아니거든요. 희곡 쓰는 후배들에게도 하는 말인데, 사막을 얘기할 때 모래 한 알로 사막을 얘기할 수 있어야 연극적인 것이거든요. 사막에 모래 한 삽을 퍼놓고 낙타도 넣고 오아시스까지 보여주려면 그냥 카메라로 찍어야죠. 아무것도 없는 무대에서 환상을 보여주는 게 연극의 매력이라고 생각해요. <봄날>도 그런 작품이고요.”
이대연 씨가 <봄날>에서 맡은 역은 엄마를 대신하는 장남. 수많은 드라마와 영화에서 너무나 다른 모습을 보여 왔던 그이기에, 실제 어떤 캐릭터일지 궁금하다.
“연극 <아트>를 좋아하는데, 덕수와 비슷해요. 배우는 인물을 창조해야겠지만, 덕수는 제 안에 너무나 비슷한 부분이 많아서 억지로 만들 필요도 없고, 고민하는 시간도 짧았던 무척 편안한 인물이에요. 그래서인지 반응도 좋았고 상도 탔죠(웃음). <봄날>에서의 장남은 작가도 강조했을 만큼 모성애를 지닌 인물인데, 대체일 뿐 엄마가 될 수는 없죠. 어떤 식으로든 결핍을 메우려고 하지만, 한계가 있는 그런 역할의 상징이에요.”
그러고 보니 이대연 씨가 최근에 참여한 작품만 해도 드라마 <추노> <마이 프린세스>, 영화 <시라노:연애조작단> <평양성>, 연극 <늘근도둑이야기> 등 매체를 자유롭게 넘나들고 있다. 요즘 많은 배우들이 꿈꾸는 이상향 아니던가.?
“제가 복이 많은 거라고 생각합니다. 스스로도 황금비율이라고 생각하고 있어요(웃음). 연기에 있어서는 기본적으로 같은데, 매체마다 적응할 부분들은 다르죠. 드라마가 상황에 따른 순발력이나 편안한 연기가 필요하다면, 영화나 연극에서는 상대적으로 친밀함조차도 카리스마 같은 어떤 존재감을 기반으로 하니까요.”
이대연 씨는 대학 때부터 연극반 활동을 했고, 줄곧 무대를 지키고 있다. 들이는 공에 비해 경제적으로 열악한 무대에 계속 설 수 있는 원동력은 역시 관객과의 직접적인 만남이다.
“관객과 직접 만난다는 것이 정말 좋아요. 작품의 최종 해석자는 결국 관객인데, 최종 해석자를 온전히 배우로서 만날 수 있는 곳은 무대니까요. 또 연극은 연습하는 기간 많은 것을 고민하고 시도하면서 새로운 걸 찾아낼 때가 많아요. 그 쾌감이 대단합니다. 그렇게 얻은 건 잊어버리지도 않아요. 배우에게는 엄청난 자산이죠. 그래서 배우 입장에서 연극에서는 무언가를 얻게 되고, 방송이나 영화에서는 상대적으로 소모적일 때가 많아요.”
그는 후배들에게도 무대의 참맛을 알 때까지 좀 더 참아낼 것을 당부한다.
“연극을 통해 고양되는 것은 관객에 앞서 배우 자신이거든요. 연극은 얻을 게 많아요. 그 희열이나 기쁨, 쾌감을 느끼게 되면 무대를 떠날 수가 없습니다. 물론 힘든 점이 많지만, 그 맛을 보기 전에 무대를 떠나는 친구들을 보면 안타까워요.”
인터뷰를 끝내며 <봄날>을 준비하러 가는 이대연 씨의 모습은 유난히 포근했던 날씨처럼 산뜻했다.
“요맘때 딱 좋지 않나요? 봄날… 무대도 무척 동화적이고 아름다울 거예요. 참, 2009년 공연 첫 날 아버지가 돌아가셨어요. 그때 상주와 공연을 함께 했는데, 오현경 선생님을 엎고 ‘아버지’라고 부르기만 해도 눈물이 났던 기억이 있어요. 잊을 수 없는 공연이죠. 좋은 작품입니다.”
하고 싶은 일이 무엇인지 알고, 그것을 향해 의심 없이 달려가는 사람들. 짧은 봄날이 반복되는 덧없는 인생에서 참으로 복 많은 사람들이 아닐까 생각해봤다. 그 짧은 봄날에 아버지는 왜 그리 인색하셨고, 자식들은 왜 그렇게 조급했을까… 아버지와 이름도 없는 7명의 아들들이 펼치는 현실과 다소 동떨어진 무대. 그 안에서 삶을 들여다볼 수 있다면 관객 역시 무대의 참맛을 느끼는 게 아닐까?! 오현경 씨와 이대연 씨의 아름다운 연기가 벌써부터 기다려진다.


-
글 | 윤하정
"공연 보느라 영화 볼 시간이 없다.."는 공연 칼럼니스트, 문화전문기자. 저서로는 <지금 당신의 무대는 어디입니까?>, 공연 소개하는 여자 윤하정의 <공연을 보러 떠나는 유럽> , 공연 소개하는 여자 윤하정의 <축제를 즐기러 떠나는 유럽>, 공연 소개하는 여자 윤하정의 <예술이 좋아 떠나는 유럽> 이 있다.
PYCHYESWEB0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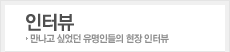

 5%
5%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