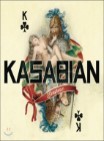영국 록계의 새로운 기대주! - 카사비안, 메리 제이 블라이지, 마이큐
이제는 완벽하게 애송이 티를 벗고 영국 록계를 대표하는 메인스트림 밴드로 떠오른 카사비안이 4집 음반을 내놓았습니다. 갈수록 발전하는 음악에 팬들 역시 열렬히 환호를 보내고 있습니다.
이제는 완벽하게 애송이 티를 벗고 영국 록계를 대표하는 메인스트림 밴드로 떠오른 카사비안이 4집 음반을 내놓았습니다. 갈수록 발전하는 음악에 팬들 역시 열렬히 환호를 보내고 있습니다. 한편 힙합 소울의 여왕, 메이 제이 블라이지도 신보를 내놓았고, 진중하게 음악을 하는 가수 마이큐도 4집 앨범을 발표했습니다.
카사비안(Kasabian) < Velociraptor! > (2011)
 |
그렇지만 팝씬의 주도권은 미국이 쥐고 있는 상황이고, 시류의 변화 역시 지속됐다. 1990년대 중반이후 데이먼 알반의 소위 ‘브릿팝 사망 선언’등을 통해 ‘영국색’의 음악들이 집중조명을 받기도 했다. 하지만, ‘나만 음악이다’라는 식의 비타협적인 태도는 결국 팬들의 비웃음을 샀고, 신인들의 범상치 않은 기미만 보이면 나오는 영국 음악지들의 호들갑도 그저 호들갑으로 그치는 경우가 많았다.
안타깝지만 ‘카사비안’에게는 아직 시장의 판을 뒤집을 힘은 없다. 나와는 다른 동료들을 애송이로 여기며, 헐뜯기 좋아하고 자기 자신만 아는 고집불통의 젊은이들에게서 그런 가능성이 보일 리 만무하게 여겨지기 때문이다. 하지만 3장의 정규작품을 통해 시간을 거듭할 수 록 비범한 음악성의 표출뿐만 아닌, 뛰어난 라이브 퍼포먼스로 이미 거대한 팬덤을 확보해 여름 록 페스티벌의 헤드라이너급 밴드 위치에 우뚝서있다. 이들의 음악이 그리 호락호락한 것이 아님을 말해주는 단서들이다.
시건방지고 교만한 태도는 독설계(?)의 선배 갤리거 형제를 닮아있고, ‘오아시스’ 이후 사라진 해묵은 계급성을 지니고 있다. 록팬들의 시각에서는 ‘우리가 만든 음악이 최고다. 듣기 싫으면 듣지마라.’라는 자세는 전례를 통해 친숙하다. 음악이 좋든 안 좋든 그저 밉지만은 않을 것이다. 물론 음악의 흡인력이 없었다면 그저 미운오리로 전락하며 어느 누구 하나 기억하지 않는 밴드로 단명했을 테지만.
네 번째 작품 < Velociraptor! >에서는 자신들을 네 마리씩 떼를 지어 사냥하는 포식공룡 벨로시랩터에 빗댄다. 자화자찬에서 시작된 공룡비유가 결국에 이번 작품의 앨범 타이틀으로 선택 된 것이다. 음악계의 레전드들을 언급하며 자신들을 동급으로 취급하는 자아도취는 물론이고 굵직하고 남성적인 매력 또한 여전하다. 첫 번째 곡 「Let's roll just like we used to」는 지난 작품 < West Ryder Pauper Lunatic Asylum >의 연장선상에 있다. 이어듣기를 해도 어색하지 않을 정도로 전작의 아방가르드적 기운을 잘 살려냈다.
|
앨범의 백미는 두 번째 트랙 「Days are forgotten」과 이어지는「Goodbye kiss」다. 힙합의 방법론을 차용했다고는 하지만 시작부터 끝까지 단하나의 리프로 승부를 보는 단순함은 완벽한 펑크록의 계승이다. 이어지는 달콤함은 반전이다. ‘우리도 때로는 부드러운 남자들이다’라는 듯 달달하고 화사한 기운은 그간 전해왔던 이미지와 상반되지만, 어떤 옷을 입어도 잘 어울리는 듯 자신만만한 감각이 돋보인다.
의도적인 싱어롱 장치를 탑재한 요소들이 곳곳에서 발견된다. 「Velociraptor!」에서의 빽빽한 기타 선율의 속도감 있는 곡 전개에서 틈틈이 새어나오는 보컬 톰 메이건(Tom Meighan)의 우렁찬 일갈은 「Club foot」과「Shoot the runner」의 공연장 풍경을 완벽하게 재현해 낸다. 「Re-wired」와 「Man of simple pleasures」는 카사비안 답지 않은 느긋함으로 긴장감을 완화시킨다. 예상외 ‘내려앉음’의 순간들 역시 간과해선 안 될 트랙들이다.
주류에 물들지 않으며 끊임없이 반란을 일으켜왔다. 이번 결과물 역시 팬들의 기대치에 반하지 않는 수작이다. 본연의 원시적 접근과 배타적인 관점은 여전히 변함없다. 이들의 끝없는 자신감은 정(正)이요, 타협 없는 편협함은 반(反)으로 작용할 수 있다. 하지만 그 결과는 창대한 합(合)임을 여실히 드러냈다. 이들의 미덕은 겸손이 아닌 오만함이다.
글 / 신현태 (rockershin@gmail.com)
메리 제이 블라이지(Mary J. Blige) < My Life II... The Journey Continues (Act 1) >(2011)
 |
「Feel inside」는 우울함과 괄괄함을 동시에 전하며, 7집 수록곡「Enough cryin」에서 처음 등장한 메리 제이 블라이지의 또 다른 자아인 래퍼 브룩 린(Brook Lynn)을 소환한 「Midnight drive」는 넘실거리는 힙합 리듬과 질펀하게 느껴지는 음성으로 중독성 있게 전달된다. 첫 싱글로 커트된 「25/8」은 웅장함을 띤 현악기 프로그래밍이 일품이고, 「Why」는 고전 리듬 앤 블루스의 체취를 풍기는 구성에 귀에 빠르게 익는 코러스 덕분에 한층 멋있게 들린다. 역시 힙합 소울의 강자임을 인정하게 되는 노래들이다. 힙합의 거친 질감을 거두고 R&B에 집중한 비욘세(Beyonce)와의 듀엣곡 「Love a woman」은 두 절창의 찬연한 호흡을 만끽할 수 있다.
앨범 대부분을 장악하는 기존의 스타일과는 다른 모습을 보이기도 한다. 「Need someone」은 포크 음악을, 뒤이어 흐르는 「The living proof」는 선율과 감정 표현에 중점을 둔 가스펠 형식의 전개로 색다름을 표출한다. 1984년 개봉한 브레이크댄스 영화 < 브레이킹(Breakin') >의 사운드트랙으로 삽입되었던 루퍼스 앤 샤카 칸(Rufus & Chaka Khan)을 커버한 「Ain't nobody」는 근래 대중음악의 트렌드로 자리 잡은 전자음악과의 결합을 충분히 설명하면서 고전미를 재현하고 있다.
후반부에 자리한 네 편의 노래는 업 비트로 분위기를 고조시킨다. 처음부터 끝까지 브라스 연주가 들어가 경쾌함을 유지하는 디스코, 펑크(funk)곡 「You want this」를 비롯해 클럽 친화적인 강한 전자음이 요동치는 「This love is for you」와 「One life」, 릴 웨인(Lil Wayne)과 디디(Diddy)의 랩이 탄력을 높이는 「Someone to love me (Naked)」는 과거에 유행한 형식과 최신 경향을 만족하며 흥을 배가하는 임무를 수행한다.
|
메리 제이 블라이지는 가수뿐만 아니라 영화배우로, 최근에는 향수와 자신의 이름을 단 선글라스를 출품하며 사업가로서도 점차 영역을 확장하는 중이다. 그럼에도 음악에 소홀하지 않은 부단한 애정, 끊임없는 노력으로 최고의 뮤지션이라는 찬사를 내내 이끌어 내고 있다. 이는 자신의 스타일을 지키면서도 변화, 성장하는 모습으로 이룬 결과일 것이다. 이번 역시 마찬가지다. 그녀가 왜 힙합 소울의 여왕이라 불리는지, 어떻게 해서 그 칭호를 견지하는지 입증하는 앨범이다.
글 / 한동윤 (bionicsoul@naver.com)
마이큐(My-Q) < Ready For The World >(2011) |
이는 시시각각으로 변하는 유행을 따?기보다 소담하게 소리를 담아내기 때문이다. 소담함은 곧 복고를 의미하기도 한다. 지금의 감각으로 재단한다면 투박하고 우스꽝스럽게 들리는 신시사이저 효과, 「천사에게」 같은 사례에서 드러나는 낭만적 화법의 재현은 현 세대의 코드에서 뒤로 물러나있다.
동시대적인 곡을 만들지 못하는 것은 아니다. 몸이 부서질 것만 같은 양동근의 크럼프 댄스를 볼 수 있었던 「탄띠」가 마이큐의 작품이고, 이번 앨범에서 상반된 성격을 가진 「Ready for the world」에서도 확인할 수 있지만 빠른 템포의 곡도 제작할 수 있는 능력을 지녔다. 다만 목소리를 거쳐 진정성을 전달하는 것에 집중하기 위한 까닭인지 이번 앨범 역시 다소 과거지향적인 정공법을 선택했다.
결국 회귀는 과거의 순수함을 보존하려는 의지가 담겨져 있다. 그의 음악에서 어렴풋하게나마 때가 덜 탄 순백함을 짐작하는 것도 무리가 아닌 이유다. 사랑 본연을 감싸 안으려는 소망,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에서 오는 유대감, 넓게는 신이라는 이름아래에서만 가능한 차별 없는 박애 등을 순박한 멜로디 위에서 호소한다. 어느덧 네 번째 정규앨범이지만 이 같은 기조를 전향하지 않는 사실, 앨범의 트랙 리스트를 장식하고 있는 여러 인연들은 사람을 향하는 아티스트의 음악관을 반증한다.
 |
다소 미련하게 비칠 수 있는 순수를 향한 추구가 그를 구별할 수 있게 만든다. 다소 낯간지러울 수 있는 것은 심장이 반응하는 사랑에게서 순수를 구현하려고 하기 때문이다. 소위 먹힐 수 있는 멜로디가 있는 편은 아닌지라 역시 재미는 없다. 하지만 단순히 재미라는 단어로 설명할 수 없는 인간 사이의 (혹은 인간과 절대신 사이의) 공감과 소통을 모색한다. 요즘에 흔치 않은 순진한 음악이다.
글 / 홍혁의 (hyukeui1@nate.com)
 제공: IZM
제공: IZM(www.izm.co.kr/)


-
-
Kasabian - Empire
13,400원(19%
 + 1%
+ 1% )
)
-
-
마이큐 (My-Q) 3집 - For This, I Was Born
11,900원(20%
 + 1%
+ 1% )
)
-
-
Kasabian - Velociraptor!
13,400원(19%
 + 1%
+ 1% )
)
-
-
Kasabian - West Ryder Pauper Lunatic Asylum
9,900원(18%
 + 1%
+ 1% )
)
-
-
마이큐 (My-Q) 4집 - Ready For The World
12,600원(19%
 + 1%
+ 1% )
)
-
-
Mary J. Blige - The Breakthrough
10,900원(19%
 + 1%
+ 1% )
)
-
-
Mary J. Blige - My Life II...The Journey Continues (Act 1)
14,700원(18%
 + 1%
+ 1% )
)
PYCHYESWEB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