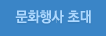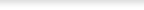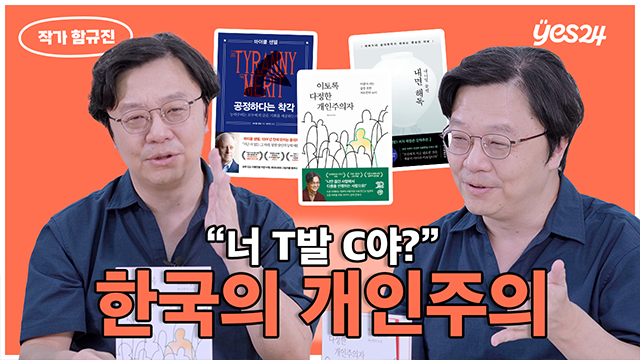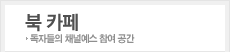마흔이라는 나이가 만들어내는 느낌은 어떤 것일까? 미흔을 불혹이라 한 공자와, 불혹해야(흔들리지 않아야) 한다는 당위로 풀어낸 사람이 얼핏 생각난다. 그러나 마흔은 불혹의 나이도 불혹해야 하는 나이도 아닌 관성(慣性)에 얽매인 나이가 아닐까? 여간해서는 흔들리지 않는 고집과 자존심, 먹고 살기 위해 어쩔 수 없이 쳇 바퀴 같은 삶을 살고 있는 관성 말이다. 중요한 것은 그러나 무엇에 대해 불혹하느냐이다. 오래 전 윤대녕의 'January 9, 1993 미아리 통신'이란 단편이 기억나는 것은 ”희망의 밥그릇은 비워진 지 오래고 혁명을 꿈꾸기에는 벌써 나약해져 있는“ 서른 중반의 세 사람...이라는 구절 때문이다.
서른 중반을 넘어선 마흔의 나이는 그럼 어떤가? 혁명의 의지마저 고사(枯死)한 것은 아닐까? 아니 늦지 않았을 것이다. 마흔 또는 마흔에 이르고 있는 사람들에게 희망을 주는 책들이 눈에 띄기 때문이다. ‘아플 수도 없는 마흔’ 같은 책도 그 중 하나이다. 희망을 주는 책들은 결국 자극(刺戟)하는 책이 아닐지? 자극한다는 말은 잠들어 있는 희망과 감성, 자신감 등을 일깨운다는 의미이다. 요즘 대세는 인생 2모작을 꿈꾸거나 2모작에 성공한 사람들 이야기이다. 그래도 한쪽에선 워킹 푸어, 하우스 푸어, 헬스 푸어 등 온갖 푸어가 난무한다.
자살 예방법을 실시할 만큼 자살자가 심각한 수를 기록하고 있는데 그 중 큰 몫을 차지하는 세대가 사십대일 것이다. 사십대는 또한 이십대와 허드렛 일을 놓고 경쟁하는 오십대에 들어서기 직전 세대 아니 연령대이다. 하우스 푸어인 사십대가 십년이 지나면 어떤 변화를 겪게 될까? 아니 위상을 맞이하게 될까? 그런데 앞만 보고 열심히 살아온 그들이 그렇게 힘들게 허덕이며 사는 이유는 무엇일까? 신자유주의 무한 경쟁 시스템이 그 주요 원인이지만 그것으로 모든 것을 설명할 수는 없다. 저자는 재충전을 말한다. 가족으로부터 재충전의 에너지를 얻자는 것이다. 그러나 내게 반골 기질이 있어서인지 불혹이 당위 차원으로 들리듯 가족 관계 역시 재충전의 에너지가 되어야 한다는 당위로 들린다.
한 작가는 기적의 가장 놀라운 점은 그것이 일어난다는 사실이라는 말을 했다. 그러나 기적은 앞서 말한 혁명과 뉘앙스가 같게 들린다. 저자는 대박의 꿈보다 거위의 꿈을 꿀 것을 주문한다. 그리고 때로는 궤도 수정도 필요하다고 말한다. 저자의 말 가운데 다소 뜻 밖으로 다가온 것은 심리학적 측면에서 열등감의 반대어는 자신감이나 자존감 또는 우월감이 아니라 근면성이라는 말이다. 근면하면 성공할 확률이 높아지고 그에 따라 느끼게 되는 성취감이 열등감을 상쇄하기 때문이다. 누구나 이렇듯 새롭게 보는 훈련이 필요하다. 위태롭고 흔들리고 힘겨운 사십대는 더 더욱 말이다.
- 원문주소 : blog.yes24.com/document/6293536
- News in Blog 게시물은 채널예스 편집 방향 및 논조와 다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