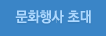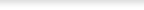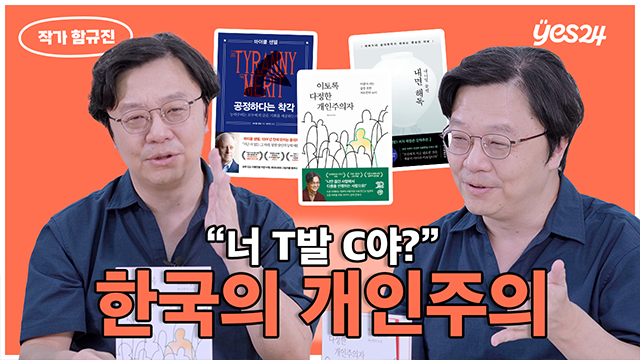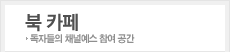나이 서른은 우리에게 어떤 의미일까? 인생의 가장 찬란한 순간을 만끽하는 지점? 청년기를 지나 장년기로 접어드는 생물학적 나이? 그러면서도 가장 고통스럽게 내 안의 '나'와 직면하게 되는 첫 관문? 이립(而立), 뜻을 세우고 홀로서기에 들어서는 나이라고도 할 수 있겠다. 정신적, 육체적으로 성인이 되는 생물학적 나이, 서른. 문학이나 영화를 통해 우린 나이 서른에 관한 다양한 이야기를 접해왔다. 그런데 왜 하나같이 서른은 희망이 아닌 죽음을 잉태하고 있는가?
이렇게 살 수도 없고 이렇게 죽을 수도 없을 때
서른 살은 온다('삼십 세', 이 時代의 사랑 중)
1981년 시인 최승자의 이 시는 나이 서른을 함축하는 상징어가 됐다. 나이 30은 그렇게 죽을만큼 힘든, 존재의 격변을 겪으며 서서히 보편적 기성세대로 접어드는 통과의례가 됐다. 지금껏 운위되는 모든 예술 작품 속의 서른살은 '이렇게 살 수도 없고 이렇게 죽을 수도 없을 때' 불현듯 찾아오는 나이인 것이다.
왜일까? 지극히 개인적으로 내게 서른은 색다른 의미였다. 결혼 후 은서를 낳았고, 직장에서도 나름 안정을 찾았으며, 내가 가야할 길에 대해 제대로된 방향을 잡았던 시기였다. 그다지 혼란스럽지도, 두렵지도 않은 덤덤한 서른살의 첫날, '아, 이제야 내 삶의 윤곽이 잡혔구나. 더이상 흔들리지 않는 나만의 인생관이 생겼구나'라고 자위했다. 이제는 <마흔에 읽는 손자병법과 같은 책이 더 눈길을 끄는 나이가 됐지만, 되돌아보면 내게 서른은 '불현듯'이 아니라 '이제야'라는 안도의 느낌이 강했었다.
여기 7인의 젊은 작가들이 나이 서른에 대한 이야기를 소설로 묶었다. '상상 이상의 서른 이야기'라는 다소간 낚시에 가까운 부제를 달았지만, 최승자가 말한 그 지점에서 단 한 발짝도 나아가지 못한, 너무나 서른스러운 작품들이 7편 실렸다. <30 Thirty>에는 김언수, 김나정, 한유주, 박주현, 김성중, 정용준, 박화영 등 갓 서른을 넘겼거나 서른 중반에 이른 작가들의 작품들이 실려있다.
서른을 제재로 삼았지만, 중요한 시점은 서른 직전, 그러니까 29살에 겪게 되는 존재의 혼란이다. 7편 모두 희망이 아닌 절망을 담고 있다. 생의 의지가 아니라 죽음을 담고 있다. 자살하거나 살인하거나... 인생의 좌절록이자 패배자의 기록이다.
도대체 나이 서른이 뭔데, 이토록 죽음에 매달리는 걸까? 어쩌면 작금의 20~30대처럼 직장, 결혼, 주거, 육아 등 생존의 막다른 길에 내몰린 나이라서 그런건가? 그렇다고 하기엔 여기에 실린 모든 작품은 이것과는 별개다. 나름 각 작품마다 개연성과 당위성을 갖고 죽거나 혹은 죽이거나를 반복하고 있다. 작중 인물들이 그렇게 되기까지 정용준 님의 말처럼 '단 한 번도 쉼 그 자체를 온전히 누려보지 못했던 시간들은 이십 대를 청춘이라고 말하기도 민망할 정도로 무력하고 초라하게' 살아왔기 때문일까?
이 책을 읽게 된 이유는 나이 마흔을 바라보는 지금, 내가 꿈꿨던 서른 당시를 되돌아보기 위함이었다. 작가들의 '상상 이상의 이야기'를 통해 적어도 인생은 살아볼만한 유의미한 것, 그 당시 가졌던 내 꿈들을 되짚어볼 수 있으리라 생각과 기대를 가졌었다. 하지만 작가들에게도 서른은 죽지 못해 살아가는, 적당히 힘들어하다가 죽거나 혹은 살아남더라도 제대로 살아갈 수 없는 식물인간의 그것처럼 다가왔나보다. 혹시 '서른 찬가' 혹은 '서른이라서 행복해요'와 같은 메시지는 암묵적으로 발화 불가능한 이야기였을까? '지금 이렇게 먹고 살기 힘든데 무슨 희망이야?'란 원망을 들을까봐?
이런 류의 기획 소설집은 그 자체로 의미가 있다. 예전 <자전소설>이나 젊은 작가들의 섹스 판타지를 그린 <남의 속도 모르고> 등은 작가의 상상력에 기대 독자의 관심과 흥미를 이끌어낸다. 실려 있는 작품마다 색다른 빛깔로 재미를 더해준다. 하지만 <30>은 처음부터 끝까지, 닥치고 죽어!로 일관하고 있다. 섵불리 희망조차 잉태할 수 없는 당대 현실을 반영했다고 하기에, 천편일률적이다. 남성, 여성작가들을 통틀어서 내린 결론은, 문학에 있어서 '서른 살'은 절대 꽃같은 시절이 될 수 없다는 것. 그러므로 문학을 통해 부유하듯 떠밀려가는 모든 20대 청춘에게 위로와 공감을 전해줄 수 없다는 것. 그것을 느꼈다.
언제쯤 희망을 얘기하는 서른을 만날 수 있을까? 그 문학적 완성도를 떠나 아쉬움이 진하게 드는 책이었다. 7편 중 그나마 김성중 님의 <국경시장>, 박화영 님의 <자살 관광 특구>가 눈길을 끈다. 한유주 님의 경우에는 <모텔 힐베르트>를 통해 처음 작품을 접했는데, 김태용 님에게서 느꼈던 텍스트와 사고의 해체를 통한 단절, 그 호흡이 묘한 매력으로 다가왔다.
- 원문주소 : blog.yes24.com/document/6162473
- News in Blog 게시물은 채널예스 편집 방향 및 논조와 다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