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화의 결말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단어가 가진 원래의 뜻과 달리 세속적인 의미가 훨씬 더 낮아지는 경우가 있다. 가을의 잔잔하고 아름다운 물결 혹은 이성의 관심을 끌기 위하여 은근히 보내는 눈길이라는 뜻을 가진 추파(秋波)라는 단어가 그렇다. 단어가 가진 원래의 뜻은 좀 더 은은하고 설레는 느낌이지만, 우리가 흔히 이해하는 단어의 어감은 조금 즉물적이고, 세속적인 느낌이 강하다. <마담뺑덕>이란 영화가 주는 느낌이 아쉽게도 그렇다. 추파의 서정적인 원뜻에서 시작해, 세속적인 이해로 끝나버린 달까?
임필성 감독은 2007년, 동화를 현대적으로 재해석한 <헨젤과 그레텔> 이후 7년 만에 다시 한국의 고전을 현대로 불러들였다. 당시 흥행이나 평가 모두 미지근한 반응을 얻었지만, 어른들이 만들어낸 공포에 짓눌린 아이들이 다시 공포의 주체가 된다는 설정은 흥미로운 영화였다. 그런 점에서 <심청전>의 악역이자 조연이었던 뺑덕을 주인공으로 설정한 <마담뺑덕>은 색다르고 재미있는 작품이 될 것 같았다. 게다가 정우성의 첫 노출이라는 자극적인 이슈와 색다른 매력을 가진 이솜이라는 배우에 대한 기대가 더했다.
취미에 눈뜬 남자, 집착에 눈먼 여자
기대한 만큼 <마담뺑덕>의 도입부는 충분히 매혹적이다. 벚꽃이 흩날리는 지방 소도시, 세련되고 퇴폐적인 중년 남성, 그리고 순진하고 멋모르는 한 처녀의 사랑. 물처럼 고여 어떤 변화도 기대할 수 없는 일상 속에 다가온 남자의 매력에 빠진 순진한 처녀는 사전적 의미에서의 ‘추파’를 던진다. 설레고 두근거리는 첫사랑의 매혹과 거칠 것 없는 집착, 마음과 육체가 함께 열리는 이 순수한 열정은 뭔가 아슬아슬하지만 편을 들어주고 싶은 정서를 만들어낸다. 게다가 우리는 순수한 덕이의 몸과 마음이 곧 누더기가 되리란 걸 안다. 시골 생활을 따분해 하는 학규에게 친구가 툭 던지는 한 마디, “뭔가 취미라도 가져봐.” 그때 오버랩 되는 덕이의 클로즈업된 얼굴. 딱히 나쁜 남자 같지 않지만, 학규에게 덕이는 사랑하는 여인이 되진 못한다. <마담뺑덕>은 이렇게 지루한 일상의 ‘취미’로 여자를 취한 남자와 깊은 사랑이 집착으로 변하는 여자의 어긋난 마음을 효과적으로 보여주면서 앞으로 벌어질 치정극의 불길한 기운을 꽤 매혹적으로 깔아둔다.
기대했지만 문제는 화재로 엄마를 잃은 덕이와 자살한 아내 덕에 홀로 청이를 키워야 하는 학규가 재회하는 8년 뒤, 본편으로 들어오면서 이야기가 중심을 잃어버린다는데 있다. 이제부터 모티브를 따온 <심청전>의 이야기를 해야 하는데, 덕이와 학규의 관계 속에 ‘청이’가 섞이는 순간, 이야기는 점점 더 인위적으로 가공된다. 익숙한 원작의 이야기와 그것을 접목시키는 방법에 대한 궁금증은 <마담뺑덕>을 끝까지 궁금하게 만드는 덕목이기도 하다. 특히 ‘공양미 300석에 팔려간 청이가 금의환향하여 아비의 눈을 뜨게 하는’ 장면을 어떻게 현대적으로 되살릴지 궁금했다. 하지만 그 궁금증이 현실이 되는 기법은 그다지 신선하지 않다. 설화의 판타지에서 용인될 수 있었던 사건들이 현실에서 있을 법하지 않은 우연으로 이어지는 순간, 이야기의 균형도 매혹도 윤기를 잃어 바스락거린다.

전반부 이솜이 보여주는 연기는 신선하다. 순수와 열정이 뒤섞인 묘한 표정과 흔들리는 눈동자가 순식간에 사랑에 빠져버린 여자의 마음을 보여준다. 장애인 엄마에게 더 없이 착한 딸이지만 사람이 찾지 않는 놀이공원 매표소 안에서 인생의 따분함을 견뎌야 하는 덕이가 서울에서 온 중년 남성에게 푹 빠져버리는 과정은 이솜이라는 배우가 가진 다양한 매력 때문에 충분한 설득력을 가진다. 어느새 중년 남성의 진중한 모습으로 다가선 정우성도 한마디로 인생 격변을 겪어야 하는 학규가 되어 자연스럽게 극 속으로 관객을 이끈다. 속물근성을 숨기고, 우아한 척 하지만 퇴폐적인 교수에서 시력을 잃고 나락에 빠지는 학규의 모습이 어색하지 않을 만큼 그는 충분히 성숙해 보인다. 조금 아쉬운 점은 덕이가 사랑에 빠진 학규의 모습은 여전히 너무 매력적이어서, 두 사람의 화학작용이 불륜의 아슬아슬함 위를 거니는 느낌 보다는 자연스러운 연정처럼 보인다는 점이다. 하지만 무엇보다 더 아쉬운 점은 끝내 이야기를 설득하려 하는 두 사람의 멋진 연기 위로 균형을 잃은 이야기의 부스러기가 뒤덮인다는 점이다.
‘눈이 먼다’라는 <심청전>의 이야기는 <마담뺑덕>에서 여러 가지 상징적 의미로 사용된다. 사랑에 눈 먼, 욕정에 눈 먼, 복수에 눈 먼, 어떤 것으로도 적용 가능하다. 하지만 학규가 물리적인 자극으로 정말 눈이 먼 순간, 심정적으로 사랑에 눈을 뜬다거나 속죄의 마음에 눈을 뜬다거나 하는 대비도 상징적이고 효율적으로 쓰였다면 조금 더 효과적인 복수 치정극이 될 수도 있었을 것 같다. 그랬다면 다시 관계가 역전되어 물리적으로 눈 먼 덕이와 눈을 떠버린 학규의 관계가 조금 더 애잔한 로맨스로 남았을 수도 있을 것 같다.

최재훈
늘 여행이 끝난 후 길이 시작되는 것 같다. 새롭게 시작된 길에서 또 다른 가능성을 보느라, 아주 멀리 돌아왔고 그 여행의 끝에선 또 다른 길을 발견한다. 그래서 영화, 음악, 공연, 문화예술계를 얼쩡거리는 자칭 culture bohemian.
한국예술종합학교 연극원 졸업 후 씨네서울 기자, 국립오페라단 공연기획팀장을 거쳐 현재는 서울문화재단에서 활동 중이다.






![[더뮤지컬] "숨통 트이는 공간" 뮤지컬 무대 돌아온 황정민…<미세스 다웃파이어> 제작발표회](https://image.yes24.com/images/chyes24/article/cover/2025/09/20250910-bdb9df69.jpg)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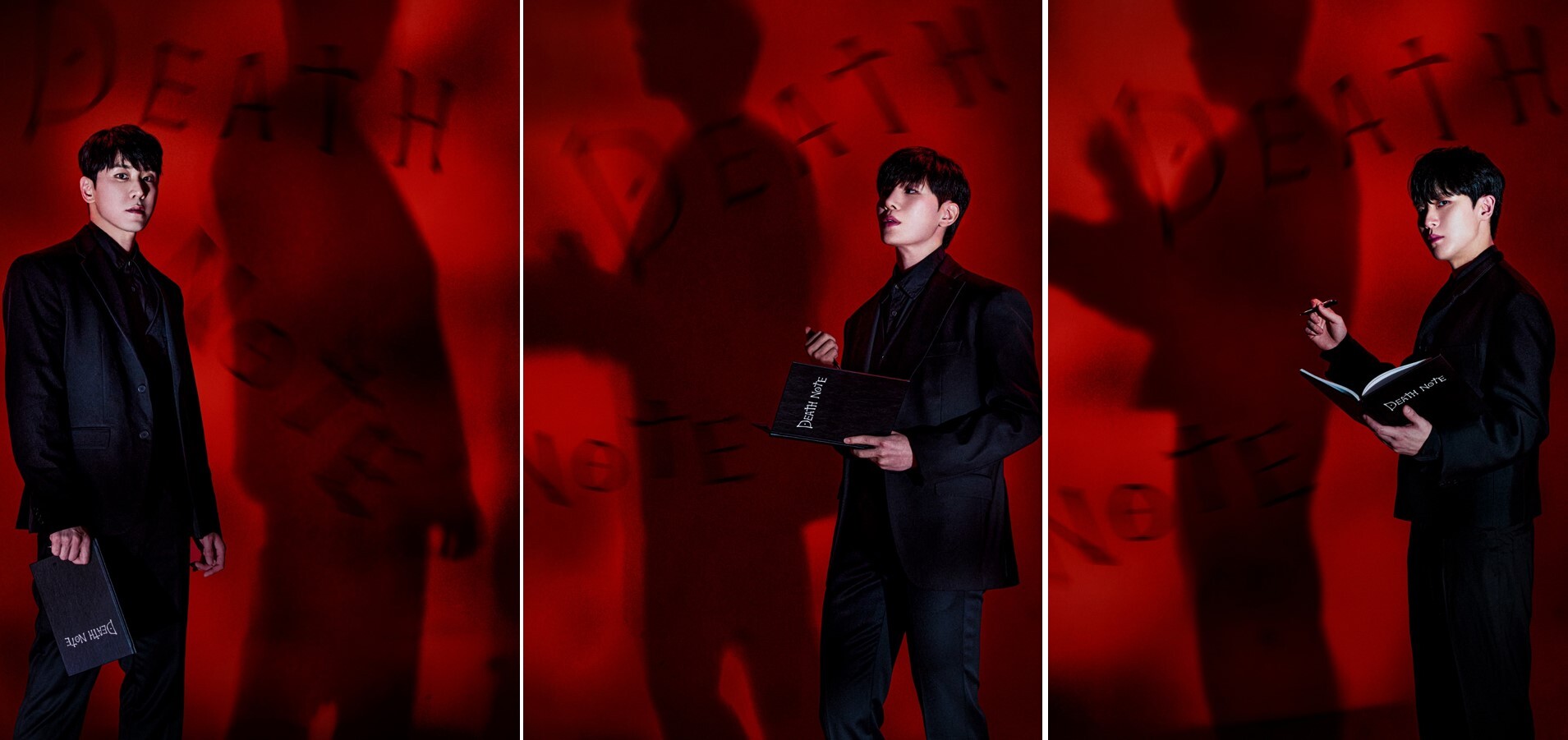
![[클래식] 반주자가 아닌, 콜라보 아티스트라고 불러주세요](https://image.yes24.com/images/chyes24/article/cover/2025/08/20250808-eb3d14fd.jpg)
![[박정민X김금희] 새로운 시작, 함께 완주](https://image.yes24.com/images/chyes24/article/cover/2025/05/20250529-00f4a8c1.jpg)
![[더뮤지컬] "1인극, 하루하루가 도전의 연속" 연극 <지킬앤하이드> 프레스콜](https://image.yes24.com/images/chyes24/article/cover/2025/03/20250313-bc1ffabd.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