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언스플래쉬
앞에 가던 할머니 한 분이 떨어지는 꽃잎처럼 나뒹군다. 맞은편에서 오던 차가 할머니를 향해 경적을 ‘빵’ 울리는 바람에 나자빠진 거다. 아니 저 자식은(운전자 말입니다만) 대로도 아니고, 아파트 입구로 이어지는 골목을 지나는 중인 할머니에게, 뭐 다급한 일이 있다고! 응? 무슨 대단한 위험을 알리겠다고! 빵, 이 소리는 할머니에게 봄날 느닷없이 울린 총소리와 진배없었을 테다. 할머니가 내뱉는 한 마디.
“우라질 놈!”
찰지다. 욕은 저렇게 하는 거였어. 할머니는 툭툭 털고 일어난다. 바닥엔 물건들이 분분하다. 뭐가 들었는지 불분명한 까만 봉지, 꽃무늬 천으로 된 가방, 그리고 개나리 둘 줄기. 이것들이 할머니와 같이 봉변을 당했다. 할머니는 허리를 꼿꼿이 세우고, 짐을 챙겨 떠난다. 어디서 꺾으셨을까 개나리 두 줄기, 손에 쥐고 가는 뒷모습이라니. 모르긴 몰라도 저 운전자는 오늘 할머니의 ‘작은 봄날’에 흠집을 낸 게지. 개나리 두 줄기를 다치게 했지. 할머니를 따라, 자동차 꽁무니를 향해 내가 뱉는 말.
“경을 칠 놈!”
어라, 이건 내 말이 아니다! 어릴 때 듣고 자란, 지금은 세상에 없는 우리 할머니의 말이다. 내가 이런 늙수그레한 표현을 쓰다니. 할머니! 할머니? 하늘을 한 번 올려다보고 머리를 긁적인다. 어릴 적 어른들이 쓰던 말 중 상당 부분은 사라졌다고 아쉬워했는데… 그 말들은 불시에 튀어나온다. 내 입에서, 내 몸에서, 내 영혼 귀퉁이에서 죽은 듯 살다가, 핍박 받다가, 먼지 쌓인 채 방치되어 있다가, 불현듯 ‘살아’ 나온다. 가령 누군가 우스꽝스러운 행동을 할 때 나도 모르게 튀어나오는 말.
“요런 맹추!”
할머니가 어린 나를 놀릴 때 부르던 말이다. 이 말이 내 안에서 튀어나오는 순간 깜짝 놀란다. 완전히 잊고 지내던 말이기에. 내 속에 있는 줄도 모르던 말을, 모르는 사이에 사용하는 나, 그것도 돌아가신 할머니 어투로 하고 있는 나를 발견하는 기분은 묘하다. 가령 나는 이런 말들을 종종 한다.
‘이런 건 고장 나기 십상이야.’
‘이 옷은 개 혓바닥처럼 얇아서 영 못쓰겠네.’
‘글쎄, 그 애가 웬일이라니.’
‘떼꾼한 게 좀 피곤해 보이네요.’
‘아휴, 보기 숭하잖아?’
그리고, ‘경을 칠 놈!’
가끔 비 오는 날 멍하니 엎드려있다 그 노래를 생각한다. 다리 빼기 놀이를 할 때 부르던 노래. 할머니와 마주보고 앉아 다리 한 짝씩을 엇갈리게 끼워 놓고, 같이 부르던 노래다. 노래가 멈추면 다리를 하나씩 구부려 접는 게 규칙인 놀이. 내 짧은 다리와 할머니의 긴 다리를 두 쌍의 젓가락처럼 사이좋게 붙여 놓고는, 즐거워했다. “이거리 저거리 각거리 / 천사만사 다만사 / 조리김치 장독간/ 총채비 파리딱” 노래하던 할머니의 음성이 무시로, 생각난다.
“죽은 이들이 결코 우리 곁을 떠나지 않는다는 건 여러분도 나만큼―아니 어쩌면 더―잘 알고 계십니다. 그들이 하는 이야기를 귀 기울여 듣는다면 망자들은 어떻게든 우리를 도와주려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마땅히 귀를 기울여야 하죠. 그렇지 않은가요?(겉으로야 아닌 척하더라도 말이죠.)”
- 존 버거, 『여기, 우리가 만나는 곳』 (7쪽)
쓰지 않으면 언어도 늙는다. 늙어 병이 들거나, 쪼그라들거나, 영 사라지기도 한다. 그걸 ‘언어의 역사성’이라 함을 알고는 있지만, 새삼 깨닫게 될 때가 있다. 재치 있는 신조어들, 사람들 입에 자주 오르내려 날로 쌩쌩해지는 말들 사이에서, 희미해져가는 옛 말들은 안부가 걱정될 때. 옛날 어른들이 쓰던 말들, 찰진 언어들, 에둘러 하는 표현, 구수한 억양… 서울 사투리라 부르는 ‘경아리 말씨’도 상당부분 사라졌다고 한다. 나긋나긋하고, 우아해 보이는 서울 사투리는 이제 몇몇 문학책에서나 볼 수 있다.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거울을 볼 때. 내 얼굴에서 언뜻 돌아가신 할머니 태가 보여 놀랄 때. 쓰지 않던 말을 내뱉은 후 이게 ‘당신에게서 온 것’을 깨달을 때. 죽은 당신과 살아있는 내가 ‘함께’ 살고 있구나 알게 된다. 거울을 보면 투명한 당신이 옆에 서있는 것 같다. ‘요런 맹추야, 내가 여기 있는 거 몰랐니?’ 당신이 말하면, 나도 따라 말한다. 아휴, 맹추.
-
여기, 우리가 만나는 곳존 버거 저/강수정 역 | 열화당
공간의 경계와 시간의 한계를 자유롭게 넘나들면서 명랑하고 유머가 넘치는 이야기들을 펼치는 한편, 읽는 이의 가슴을 아리게 할 애잔한 감수성을 환기시킨다.
여기, 우리가 만나는 곳
출판사 | 열화당
여기, 우리가 만나는 곳
출판사 | 열화당

박연준(시인)
1980년 서울에서 태어나 동덕여대 문예창작과를 졸업했다. 2004년 중앙신인문학상에 시 '얼음을 주세요'가 당선되어 문단에 나왔다. 시집『속눈썹이 지르는 비명』『아버지는 나를 처제, 하고 불렀다』가 있고, 산문집『소란』을 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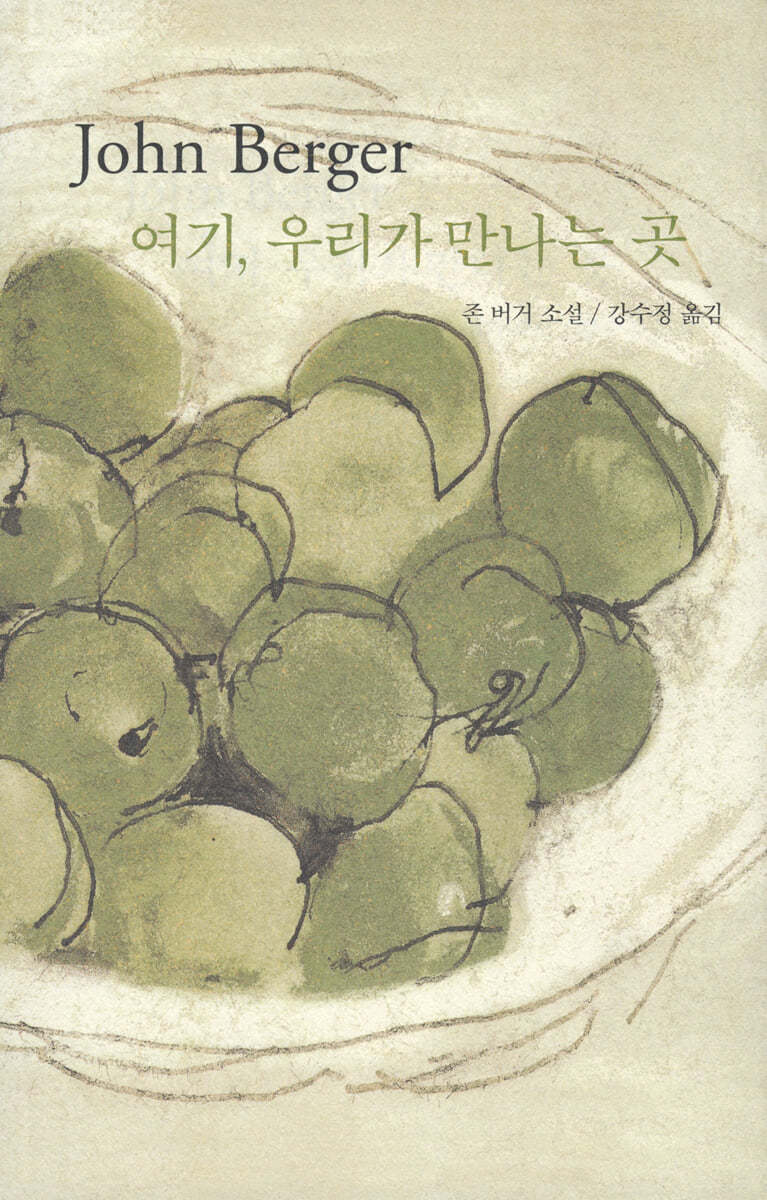





![[더뮤지컬] "소설 속 응축된 정서, 자연스럽게 무대 위로" 뮤지컬 <오세이사> 프레스콜](https://image.yes24.com/images/chyes24/article/cover/2025/07/20250704-dd2d77e2.jpg)
![[젊은 작가 특집] 고선경 “인공지능과 연애하는 인물을 그려 보고 싶어요”](https://image.yes24.com/images/chyes24/article/cover/2025/06/20250617-c4941e46.png)
![[리뷰] 자신에게 일어나지 않은 일을 어떻게 알 수 있죠?](https://image.yes24.com/images/chyes24/article/cover/2025/05/20250508-1a283524.jpg)
![[번역 후기] 다와다 요코 Hiruko 3부작 완결을 축하하며](https://image.yes24.com/images/chyes24/article/cover/2025/03/20250328-73be649d.png)






이림
2019.05.29
봄봄봄
2019.04.19
찻잎미경
2019.04.18
우리말 사라짐이 너무 급속화되고 있다는 생각입니다. 우리말 지키기가 엄청 어려운 현실이지만, 그런 일을 해내는 사람들과 기관의 정성이 더 많이 확대되고 깊어졌으면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