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댄서의 순정'이 실패한 이유
2005.06.01
구성주의 <엄마>와 박영훈의 <댄서의 순정>은 흥미로운 점 하나를 공유하고 있습니다. 그건 이 두 영화들이 무척 촌스럽고 투박한 구닥다리 멜로드라마라는 것이죠. 이게 왜 흥미롭냐고요? 세 가지 이유에서입니다. 첫째, 구성주나 박영훈의 전작들은 모두 이런 식의 순진무구한 촌스러움과는 무관한 작품들이었습니다. 구성주의 <그는 나에게 지타를 아느냐 물었다>는 하일지의 소설을 각색한 ‘아트 하우스’ 영화였고 박영훈의 <중독>은 미스터리와 로맨스가 반반씩 섞인 비교적 날씬한 장르물이었습니다. 완성도를 떠나, 촌스러움과 별로 상관없는 영화들이었죠. 둘째, 두 영화 모두 완성도가 그냥 그랬다는 것입니다. 고두심과 문근영이라는 성실한 스타들의 활약이 없었다면 과연 본전치기라도 가능했을는지? 셋째, 시사회나 인터뷰에서 배우들이나 스탭들의 인사(또는 변명)이 다 이렇게 시작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 영화는 결코 세련되게 잘 만든 영화는 아니지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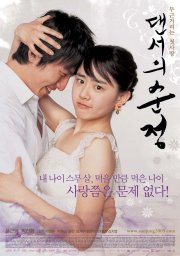 여기서 우린 ‘촌스러움’과 ‘투박함’에 대해 생각해보게 됩니다. 이것들은 도대체 뭡니까? 테크닉과 실력의 부족으로 어쩔 수 없이 만들어지는 완성도나 세련됨의 결여입니까? 아마 그렇게도 평가할 수 있을 겁니다. 그렇다면 왜 <엄마>나 <댄서의 순정>을 만든 사람들은 ‘의도적으로’ 그런 투박함에 접근했던 것일까요? 암만 봐도 이건 그네들의 체질이 아닌데 말입니다. 그게 이야기에 더 어울려서? 아니면 예술적 노력을 덜 투여해도 관객들로부터 괜찮은 호응을 끌어낼 수 있기 때문에? 아마 둘 다겠지요. 그리고 이 두 영화들이 예술적으로 실패한 건 두 번째 이유가 조금 더 큰 역할을 했을 겁니다.
여기서 우린 ‘촌스러움’과 ‘투박함’에 대해 생각해보게 됩니다. 이것들은 도대체 뭡니까? 테크닉과 실력의 부족으로 어쩔 수 없이 만들어지는 완성도나 세련됨의 결여입니까? 아마 그렇게도 평가할 수 있을 겁니다. 그렇다면 왜 <엄마>나 <댄서의 순정>을 만든 사람들은 ‘의도적으로’ 그런 투박함에 접근했던 것일까요? 암만 봐도 이건 그네들의 체질이 아닌데 말입니다. 그게 이야기에 더 어울려서? 아니면 예술적 노력을 덜 투여해도 관객들로부터 괜찮은 호응을 끌어낼 수 있기 때문에? 아마 둘 다겠지요. 그리고 이 두 영화들이 예술적으로 실패한 건 두 번째 이유가 조금 더 큰 역할을 했을 겁니다.
사람들은 투박한 작품들에 대해 종종 심한 착각을 합니다. 이건 아프리카의 이름 모를 장인들이 만든 토착 예술품을 구경하러 온 사람들이 무심코 “이런 건 우리 집 애들도 만든다”라고 내뱉는 것과 같은 논리에 바탕을 두고 있지요. 이들은 기술적으로 단순해서 만들기 쉬워 보입니다. 따라서 별 게 아니라는 거죠. 하지만 세련된 기술과 예술적 성취가 늘 같은 길을 가는 건 아닙니다. 오히려 이런 투박한 작품들에서 진짜 장인과 예술가의 실력이 드러나는 법이죠. 테크닉 속에 숨을 수가 없으니까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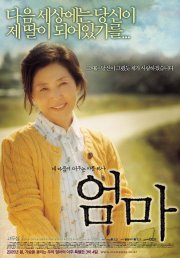 <엄마>나 <댄서의 순정>은 모두 21세기 초의 한국 영화보다는 60년대 충무로 영화에 더 가깝습니다. 황정순이나 김지미가 나오는 그 옛날 영화들요. 아마 지금 이 영화들에 진지하게 반응하는 젊은 관객들은 얼마 없을 겁니다. 즐기긴 하겠지만 진지한 영화보다는 <로키 호러 픽쳐쇼>처럼 캠피한 오락으로 받아들이겠죠. 그러나 우스꽝스러운 성우 더빙과 과장된 멜로드라마에도 불구하고 이 영화들은 결코 쉽게 얕잡아볼 수 없는 작품들인 경우가 많았습니다. 적어도 성공작들은 당시 관객들의 심금을 울리기 위해 아주 정교하게 통제된 작품들이었습니다. 우리에게 덜 세련되어 보이는 건 그들이 그런 기술을 습득하지 못했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본질적으로 지향점이 달랐기 때문이죠.
<엄마>나 <댄서의 순정>은 모두 21세기 초의 한국 영화보다는 60년대 충무로 영화에 더 가깝습니다. 황정순이나 김지미가 나오는 그 옛날 영화들요. 아마 지금 이 영화들에 진지하게 반응하는 젊은 관객들은 얼마 없을 겁니다. 즐기긴 하겠지만 진지한 영화보다는 <로키 호러 픽쳐쇼>처럼 캠피한 오락으로 받아들이겠죠. 그러나 우스꽝스러운 성우 더빙과 과장된 멜로드라마에도 불구하고 이 영화들은 결코 쉽게 얕잡아볼 수 없는 작품들인 경우가 많았습니다. 적어도 성공작들은 당시 관객들의 심금을 울리기 위해 아주 정교하게 통제된 작품들이었습니다. 우리에게 덜 세련되어 보이는 건 그들이 그런 기술을 습득하지 못했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본질적으로 지향점이 달랐기 때문이죠.
여기서 <엄마>나 <댄서의 순정>이 왜 실패했는지 드러납니다. 이들의 논리는 다음과 같았습니다. 옛날 영화들처럼 인간미 넘치는 멜로드라마를 만들자. 그러기 위해 일부러 적당히 완성도를 떨어뜨리고 촌스럽게 만들자. 제가 상상하는 게 아닙니다. 실제로 <댄서의 순정>을 만드는 사람들은 그 형편없는 CG 반딧불이가 예술적으로 한심하기 짝이 없다는 걸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문근영이 그렁그렁한 눈으로 그 픽셀들을 바라보면 아무리 형편없어도 대충 먹힐 거라고 생각하고 그냥 밀어붙인 거죠. 먹혔냐고요? 문근영은 예뻤습니다. 하지만 CG 반디불이들과 멜로드라마는 여전히 시시했어요.
전 종종 일급의 예술 감독들이 만든 무성의한 장르 영화들에 대해 리뷰를 쓰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장르를 얕보지 말란 말이야!” 장르 영화들은 대충 만들어 통하는 게 아닙니다. 오히려 선배들을 넘어서는 노력이 필요하죠. 오늘 우리가 언급한 두 편의 멜로드라마도 마찬가지입니다. 멜로드라마는 수명이 길고 관객층도 넓은 장르입니다. 이미 온갖 테크닉이 개발되었고 관객들 역시 그걸 인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보통 때 노력의 서너 배를 투여해도 모자랄 판인데, 이 사람들은 더 어울리는 어법을 찾는답시고 일부러 완성도를 떨어트리고 있단 말입니다. 이런 상업 영화들을 보면 전 그냥 고함치고 싶습니다. “잘 할 줄 모르면 처음부터 하지 말란 말이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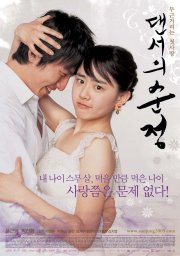 여기서 우린 ‘촌스러움’과 ‘투박함’에 대해 생각해보게 됩니다. 이것들은 도대체 뭡니까? 테크닉과 실력의 부족으로 어쩔 수 없이 만들어지는 완성도나 세련됨의 결여입니까? 아마 그렇게도 평가할 수 있을 겁니다. 그렇다면 왜 <엄마>나 <댄서의 순정>을 만든 사람들은 ‘의도적으로’ 그런 투박함에 접근했던 것일까요? 암만 봐도 이건 그네들의 체질이 아닌데 말입니다. 그게 이야기에 더 어울려서? 아니면 예술적 노력을 덜 투여해도 관객들로부터 괜찮은 호응을 끌어낼 수 있기 때문에? 아마 둘 다겠지요. 그리고 이 두 영화들이 예술적으로 실패한 건 두 번째 이유가 조금 더 큰 역할을 했을 겁니다.
여기서 우린 ‘촌스러움’과 ‘투박함’에 대해 생각해보게 됩니다. 이것들은 도대체 뭡니까? 테크닉과 실력의 부족으로 어쩔 수 없이 만들어지는 완성도나 세련됨의 결여입니까? 아마 그렇게도 평가할 수 있을 겁니다. 그렇다면 왜 <엄마>나 <댄서의 순정>을 만든 사람들은 ‘의도적으로’ 그런 투박함에 접근했던 것일까요? 암만 봐도 이건 그네들의 체질이 아닌데 말입니다. 그게 이야기에 더 어울려서? 아니면 예술적 노력을 덜 투여해도 관객들로부터 괜찮은 호응을 끌어낼 수 있기 때문에? 아마 둘 다겠지요. 그리고 이 두 영화들이 예술적으로 실패한 건 두 번째 이유가 조금 더 큰 역할을 했을 겁니다. 사람들은 투박한 작품들에 대해 종종 심한 착각을 합니다. 이건 아프리카의 이름 모를 장인들이 만든 토착 예술품을 구경하러 온 사람들이 무심코 “이런 건 우리 집 애들도 만든다”라고 내뱉는 것과 같은 논리에 바탕을 두고 있지요. 이들은 기술적으로 단순해서 만들기 쉬워 보입니다. 따라서 별 게 아니라는 거죠. 하지만 세련된 기술과 예술적 성취가 늘 같은 길을 가는 건 아닙니다. 오히려 이런 투박한 작품들에서 진짜 장인과 예술가의 실력이 드러나는 법이죠. 테크닉 속에 숨을 수가 없으니까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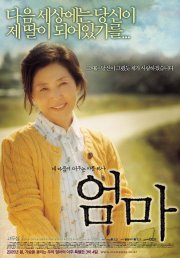 <엄마>나 <댄서의 순정>은 모두 21세기 초의 한국 영화보다는 60년대 충무로 영화에 더 가깝습니다. 황정순이나 김지미가 나오는 그 옛날 영화들요. 아마 지금 이 영화들에 진지하게 반응하는 젊은 관객들은 얼마 없을 겁니다. 즐기긴 하겠지만 진지한 영화보다는 <로키 호러 픽쳐쇼>처럼 캠피한 오락으로 받아들이겠죠. 그러나 우스꽝스러운 성우 더빙과 과장된 멜로드라마에도 불구하고 이 영화들은 결코 쉽게 얕잡아볼 수 없는 작품들인 경우가 많았습니다. 적어도 성공작들은 당시 관객들의 심금을 울리기 위해 아주 정교하게 통제된 작품들이었습니다. 우리에게 덜 세련되어 보이는 건 그들이 그런 기술을 습득하지 못했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본질적으로 지향점이 달랐기 때문이죠.
<엄마>나 <댄서의 순정>은 모두 21세기 초의 한국 영화보다는 60년대 충무로 영화에 더 가깝습니다. 황정순이나 김지미가 나오는 그 옛날 영화들요. 아마 지금 이 영화들에 진지하게 반응하는 젊은 관객들은 얼마 없을 겁니다. 즐기긴 하겠지만 진지한 영화보다는 <로키 호러 픽쳐쇼>처럼 캠피한 오락으로 받아들이겠죠. 그러나 우스꽝스러운 성우 더빙과 과장된 멜로드라마에도 불구하고 이 영화들은 결코 쉽게 얕잡아볼 수 없는 작품들인 경우가 많았습니다. 적어도 성공작들은 당시 관객들의 심금을 울리기 위해 아주 정교하게 통제된 작품들이었습니다. 우리에게 덜 세련되어 보이는 건 그들이 그런 기술을 습득하지 못했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본질적으로 지향점이 달랐기 때문이죠. 여기서 <엄마>나 <댄서의 순정>이 왜 실패했는지 드러납니다. 이들의 논리는 다음과 같았습니다. 옛날 영화들처럼 인간미 넘치는 멜로드라마를 만들자. 그러기 위해 일부러 적당히 완성도를 떨어뜨리고 촌스럽게 만들자. 제가 상상하는 게 아닙니다. 실제로 <댄서의 순정>을 만드는 사람들은 그 형편없는 CG 반딧불이가 예술적으로 한심하기 짝이 없다는 걸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문근영이 그렁그렁한 눈으로 그 픽셀들을 바라보면 아무리 형편없어도 대충 먹힐 거라고 생각하고 그냥 밀어붙인 거죠. 먹혔냐고요? 문근영은 예뻤습니다. 하지만 CG 반디불이들과 멜로드라마는 여전히 시시했어요.
전 종종 일급의 예술 감독들이 만든 무성의한 장르 영화들에 대해 리뷰를 쓰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장르를 얕보지 말란 말이야!” 장르 영화들은 대충 만들어 통하는 게 아닙니다. 오히려 선배들을 넘어서는 노력이 필요하죠. 오늘 우리가 언급한 두 편의 멜로드라마도 마찬가지입니다. 멜로드라마는 수명이 길고 관객층도 넓은 장르입니다. 이미 온갖 테크닉이 개발되었고 관객들 역시 그걸 인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보통 때 노력의 서너 배를 투여해도 모자랄 판인데, 이 사람들은 더 어울리는 어법을 찾는답시고 일부러 완성도를 떨어트리고 있단 말입니다. 이런 상업 영화들을 보면 전 그냥 고함치고 싶습니다. “잘 할 줄 모르면 처음부터 하지 말란 말이야!”
66개의 댓글
추천 기사
필자

채널예스
채널예스는 예스24에서 운영하는 콘텐츠 플랫폼입니다. 책을 둘러싼 다양한 이야기를 만나 보세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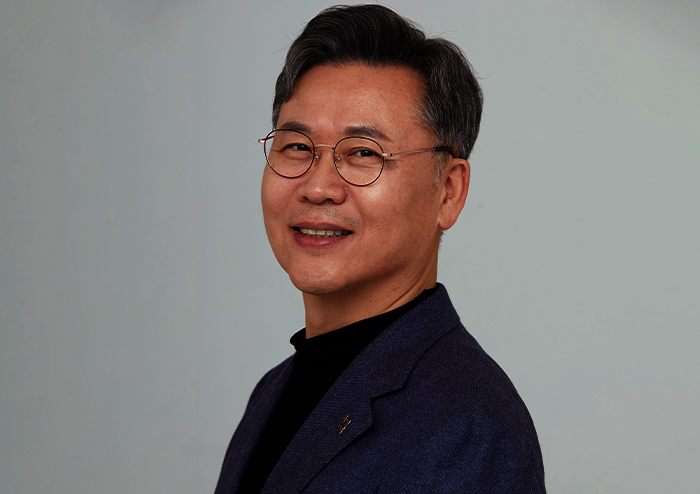
![[하은빈X안담] 실패하는 몸, 사랑하는 몸](https://image.yes24.com/images/chyes24/article/cover/2025/04/20250428-35cd42b2.png)





단아
2019.07.15
이댕
2019.07.13
엄마를 다시 생각하게 만든 작가님..
뵙고싶습니다.
dbfka
2019.07.12
저는 반대 의미로 <딱 하루만 평범했으면> 할 때가 있어요. 매일매일 평범하거든요:D
여름 휴가는 못 가지만 여행 이야기를 들으며 평범한 일상 속에서 "특별한" 순간을 보내고 싶습니다!
더 보기